등록 : 2019.09.16 09:07
수정 : 2019.10.10 09:49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62) 씨받이
감독 임권택(1987년)
 |
|
한 양반 종갓집의 대를 잇기 위해 17살 옥녀(강수연)는 ‘대리모’라고 할 수 있는 씨받이가 된다.
|
조선시대가 끝나긴 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선은 우리 곁에 머물면서, 때로는 우리 위에서 내리누르고, 그리고 종종 우리 아래를 떠받치고 있다.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숨겨놓은 것일까. 우리 안의 그들. 근대 안의 조선시대.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조선시대를 건드렸다. 누군가는 조선시대에서 민족을 찾았고, 누군가는 영웅을 찾았으며, 누군가는 민중을 찾았고, 누군가는 왕을 찾았고, 누군가는 색(色)을 찾았으며, 누군가는 전쟁을 찾았으며(…) 임권택은 유교를 찍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 종갓집 종손 신상규와 그 부인은 슬하에 자식이 없자 친족이 모여 논의 끝에 씨받이를 들이기로 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씨받이 마을에서 데려온 나이 어린 옥녀를 아흔아홉칸 고택의 별채에 숨겨놓고 길일에 합궁을 시킨다. 아무 생각이 없던 옥녀는 점점 신상규에게 마음이 열리고, 양반은 씨받이에게 끌린다. 임신이 되자 둘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출산을 하자마자 옥녀는 쫓겨나듯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밤중에 떠난다. 일년 뒤에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온 옥녀는 이 집 근처에서 목을 맨다.
 |
|
한 양반 종갓집의 대를 잇기 위해 씨받이가 된 17살 옥녀(강수연)는 살갗에 씨받이를 뜻하는 문신을 새긴다.
|
이 서사는 한국 영화에서 수없이 만들어진 양반과 ‘쌍것’ 사이의 넘나들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이다. 임권택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씨받이>는 한쪽에서 하나의 의식처럼 합궁이 어떤 감정도 지니지 않은 채 진행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떠받드는 제사라는 의례 절차가 지극정성을 다해 벌어진다. 임권택은 그 둘이 사실은 하나이며, 그렇게 죽음과 삶이 서로 연결된 한국인의 내세관을 떠받치는 유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병풍처럼 펼쳐 보인다. 이 의례에는 어떤 양보도 없고, 어떤 타협도 없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행한다. 의무와 예속의 세계. 잔인함은 기품이 있으며, 무자비한 과정은 우아하고, 도리의 위계질서는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방예의지국.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씨받이>는 몸서리칠 만큼 잔인하고 아름답게 찍힌 ‘한국’ 영화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한국은 몸서리칠 만큼 잔인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걸 <씨받이>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성일/영화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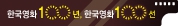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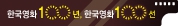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