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20 18:37
수정 : 2014.07.20 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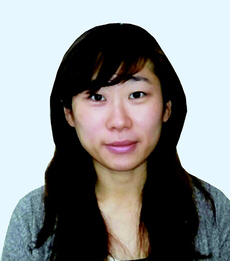 |
|
희정 기록노동자
|
당신의 인생이 평온하다 못해 지루하다면, 그래서 따분한 삶에 자극이 필요하다면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 대기업 본사 정문으로 가라. 그곳에 당신을 자극할 모욕도, 폭력도 있다.
‘1인시위’용 피켓을 들자. 피켓에 기업이 예민할 문구, ‘부당해고’, ‘노동조합’, ‘직업병’ 등을 쓰길 바란다. 최대한 본사 정문과 가까운 인도에 서라.(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 S사를 추천한다. 기업은 아니지만 요즘은 청와대 앞도 모욕받을 확률이 높긴 하다.)
기업을 지키는 용역경비들이 당신을 주시하다가 다가올 것이다. 시비를 걸기도 한다. “여기는 회사 땅이다. 비켜라.” 당신이 ‘1인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요’라고 맞선다면, 더욱 좋다. 커다란 경비들이 당신을 둘러쌀 것이다. 소리를 질러봤자 도와줄 사람 없다. 원초적 힘에 제압당한 당신은 눈을 내리깐다. 모욕을 넘어 ‘비참’을 느낀다.
높다란 대기업의 로고를 보며 생각한다. 당신들 핸드폰 팔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 ‘고객님’이라 했잖아. 의자를 빼주고 허리를 굽혔잖아.(만약 당신이 기업 직원이라면 이렇게 떠올릴 것이다. 당신들 일 시킬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 ‘가족’이라 했잖아.) 유권자, 소비자 등 나의 안온함을 지켜주던 정체성이 사라지고 혼란이 온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덩치 좋은 용역을 고용할 수 있는 돈과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내 딸이 일하다 병으로 죽었는데,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는데, 기업 횡포로 내 작은 점포가 망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하나. 경찰도 기자도 오지 않는 빌딩숲 사이에 멍하니 서 있자면 웅장한 건물을 지키는 경비가 피식, 비웃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구나.
470여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아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때, 바다에 잠긴 이들의 가족들은 청와대에 가겠다고 행렬을 만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저이는 앞으로 무엇을 겪게 될까. 소리를 질러도 가닿는 곳 없고, 경찰이 든 방패가 길목을 막을 텐데. 결국 가족들은 주저앉아 곡기를 끊어야 했다.
시민으로 권리를 가진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다. 권리를 주장하면 미소 띠던 기업이 더 이상 웃질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 삶터를 지킬, 진실을 알 권리를 믿은 ‘나’는 힘으로 밀면 넘어진다. 입을 막으면 말을 못했다. 나를 지켜준다 믿은 법과 경찰, 그리고 국가는 이편에 있지 않다. 밀양 땅 노인들은 달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울부짖지 않았던가. “이게 법인가. 이게 나라인가.”
모든 권리를 국가에 맡기고 ‘개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돌려받겠다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적다. 권리는 미리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용역경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있다.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에 한발 가까이 가게 한 이는 ‘우리’다. 밀양 주민들이 찢겨진 농성장에서 울고만 있지 않은 것은 함께 울어준 ‘우리’ 때문이다. 노동조합 탄압에 3명이 목숨을 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해 8년째 싸운 이들이 만난 장소는 1인시위에도 눈치 봐야 했던, 그 대단한 기업 앞이다.
사람은 모여야 한다. 돈도 법도 힘도, 있을 것 다 있는 이들과 함께 살기에 이 세상은 혼자선 너무 버겁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모이자. 모여, 사람이 있는 곳에 손을 내밀자.
희정 기록노동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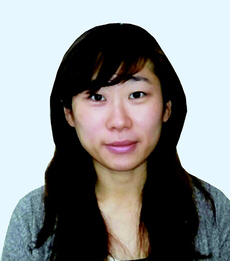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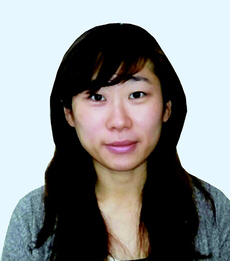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