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간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비대면 행사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 고액의 방송송출·홍보비를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로 10회째이지만, 포럼의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10일 열린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예산 8억원(국비 5억원) 중 방송송출·홍보비로 1억5500만원을 지출했다. 행사를 촬영해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용 영상 2개를 만드는 데 광주방송(KBC)에 9500만원을, 행사 영상을 영문으로 번역해 송출하는 아리랑티브이에 3000만원을, 행사 영상을 방영한 에스비에스(SBS)에 3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8일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으로 열린 지방정부 포스트 코로나 전략 공유 화상회의에서 온라인이 끊겨 먹통이 됐다. 정대하 기자
일각에선 이런 지출명세를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코로나19 극복 방역비로 지원하라’고 한 이용섭 시장의 당부와도 배치된다. 또 시가 8000만원을 들여 진행한 비대면 행사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국제화상회의에선 도중에 인터넷이 끊겨 먹통이 되기도 했다. 광주시 쪽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방송 홍보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원받은 국비 일부를 반납할 상황이었다. 포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첫 시도였다”며 “(국제화상회의 먹통은) 현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공
10회째 연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광주 인권도시 정체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의 저상버스 확보율은 올해 22%에 그쳐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45%)에 턱없이 못 미친다. 광주시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1차연도·2017~2021년)에 올해 목표 인원을 137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시설을 나와 독립한 장애인은 52명에 그친다. 또 광주의 중증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외에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쪽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포기해야 신규 신청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탈시설 장애인이 몇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시의 세심한 배려와 태도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장애인·노인·이주민 등을 위한 인권정책이 행정으로 반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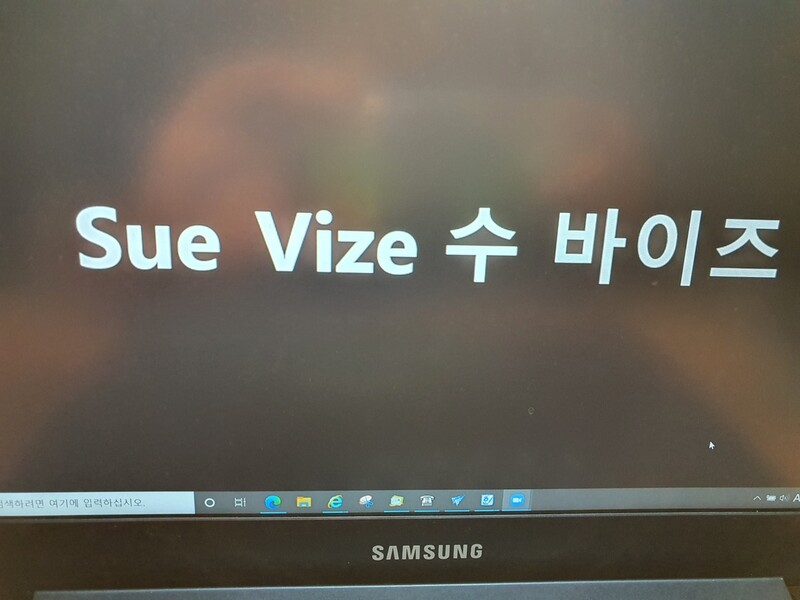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