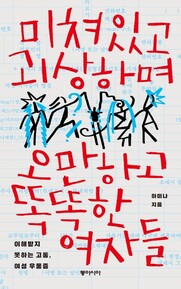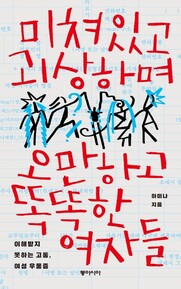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하미나 지음 l 동아시아(2021)
18 세기 전까지 유럽의 과학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조차 하지 않았다 . 인간은 오직 남성이었기에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하는 범주가 없었다 . 해부학과 현미경의 등장으로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드러나면서 성차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 19 세기에 여성참정권 운동의 확산은 생물학적 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하지만 과학계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 성차이의 생물학적 지표로 여성의 난소가 지목되자 , 정신질환을 앓는 젊은 여성에게 난소적출술이 강제로 시술되었다 . 20 세기에 들어와선 난소의 역할을 여성 호르몬이 대신했다 . “ 용감한 남성호르몬과 우울한 여성호르몬 ” 으로 불리면서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 월경과 폐경 증후군과 같은 모든 여성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 .
이러한 이야기가 여성 잔혹사 같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 오늘날까지도 ‘ 젠더 ’ 라는 사회문화적 관념은 현대 과학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과학기술학 (STS) 에서는 여성 문제가 과학 연구에서 배제되는 것을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연구는 수행되고 , 어떤 연구는 수행되지 않는 ‘ 지식의 정치 ’ 가 작동된다 . 미국에서 유방암 진단과 관련한 여성운동이 연구의 방향성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젠더 정치와 언던 사이언스를 과학기술학이 다룬다 .
나는 하미나의 <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 을 과학기술학의 관점으로 읽었다 . 이 책이 사회정치 ,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으로만 분류되는 것이 의아한데 한국 여성 , 그중에서 이삼십 대 여성의 우울증 연구는 언던 사이언스이며 과학기술학의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 표준화와 정상을 고집하는 현대 의학은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겪는 고통에 무관심하다 . 백인 남성 의사와 과학자가 만든 우울증 진단체계는 한국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 젊은 여성 연구자 하미나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정신의학이란 지식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 그리고 서른 명 정도의 이삼십 대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 의학과 약물치료의 한계를 드러내고 , 질병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탐색한다 .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우울증의 고통을 이해하는 뜻깊은 성찰의 시간을 준다 . 이 책은 한국 이삼십 대 여성의 일상을 이론화하는 한 편의 연구보고서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하미나는 ‘ 이삼십 대 여성의 고통을 보아달라 ’ 는 것이 아니라 ‘ 이삼십 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달라 ’ 고 당당히 요구한다 . “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을 탐색하는 것은 고통에 대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찾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위기 상황에서 새롭고 자발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 타인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섣불리 지워버리지 않고 , 취약함을 공유하고 내보이는 것 , 상실한 것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 . 그러기 위해서는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제 막 시작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이 되길 바란다 .
과학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