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 피렌체서 만들어진 안경
15세기 중국 도착이 정설이지만
당대 조밀한 네트워크 살펴보면
송·원대 유입 가능성 높아
15세기 중국 도착이 정설이지만
당대 조밀한 네트워크 살펴보면
송·원대 유입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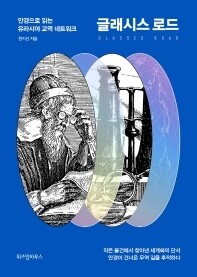
안경으로 읽는 유라시아 교역 네트워크
한지선 지음 l 위즈덤하우스 l 2만원 우리나라 첫 안경 기록은 1606년 이호민이 쓴 <안경명>이다. “눈 어두운 사람이 쓰고 글을 보면 잔글씨가 크게 보이고 흐릿한 것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는 착용 후기다. 임진왜란 중일회담 대표인 심유경과 현소가 ‘안경잡이’라는 목격담도 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사신 일행이 베이징 상가에서 줄줄이 안경을 구입했다. ‘김성일(1538~1593) 안경’이 가장 오랜 실물이다. 옛 그림도 있다. 신윤복(1758?~1817?)이 그렸다는 풍속화 <영감과 아가씨>. 툇마루에 책을 펼쳐둔 채 마당 쪽 아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랑방 영감이 안경을 걸쳤다. 노화의 상징이다. 이하응 초상(1869)에서 탁상시계와 함께 탁자에 놓인 뿔테안경은 권세를 뜻한다. 얕은 관심자의 상식은 여기까지. 중국사학자 한지선이 쓴 <글래시스 로드>는 베이징 유리창을 넘어 안경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져 중국에 이르렀는지를 들여다본다. 안경 발명지는 1280년대 피렌체로 추정한다. “안경이 가장 쓸모 있는 기술 중 하나이며 발명된 지 20년도 되지 않았다”는 1306년 한 수도사의 발언이 적힌 기록이 근거다. 1352년 베네치아의 한 성당 벽에 그려진 안경 쓴 성직자 초상은 방증으로 읽힌다. 중국 유입을 전하는 믿을 만한 기록은 15세기 중후반, 즉 명나라 말기 인물인 장녕의 <방주집>. 베이징에 사는 친구의 아버지가 임금한테 하사받은 안경을 보았다는 전언인데, 선덕 연간(1425~35)에 유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발명품은 해로와 육로를 타고 조공 또는 밀무역 형식으로 15세기 초 중국에 도착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상은 기존 연구의 정리.

신윤복 풍속화첩 중 <영감과 아가씨>. 조선에 유입된 안경은 17세기 중반 이후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안경 문화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출입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