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상나라 때 거북이의 등딱지에 각인된 것으로 전해지는 갑골문자. 위키미디어 코먼스
상용자해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박영철 옮김 l 길 l 8만원
한자의 재구성: 주령시대의 기억과 그 후
박영철 지음 l 길 l 3만3000원
문자학의 거장 시라카와 시즈카(1910~2006)는 사전 3부작 <자통>(字統), <자훈>(字訓), <자통>(字通)에서 독보적인 갑골문·금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자의 처음 모양과 뜻, 변화한 모양과 뜻을 해설하여 고대인의 의식과 삶의 세계를 밝혀냈다. 박영철 교수(군산대 사학과)가 옮긴 <상용자해>(常用字解)는 사전 3부작의 내용을 고교생을 포함한 더욱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서 기준 1200쪽 분량으로 쉽게 간추린 것이다.
<상용자해>와 함께 나온 박영철 교수의 저서 <한자의 재구성>은 시라카와의 <상용자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들, “시라카와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연구해온 동아시아의 문자와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다. 그렇다고 <상용자해> 번역서의 부록쯤으로 여기면 안 된다. 문자학과 역사학의 협업이 고대 사회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풍부한 실마리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시라카와는 한자의 문화사적 이해를 중시한다. 한자는 “성립했던 당시의 종교적 관념에 기초해서 의례의 본질이 그대로 문자 구조에 반영된 것이다.” 당시 생활환경을 떠나 관념적으로 구성된 문자가 아니다. “문자를 통해 그 생활사나 정신사적 이해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문자를 문화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문자학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라카와의 이러한 학문적 지론이 <상용자해>를 일반적인 뜻풀이 사전이나 어원사전 이상의 사전으로 만들어준다. 그는 수천 년 시간으로 봉인된 고대인의 생각과 삶, 특히 종교적 심성과 의례의 세계를 문자라는 열쇠로 풀어낸다. 그 세계는 세속화된 오늘날과 다르기에 오히려 새로우며 우리 안의 고대를 일깨워주기도 한다. ‘재’(才)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표시로 세운 표목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표목 상부에 가로목을 놓고 여기에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인 축문을 넣는 그릇을 둔다. 이것으로써 그 장소가 성화(聖化)되며 才는 신성한 장소로서 ‘있는’ 것을 말한다. 나무를 세우는 것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르는 장소를 성화하는 방법이다. 才는 성화되고 신성한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본래 뜻으로서 才는 在(있다)의 본래 글자이다.”
박영철 교수는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인 축문을 넣는 그릇’을 뜻하는 글자(→ 오른쪽 그림)를 발견한 것이 시라카와의 큰 업적이라고 평한다. ‘재’(才)의 성립기 모양에 사실상 처음 등장하는 이 글자의 이름을 박 교수는 ‘축문 그릇 재’로 새긴다. 존재의 재(在)를 이루는 왼쪽 요소인 재(才)가 축문 그릇 재를 표시한다는 것은, 신에게 올리는 기도로 성화된 장소를 통해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존재의 존(存) 역시 인간이 탄생해 거치는 첫 의례이니 인간 존재의 의미는 신에게 물어 비로소 있게 된다는 뜻. 존재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시라카와는 한자가 형(形)·음(音)·의(義) 세 요소 가운데 형(形) 중심 문자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자형(字形) 중심으로 글자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한자의 성립 초기 형(形)을 통해 그 최초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고대인의 일상 속 의례와 종교적 관념을 반영한다. 한자는 구체적 현실의 상징 부호에서 출발하여 추상적 개념과 사유 체계로 나아갔다.
박영철 교수는 이에 대해 주술적·영적 힘을 신뢰하던 “주령(呪靈) 시대에 온갖 주술 도구를 동원했던 고대인들의 화상 기록, 주령시대 의례의 모습을 스캔한 그림 파일”이 바로 한자라고 말한다. 그 파일을 풀어내는 작업이 시라카와의 한자학이다. 인(人)과 이(二)를 조합한 모양으로, <설문해자>가 두 사람이 서로 친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인(仁)을 시라카와는 이렇게 풀이한다.
“옛 자형은 사람의 허리 아래 자그마하게 二의 모양을 더한다. 二는 아마 방석의 모양일 것이다. 仁은 사람이 방석 위에 앉는 모양이고 ‘따뜻함, 누긋함’이라는 뜻이 되고, 후에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되었다. 방석이 따뜻하다는 뜻의 仁이 유교 덕목의 하나로서 점점 추상화되어 고도의 관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박영철 교수에 따르면 인(仁)은 중국사상사에서 공자 이전에는 어떠한 개념으로 나타난 적이 없고 공자에 의해 처음으로 가치관이 담긴 말로 등장했다. <논어>에 인에 관한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가 많은 까닭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낯선 말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높은 도덕적 경지인 인이 본래는 상대에게 방석을 내주며 앉을 자리를 권하는 소박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가나다순 표제자 배열과 음이 같은 한자 총획 순 배열에 따라 찾아보고 싶은 한자를 찾아보는 것이 기본 활용법이겠지만, 책 말미의 ‘음훈 찾아보기’를 활용하면 더 흥미롭고 유익하다. ‘음훈 찾아보기’의 ‘노래하다’ 항목에는 모두 여섯 글자가 있다. 그 가운데 가(歌)는 주구(呪具)로 쓰는 나무 지팡이를 치면서 신에게 재촉하듯 다그치듯 기도하는 소리의 리듬이다. 요(謠)는 질그릇 위에 고기를 올려 신에게 바치고 신에게 조르듯 노래하는 것이다.
명실상부 대가의 학문적 공력이 응축된 사전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무조건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상용자해> 역시 다양한 해(解) 가운데 빼어난 하나일 것. ‘解’란 무엇일까? <상용자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꾸 찾아보고 싶어진다. ‘解’는 칼과 소를 조합한 모양으로, 소의 뿔을 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이 특별한 사전은 책꽂이에 꽂지 않고 책상 위에 두어 수시로 펼쳐보기 좋다. 사전의 ‘전’(典)은 물건을 놓아두는 대 또는 책상 위에 책을 놓아둔 모양이다.표정훈 출판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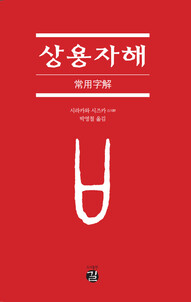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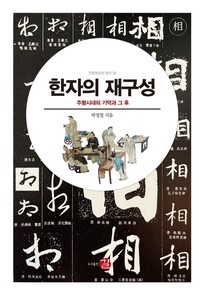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