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동반자 개의 천재성 주목
다양한 접근으로 개의 본성 탐구
늑대가 스스로를 가축화한 결과
친화성이야말로 영리함의 배경
다양한 접근으로 개의 본성 탐구
늑대가 스스로를 가축화한 결과
친화성이야말로 영리함의 배경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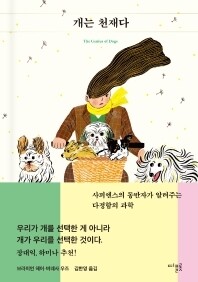
사피엔스의 동반자가 알려주는 다정함의 과학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지음, 김한영 옮김 l 디플롯 l 2만2000원 서너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개를 두고 천재란다. 본디 지은이가 말하는 천재는 ‘동물 천재’다. 판단 기준은 이렇다. 동일 종 또는 가까운 종들과 비교해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가.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천재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의 사촌 늑대와 달리 개는 인간과 동거하며 거의 같은 수준의 삶을 누린다. 바퀴벌레와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창궐해 있다. 그것도 1만2000년 전부터. 첫 질문 통과. 엎어둔 두 컵 중 한쪽에만 먹이를 두었다. 눈짓, 손짓으로 먹이 든 컵을 가리키며 “찾아”라고 하면 개는 해당 컵에서 먹이를 찾아냈다. 지은이는 이 실험을 통해, 개가 ‘짓’이 방향성임을 추론한다고 본다. 달은 못 보고 손가락 끝만 보는 인간도 있다는데…. 둘째 질문 통과. 개의 천재성은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터득했다고 본다. 희한하게도 가축화는 늑대 스스로 했다. 인간이 촌락을 형성하며 만들어진 식량원인 똥과 음식 쓰레기 무더기를 찾아서. 통상적인 적자생존 원리와 달리 덜 공격적이고 친화적인 개체가 살아남았다. 이쯤에서 논리가 비약하는데 인간도 그렇다는 요지다. 비친족과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아이를 교대로 보살피고, 관용적인 이웃 집단과 힘을 합쳐 덜 관용적인 집단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개인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잘 생존하고 번식했다. 친화성이 인간을 더 영리하게 만들었다. 사랑이 넘치는 보노보 집단의 예에서 추론해 내린 결론이다. 오늘날처럼 혁신적인 도시가 가능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자기가축화’ 산물이다. 콩고에서 조우한 원시 개, 원시 수렵족. 아이들 먹이기도 힘들 텐데, 개를 어떻게 먹이느냐는 질문에 개를 굶기느니 카누를 팔거나 아이를 하나쯤 잃는 게 낫다는 대답. 개가 없으면 모두 굶어죽을 거라며. 지은이는 관용적 인간이 개한테서 야간 경비와 고기 공급 등 이중의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한다. 인간과 개가 ‘상호가축화’했다고 못 할 바도 아니다. 개의 세계는 어떨까. 가령 인간이 쓰는 단어를 이해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훈련을 시키면 수백개까지. 새 지시어를 들었을 때 지금껏 배운 적이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며 단어집을 만든다. 심지어 장난감-비장난감을 구별함으로써 범주를 이해하고, 시각적 모사물 즉 그림이 실제 대상의 상관물임을 안다. 소리 냄은 대화의 일종이다. ㉮먹이를 앞에 뒀을 때 ㉯이방인이 접근했을 때 등 두 가지 으르렁거림을 녹음했다. 맛있는 뼈에 접근하는 개의 반응이 달랐다. ㉯보다 ㉮를 들려줬을 때 뼈에 접근하기를 더 꺼렸다. 또 다른 실험, 혼자 있을 때 내는 하울링과 낯선 이가 다가올 때의 짖음을 녹음해 들려줬다. 개들은 전자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데 비해 후자는 들려주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몸짓도 소통 도구로 활용한다. 놀이를 할 때 가슴을 지면까지 떨구고 추적하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튀어 나갈 준비를 하는 동작인 ‘놀이인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동작이 재미로 하는 것임을 알린다. 다른 개가 놀이인사를 봤을 때 동의하는 뜻으로 배를 보이며 뒹구는 ‘자기 불구화’ 동작을 한다. 인간에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 두 나무 사이에 늘인 키높이 줄에 대바구니 세개. 개가 보는 가운데 제삼자가 그 중 한 곳에 음식을 숨기고 퇴장했다. 지은이가 등장하자 개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 밑을 뛰어다니고, 지은이와 바구니를 번갈아 보면서 짖었다. 음식을 찾아 먹게끔 도와달라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개들은 인간처럼 상대방 시점을 취한다! 나무판과 유리판을 가로로 병렬하고 그 뒤에 각각 공을 두었다. 지은이는 판 쪽 편에, 개는 공 쪽 편에 머문 상태에서 “가져와”라는 명령을 했다. 개는 유리판 쪽 공, 즉 지은이한테 존재가 보이는 공을 가져왔다. 나무판 쪽 공이 개한테는 보이지만 지은이한테는 보이지 않으니 없는 거나 진배없다라고 본다는 해석이다.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 누리집 갈무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