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질문들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관한 궁극의 물음 15
토니 로스먼 지음, 이강환 옮김 l 한겨레출판 l 1만6000원
우주는 정말 빅뱅으로 탄생한 것일까? 빅뱅으로 탄생했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다중우주는 존재하는 것일까?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막막한 물음은 보통 사람들만 묻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이런 물음을 안고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려고 한다.
<빅뱅의 질문들>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평생을 걸어온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토니 로스먼(69)의 최신 저작이다. 로스먼은 사람들이 흔히 묻는 물음 15가지를 통해 우주론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토니 로스먼. 위키미디어 코먼스
우주론은 138억광년에 이르는 광대한 우주의 구조와 역사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우주론 연구자들은 우주 탄생 직후의 사태에 연구 역량을 쏟아부었다. 우주가 태어나 1초가 지나기 전의 짧은 시간이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우주론의 이론적 발판은 1916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제공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오류로 드러났다.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 팽창을 시작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출발이다. 1940년대에 처음 나온 빅뱅 가설은 1964년 우주배경복사(CMBR)가 관측됨으로써 우주론의 정설로 등장했다.
우주배경복사는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출된 빛을 말한다. 이 빛이 우주의 끝 전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그런데 이 우주배경복사는 정확히 말하면, 빅뱅 후 38만년이 지난 시점에 퍼져나간 빛이다. 그 이전 상태의 초기 우주는 너무나 뜨거워 물질이 원자를 이루지 못하고 양성자와 전자로 나뉘어 뒤엉킨 ‘플라스마’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빛 알갱이 곧 광자가 플라스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손전등의 빛이 안개를 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초기 우주의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 양성자와 전자가 원자로 결합한 뒤에야 빛이 튀어나갈 수 있었다.
이 우주배경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다시 말해 밀도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1992년 코비(COBE) 망원경이 우주배경복사의 온도를 측정해 그 측정값을 우주의 지도로 그려냈다. 10만분의 1 정도로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온도 차가 확인됨으로써 우주 초기 상태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이 입증됐다. 이로써 빅뱅 이론은 우주론의 표준 모형으로 확립됐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빅뱅 이론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탄생의 영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 영점에 이르게 되면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걸 ‘빅뱅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특이점 상태에서는 “상대성이론의 모든 방정식이 불타버린다.” 어떤 물리 법칙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 팽창을 설명하려면 탄생 직후 어떤 시점의 급속한 변화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등장한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빅뱅 직후 ‘10의 36승분의 1초’에서 ‘10의 32승분의 1초’ 사이에 우주의 크기가 ‘10의 27승 배’ 커졌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눈 깜짝할 새 팝콘이 우주만큼 커진 셈이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다중우주론이다. 우주 시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인플레이션이 ‘양자장 요동’을 일으켜 ‘딸 거품’을 일으킨다. 이 ‘딸 거품’ 곧 ‘하나의 인플레이션에 뒤이어 일어나는 무수한 인플레이션’이 다중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가설이다. 닭이 알을 낳듯이 우주가 끝없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우주론은 그야말로 머릿속 생각일 뿐이다. 원시 우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터에 다중우주론은 더욱 희박한 추측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이든 다중우주든 가설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허블우주망원경이 2014년에 찍은 ‘창조의 기둥’(왼쪽)과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찍은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은 지구에서 6500광년 떨어져 있는 독수리성운에서 성간 가스와 우주 먼지가 몰려 있는 곳인데,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공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 ‘되튕김(bouncing) 우주론’이다. 지은이는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통상의 빅뱅 이론은 우주가 무에서 탄생해 현재 크기로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되튕김 우주론은 이런 ‘직선적인 우주관’을 부정하고 ‘순환적인 우주관’을 제시한다. 우주가 팽창을 거듭하다 어느 수준에서 반대로 수축하기 시작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최초 상태에서 다시 급팽창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되튕김’이다. 이런 설명을 따르면, 우주 탄생의 특이점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에 특이점이 야기하는 ‘무한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튕김 이론에서는 이 되튕김이 빅뱅 특이점 직전, 그러니까 ‘플랑크 규모’의 길이와 시간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우주의 크기가 ‘10의 33승분의 1센티미터’, 그리고 특이점에 이르기 직전인 ‘10의 43승분의 1초’ 때에 다시 팽창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플랑크 규모는 너무나 작아서 그 사태를 설명하려면 양자역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양자중력이론’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을 다루는 이론인 데 반해 양자역학은 중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상충하는 두 이론을 통일하려는 것이 ‘끈 이론’과 ‘고리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플랑크 규모’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명하려는 것이지만, 이 이론들도 가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은이는 현재까지 등장한 이론들로는 우주 최초의 사건은 설명되지 않으며 가까운 시간 안에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론 탐구는 답할 수 없는 문제의 난마를 헤쳐나가는 작업이다. 우주에 관한 이 모든 물음은 ‘궁극의 물음’으로 귀착한다. 그 물음을 지은이는 책의 마지막 줄에 써놓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이 물음은 수천년 동안 인류가 물었던 물음이며 17세기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정식화하여 물었던 물음이기도 하다. 이 궁극의 물음 앞에서 과학과 철학의 경계는 지워진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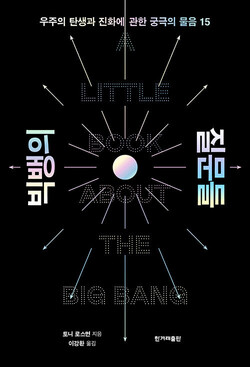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