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저널리스트의 심리학 이야기
인간의 뇌는 ‘예측기계’ 사실에 착안
다양한 실험과 데이터 근거로 삼아
근본적 변화 낳는 ‘기대 효과’ 분석
인간의 뇌는 ‘예측기계’ 사실에 착안
다양한 실험과 데이터 근거로 삼아
근본적 변화 낳는 ‘기대 효과’ 분석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10초만 고민해보라. 아무 형상이 보이지 않을 거다. 반려동물이라는 힌트를 주면 어떨까. 그래도 모르겠다면 아래쪽 답을 보라. 확실하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뇌가 예측을 수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혼란스런 정보를 수정해준 덕분이다. <기대의 발견> 지은이는 ‘뇌는 예측기계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기대효과 이야기를 펼친다. 까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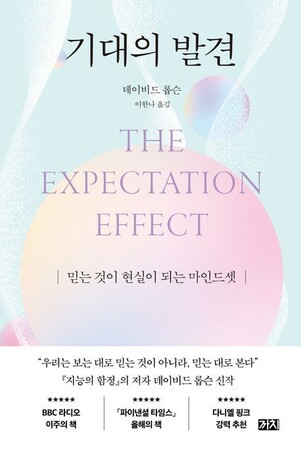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마인드셋
데이비드 롭슨 지음, 이한나 옮김 l 까치 l 2만원 <긍정적 사고의 힘>을 쓴 개신교 목사 노먼 필(1898~1993)이 과학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롭슨으로 몸바꿈해 <기대의 발견>(원제는 The Expectation Effect)을 썼다고나 할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믿으면 현실화한다는 필의 지론에서 ‘긍정적 사고’를 ‘기대’로 치환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로써 이론을 뒷받침한다. 출발점은 “우리의 뇌는 예측기계다”라는 명제다. 망막으로 들어온 시각정보가 뇌에 이르면 뇌는 기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위기호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 믿는 대로 본다는 얘긴데, 시각 외에 청각, 미각, 촉각 등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뇌의 성질을 이용하면 믿음으로써 정교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버드대 엘렌 랭어의 실험(이렇게 권위에 의탁한 데이터는 책에서 수없이 반복된다)에 따르면 시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뇌의 시각처리 능력을 끌어올려 망막에 맺힌 흐릿한 글자의 상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 지은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플라세보’ 효과. 신약(또는 새 치료법)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대조집단으로 설정된 가짜약 투여 환자군에서 발견되는 병증호전 효과를 말하는데, 약을 복용했다는 믿음에서 생긴 노이즈 현상이다. 임상시험 제도 도입 뒤 수십 년 동안 제약사들은 약물개발 황금기를 맞아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실패 확률이 높아졌다. 실제 약과 플라세보 약의 효능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증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 지은이는 시험 대상자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많은 약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플라세보 단어만으로도 플라세보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은이는 노이즈 현상에서 ‘기대 효과’란 ‘보물’을 낚은 셈이다. 플라세보 효과가 ‘낫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면 ‘노세보’ 효과는 ‘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알레르기, 편두통, 요통, 뇌진탕 등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가 그것이다. 긍정적 기대가 도파민, 오피오이드 등 기분 좋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촉발하는 반면 부정적 기대는 이를 비활성화하고, 통증 신호를 증폭하는 콜레시스토키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