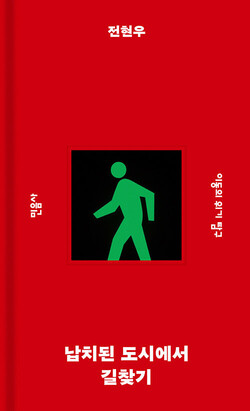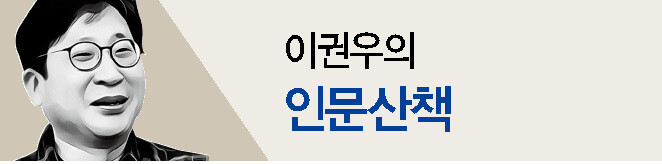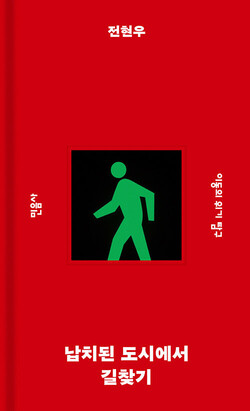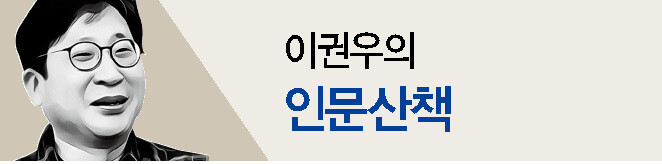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전현우 지음 l 민음사(2022)
무엇인가에 압도당할 적에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상반된다.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적에는 숭고미를 느끼지만,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옴짝달싹 못 하게 되면 외면하거나 체념하기도 한다. 인류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적 반응은 대체로 후자 쪽인 듯하다. 위기가 과장되었다는 선전에 더는 현혹되지 않지만, 한 개인이 이 위기를 막기 위해 할 일이 없다면서 체념하는 듯이 보인다.
전현우는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에서 단호하게 이 위기를 외면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고, 직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때 비로소 할 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
지은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복병을 들추어낸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분야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줄기는커녕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의 심성이다. 발전의 상징이 이동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라 여기며, 교통수단을 무한히 확장하는 데 기꺼이 동의했다. 이를 지은이는 ‘자동차 지배’라고 부른다. 자동차 중심의 신도시를 기획한 국가와 지방정부, 쇼핑몰을 고속도로 주변에 짓는 유통대기업, 교외에 카페나 공장을 짓는 지주나 기업이 바로 자동차 지배를 몰고 온 ‘혼종’이다. 그 결과 걷기공간은 ‘납치’되고 말았고, “지구의 온도조절 시스템은 뒤흔들리고 있다.”
지은이가 내세우는 대안은 ‘15분 도시’이다. 이 도시는 “보도,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수단을 통해 15분 내로 일상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한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대폭 줄이고, 주된 이동수단은 걷기다. 이 ‘15분 도시’ 수십 또는 수백 개를 하나로 묶어 광역권을 형성하는데, 그 사이를 잇는 광역교통은 철도다. 자동차에 납치된 걷기를 해방하고, 에너지와 탄소효율이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철도를 우선하고, 이동거리를 적정수준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걸맞다.
지은이가 소개한 ‘코펜하겐의 손가락 계획’도 참고할 만하다. 도심은 손바닥에 해당하고, 위성도시는 손가락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손가락 사이는 녹지로 조성된다. 손가락 뼈대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은 철도가 맡는다. 자동차 지배를 깨고 이동을 다시 설계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방식으로 “망각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오래된 원칙의 재평가를 주장한다. 이른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주행세, 혼잡통행료,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높여 징수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안이 될 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지은이의 반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은이가 기후위기 시대를 직면하는 시민이라면 쉽게 동의할 주장을 공들여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지키고 있는 자신의 성채에 기후문제를 진입시키려면 결국 자신이라는 문지기를 설득해야만 한다”고 여겨서이다. 이 파멸적 위기의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한마디로 하면, 자동차를 버리고 걷다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먼 길 떠날 적에 기차를 타면 된다. 우리가 이동방식을 바꾸면 “대멸종과 생태계 빈곤화”를 피할 수 있다니,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권우/도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