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미
문태준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6000원
문태준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6000원
전통 서정시 맥 잇는 문태준의 3번째 시집 “먼 길을 돌고 돌아 만나는,/마음이 누운 자리”
시쓰기란, 찰나를 통해 영원에 이르는 에움길 그의 시 모태가 되는 추억의 세계 아름다운 우리말로
시쓰기란, 찰나를 통해 영원에 이르는 에움길 그의 시 모태가 되는 추억의 세계 아름다운 우리말로
문태준(36)씨는 지금 한국 문단에서 가장 ‘잘나가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미당문학상(2005)과 소월시문학상(2006)을 비롯해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동료 시인과 평론가들에 의해 ‘올해의 가장 좋은 시와 시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1994년에 등단한 그는 6년 뒤에 첫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을 출간하고 다시 4년 뒤에 두 번째 시집 <맨발>을 내었으며 이번에는 불과 2년 만에 세 번째 시집 <가재미>(문학과지성사)를 내놨다. 6-4-2로 이어지는 시집 발간 속도의 가속화는 그의 시단 내 비중의 증가를 숫자로써 보여주는 셈이다.
그가 이즈음 ‘미래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단의 또래 시인들과 확연히 다른 경향의 시를 쓴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 마땅하다. ‘미래파’에 맞서 그의 시세계를 ‘과거파’라 부른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고향집 뒤란으로 상징되는 전통과 추억의 세계가 그의 시의 모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한국 전통 서정시의 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시인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표제작 <가재미>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주인공이거니와 ‘그녀’는 아마도 시인의 집안 어른일 터.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우는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 옆에 나란히 눕는 일뿐이다. 그리고, 죽음 쪽으로만 시선이 가 있는 환자를 대신해 그이의 ‘아직 살았을 적’을 기억하는 것. 이런 일이 죽어가는 이에게 위안이 될까? 마지막 행으로 그에 대한 답을 대신하자.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미당문학상 수상작인 <누가 울고 간다>를 <가재미>에 이어서 읽는 일은 흥미롭다.
“이름도 못 불러본 사이/울고/갈 것은 무엇인가//울음은/빛처럼/문풍지로 들어온/겨울빛처럼/여리고 여려//누가/내 귀에서/그 소릴 꺼내 펴나//저렇게/울고/떠난 사람이 있었다”(<누가 울고 간다> 부분)
미당과 소월 닮은 ‘떠남과 울음’
여기서도 ‘누구’는 울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재미>의 ‘그녀’와 이 시의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시(戀詩) 분위기를 풍기는 이 시에서 울음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에서 울음이 모종의 ‘떠남’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새겨 둘 법하다. 어떤 식으로든 떠나는 이들이 울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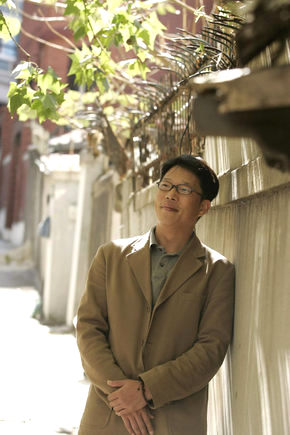 이번에는 소월시문학상 수상작 <그맘때에는>을 들여다보자. “하늘에서 잠자리가 사라”진 사건이 먼저 제시된다. 잠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잠자리가 하늘에서 사라지듯/그맘때에는 나도 이곳서 사르르 풀려날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떠나는 것은, 잠자리에 이어서, 시인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가 울 차례인가. 시를 마저 읽어 보자. “어디로 갔을까//여름 우레를 따라갔을까//여름 우레를 따라갔을까//후두둑 후두둑 풀잎에 내려앉던 그들은”. 시인은 잠자리의 행방을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운명, 죽음 이후의 행로에 대해서이다. 그렇지만 누군들 알 수가 있을소냐. 그것은 하늘의 소관인 것을.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찰나에게 비석을 세워”(<찰나 속으로 들어가다>)주는 일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꿔온 영원”(<자루>)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찰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신술은 중요하다. 유한한 목숨붙이인 우리가 영원을 인식하는 방법은 찰나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 보라. 영원의 한 단면으로서의 찰나를 우리네 몸이 구현하고 있지 않겠는가.
“몸이 뿌리로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척척척 밀려가다 슬로비디오처럼 뒤로 뒤로 주섬주섬 물러나고 늦추며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뿌리가 사라지는 몸의 숙박부, 싯다르타에게 그러했듯 왕궁이면서 화장터인 한 몸”(<극빈 2> 부분)
영원의 또 한 처소로서 시인이 떠나온 고향집 뒤란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고향집 뒤란은 문태준 시의 태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시를 살(生) 수 있을지언정 쓸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신생아가 자궁을 벗어나듯, 젖먹이가 어미 젖을 떼듯 분리와 이유(離乳)의 순간은 닥쳐온다. 그리고 “저 풍경 바깥으로 나오면/저 풍경 속으로는/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젖 물리는 개> 부분). 그 때문에 시인은 “아,/다시 생각해도/나는/너무 먼/바깥까지 왔다”(<바깥>)고 회한 어린 어조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점? “먼 길을 돌고 돌아가 만나는,/마음이 누운 자리”(<저수지>)는 어떠할까. 여기서 시인은 상상적으로나마 영원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몸으로 떠나온 영원을 마음과 시를 통해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 결국 시인에게 시 쓰기란 찰나를 통해서 영원에 이르는 에움길이자 지름길인 것.
‘앓음알음’으로 살아있음을 지각
인용한 <저수지>의 앞부분에 “산도 와서 눕는다/병(病)이 병을 받듯/물빛이 산빛을 받아서”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자. 그러고 보면 <번져라 번져라 병(病)이여>라는 제목의 시도 있다. 시집에 실린 67편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인 이 시에서 시인은 “나는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다음 이렇게 시를 마무리한다: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그래야 나는/살아 있는 사람이다”. 이 시의 맥락에서 ‘앓음’이란 생각하고 보고 아는 행위들과 동일한 의미망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박상륭 식으로 하자면 ‘앓음알음’의 경지라 할 수도 있겠다. 병으로서의 앎과 삶이라고나 할까(식자우환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통 서정시의 계승자로서 그의 시에 백석(“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과 미당(“아주 가까이는 아니게”) 같은 선행 시인들의 영향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자신의 시에 적극 끌어들인 아름다운 우리말들의 목록은 후대 시인들에게 또 다른 메아리를 울리게 될 것이다: 잘그랑거리다, 외따롭고, 머츰하다, 무러워요, 도리반거리다, 슴슴해졌다, 뜨막하게, 잗다랗고, 걀쭉한, 아그대다그대, 도닥도닥, 졸망스러운….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이번에는 소월시문학상 수상작 <그맘때에는>을 들여다보자. “하늘에서 잠자리가 사라”진 사건이 먼저 제시된다. 잠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잠자리가 하늘에서 사라지듯/그맘때에는 나도 이곳서 사르르 풀려날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떠나는 것은, 잠자리에 이어서, 시인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가 울 차례인가. 시를 마저 읽어 보자. “어디로 갔을까//여름 우레를 따라갔을까//여름 우레를 따라갔을까//후두둑 후두둑 풀잎에 내려앉던 그들은”. 시인은 잠자리의 행방을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운명, 죽음 이후의 행로에 대해서이다. 그렇지만 누군들 알 수가 있을소냐. 그것은 하늘의 소관인 것을.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찰나에게 비석을 세워”(<찰나 속으로 들어가다>)주는 일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꿔온 영원”(<자루>)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찰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신술은 중요하다. 유한한 목숨붙이인 우리가 영원을 인식하는 방법은 찰나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 보라. 영원의 한 단면으로서의 찰나를 우리네 몸이 구현하고 있지 않겠는가.
“몸이 뿌리로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척척척 밀려가다 슬로비디오처럼 뒤로 뒤로 주섬주섬 물러나고 늦추며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뿌리가 사라지는 몸의 숙박부, 싯다르타에게 그러했듯 왕궁이면서 화장터인 한 몸”(<극빈 2> 부분)
영원의 또 한 처소로서 시인이 떠나온 고향집 뒤란을 들 수 있지 않을까. 고향집 뒤란은 문태준 시의 태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시를 살(生) 수 있을지언정 쓸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신생아가 자궁을 벗어나듯, 젖먹이가 어미 젖을 떼듯 분리와 이유(離乳)의 순간은 닥쳐온다. 그리고 “저 풍경 바깥으로 나오면/저 풍경 속으로는/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젖 물리는 개> 부분). 그 때문에 시인은 “아,/다시 생각해도/나는/너무 먼/바깥까지 왔다”(<바깥>)고 회한 어린 어조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점? “먼 길을 돌고 돌아가 만나는,/마음이 누운 자리”(<저수지>)는 어떠할까. 여기서 시인은 상상적으로나마 영원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몸으로 떠나온 영원을 마음과 시를 통해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 결국 시인에게 시 쓰기란 찰나를 통해서 영원에 이르는 에움길이자 지름길인 것.
‘앓음알음’으로 살아있음을 지각
인용한 <저수지>의 앞부분에 “산도 와서 눕는다/병(病)이 병을 받듯/물빛이 산빛을 받아서”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자. 그러고 보면 <번져라 번져라 병(病)이여>라는 제목의 시도 있다. 시집에 실린 67편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인 이 시에서 시인은 “나는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다음 이렇게 시를 마무리한다: “번져라 번져라 병이여,/그래야 나는/살아 있는 사람이다”. 이 시의 맥락에서 ‘앓음’이란 생각하고 보고 아는 행위들과 동일한 의미망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박상륭 식으로 하자면 ‘앓음알음’의 경지라 할 수도 있겠다. 병으로서의 앎과 삶이라고나 할까(식자우환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통 서정시의 계승자로서 그의 시에 백석(“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과 미당(“아주 가까이는 아니게”) 같은 선행 시인들의 영향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자신의 시에 적극 끌어들인 아름다운 우리말들의 목록은 후대 시인들에게 또 다른 메아리를 울리게 될 것이다: 잘그랑거리다, 외따롭고, 머츰하다, 무러워요, 도리반거리다, 슴슴해졌다, 뜨막하게, 잗다랗고, 걀쭉한, 아그대다그대, 도닥도닥, 졸망스러운….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여기서도 ‘누구’는 울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재미>의 ‘그녀’와 이 시의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시(戀詩) 분위기를 풍기는 이 시에서 울음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에서 울음이 모종의 ‘떠남’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새겨 둘 법하다. 어떤 식으로든 떠나는 이들이 울고 있는 것.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