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게와 느낌을 발바닥에 저장하고 눈 · 코 · 입 · 꼬리 · 머리통을
구르고 덮치고 뒹굴고 쫓기며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진돗개 수놈의 ‘일생’
늦깎이 작가 김훈(57)씨가 새 소설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푸른숲)을 내놓았다. <빗살무늬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현의 노래>에 이어 네 번째 장편이다.
<개>의 주인공은 진돗개 수놈 ‘보리.’ “태어나보니, 나는 개였고 수놈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10쪽)라고 담백하게(?) 자신의 운명을 수긍하는 놈이다. 소설은 진돗개 보리의 탄생에서부터 아마도 그의 마지막이 될 날들까지 나름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일생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사람의 몇십 평생에 비하면 사소하기 짝이 없는 몇 년간이며, 그 사이 보리는 성견으로 자라기는 하지만 소설이 끝나도록 미장가의 상태에 머물 따름이다.
소방관과 장수와 악사의 세계를 개성 넘치는 필치로 그렸던 김훈씨가 새 소설의 주인공으로 ‘개’를 택했다는 사실부터가 자못 흥미롭다. 개의 어떤 점이 그의 상상력과 창작욕을 자극했던 것일까.
‘굳은살’에 그 답이 있다. 소설 서문에서 작가는 개의 굳은살을 만져 본 경험을 토로한다. “그 굳은살 속에는 개들이 제 몸의 무게를 이끌고 이 세상을 싸돌아다닌 만큼의 고통과 기쁨과 꿈이 축적되어 있었”(5쪽)으며, 그런 의미에서 “개발바닥의 굳은살은 개들의 <삼국유사>”(6쪽)라는 것이 그의 관찰과 그에 이은 결론이다.
보리를 화자로 삼은 소설에는 몇 차례에 걸쳐 굳은살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보리 자신 “내 발바닥 굳은살은 이 세상 전체와 맞먹는 것이고 내 몸의 모든 무게와 느낌을 저장하고 있는 것”(102쪽)이라 자부하는 한편, 주인집 딸의 됨됨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나는 영희 발뒤꿈치의 굳은살을 보면서 영희가 내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다”(121쪽)고 말한다. 소설의 파국에 해당하는, 사랑하는 암캐 ‘흰순이’의 죽음을 전하면서도 “흰순이 앞발의 굳은살이 밤새도록 내 마음에 어른거렸다”(223쪽)고 서술하는가 하면, 막막하고 불리한 운명임에도 그에 의연히 맞서겠다는 결말부의 각오 역시 “어디로 가든, 내 발바닥의 굳은살이 그 땅을 밟을 것이고 나는 굳은살의 탄력으로 땅 위를 달리게 될 것”(231쪽)이라 피력할 정도로 굳은살은 소설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이미지로 구실한다.
개들의 <삼국유사>인 굳은살이란 달리 말하면, 몸으로 부대끼며 감각에 이끌리는 삶의 표상이라 할 테다. 주인공 보리는 다른 개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내 몸뚱이를 비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16) 알아차린다. 어미의 태내에서 바깥으로 내던져진 1차 독립 이후, 그야말로 단독자로서 홀로 서게 될 2차 독립을 위해 그가 몰두하는 학습 역시 절대적으로 몸과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의 것이다.
견딜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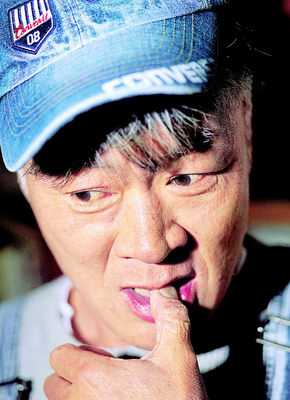 “눈, 코, 귀, 입, 혀, 수염, 발바닥, 주둥이, 꼬리, 머리통을 쉴새없이 굴리고 돌려가면서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노리고 물고 뜯고 씹고 핥고 빨고 헤치고 덮치고 쑤시고 뒹굴고 구르고 달리고 쫓기고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24~5쪽)
작가 김훈씨가 앞선 작품들에서 ‘몸으로 만나는 사실’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그런 점에서 수놈 진도견 보리는 그의 소설의 그 어느 인물보다 ‘김훈적 세계관’을 더 잘 구현하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어진 운명을 수긍한 바탕 위에서 몸과 감각으로써 경영하는 보리의 한살이는 인간적 가치니 대의니 하는 ‘잡티’가 끼어들 여지가 없이 온전히 ‘몸의 진실’에 충실한 면모를 보인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복잡함,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발설되는 말의 거짓됨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단순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소설 속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갈등이라 할 도사견 잡종 ‘악돌이’와의 싸움이 다만 수컷끼리의 생물학적·유전적 다툼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 소설 <개>의 한 성취라 할 만하다. 동물을 주인공 삼은 기왕의 소설들에서 동물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적 가치의 구현자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려지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 <개>가 생태 소설이라는 말은 아니다. <개>의 주인공 보리 역시 인간적 태도와 가치가 투영된, ‘인간화한’ 개임은 물론이다. 보리가 악돌이에게 싸움을 걸기 전에 악돌이의 안하무인격 행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보리의 관점에서 보는 ‘편견’에 가까울 터이다. 아직 편견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대로 아래 대목이야말로 오히려 소설의 기조에 더 잘 어울린다 하겠다.
“그렇게 못되고 경우없는 놈이 그토록 강하다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놈은 어쨌든 강한 놈이었다. 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한다.”(182쪽)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싶었으리라.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지 않으려는 데에서 작위와 무리가 비롯된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견딘다는 것이 악돌이의 힘의 행사를 수수방관한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보리는 표면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돌이에게 거듭 싸움을 건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흰순이가 악돌이의 새끼를 낳게 된 사태에 즈음해서는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정도로 동물적 현실에 충실하다. 그에 비한다면, “흰순아, 네 새끼는 내가 잘 길러줄게. 흰순아 다시는 개로 태어나지 마, 라면서 나는 아침까지 울었다”(226쪽)는 작문을 써서 상을 받고는 이내 “환하게 웃”(226쪽)는 흰순이네 주인집 아들 갑수의 행동은 그야말로 ‘인간적’이라 해야만 할 것이다.
섬세하고 씩씩한 문장의 맛
주인집 식구들과의 따뜻한 교감, 그럼에도 개로서 감수해야 하는 잔인한 처우, 흰순이를 향한 어여쁜 순정, 악돌이와의 박진감 넘치는 싸움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지만, 소설 <개>는 아무래도 소품이라는 느낌을 준다. 우선 분량부터가 장편이라기보다는 중편에 가까운데다 보리의 한살이가 장편에 걸맞은 부피와 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럼에도 김훈씨 특유의 섬세하고도 씩씩한 문장을 만나는 기쁨은 여전하다.
“지나간 날들은 개를 사로잡지 못하고 개는 닥쳐올 날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근심하지 않는다.”(63쪽)
“겨울에는 가느다란 냄새들이 선명해진다. 세상의 냄새들이 메말라서 깨끗해지는 겨울의 헐거움을 나는 좋아했다.”(170쪽)
“세상에는 사납고 무례하고 힘센 것과 달려가서 쫓아버려야 할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186쪽)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진성
“눈, 코, 귀, 입, 혀, 수염, 발바닥, 주둥이, 꼬리, 머리통을 쉴새없이 굴리고 돌려가면서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노리고 물고 뜯고 씹고 핥고 빨고 헤치고 덮치고 쑤시고 뒹굴고 구르고 달리고 쫓기고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24~5쪽)
작가 김훈씨가 앞선 작품들에서 ‘몸으로 만나는 사실’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그런 점에서 수놈 진도견 보리는 그의 소설의 그 어느 인물보다 ‘김훈적 세계관’을 더 잘 구현하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어진 운명을 수긍한 바탕 위에서 몸과 감각으로써 경영하는 보리의 한살이는 인간적 가치니 대의니 하는 ‘잡티’가 끼어들 여지가 없이 온전히 ‘몸의 진실’에 충실한 면모를 보인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복잡함,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발설되는 말의 거짓됨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단순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소설 속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갈등이라 할 도사견 잡종 ‘악돌이’와의 싸움이 다만 수컷끼리의 생물학적·유전적 다툼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 소설 <개>의 한 성취라 할 만하다. 동물을 주인공 삼은 기왕의 소설들에서 동물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적 가치의 구현자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려지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 <개>가 생태 소설이라는 말은 아니다. <개>의 주인공 보리 역시 인간적 태도와 가치가 투영된, ‘인간화한’ 개임은 물론이다. 보리가 악돌이에게 싸움을 걸기 전에 악돌이의 안하무인격 행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보리의 관점에서 보는 ‘편견’에 가까울 터이다. 아직 편견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대로 아래 대목이야말로 오히려 소설의 기조에 더 잘 어울린다 하겠다.
“그렇게 못되고 경우없는 놈이 그토록 강하다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놈은 어쨌든 강한 놈이었다. 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한다.”(182쪽)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싶었으리라.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지 않으려는 데에서 작위와 무리가 비롯된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견딘다는 것이 악돌이의 힘의 행사를 수수방관한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보리는 표면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돌이에게 거듭 싸움을 건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흰순이가 악돌이의 새끼를 낳게 된 사태에 즈음해서는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정도로 동물적 현실에 충실하다. 그에 비한다면, “흰순아, 네 새끼는 내가 잘 길러줄게. 흰순아 다시는 개로 태어나지 마, 라면서 나는 아침까지 울었다”(226쪽)는 작문을 써서 상을 받고는 이내 “환하게 웃”(226쪽)는 흰순이네 주인집 아들 갑수의 행동은 그야말로 ‘인간적’이라 해야만 할 것이다.
섬세하고 씩씩한 문장의 맛
주인집 식구들과의 따뜻한 교감, 그럼에도 개로서 감수해야 하는 잔인한 처우, 흰순이를 향한 어여쁜 순정, 악돌이와의 박진감 넘치는 싸움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지만, 소설 <개>는 아무래도 소품이라는 느낌을 준다. 우선 분량부터가 장편이라기보다는 중편에 가까운데다 보리의 한살이가 장편에 걸맞은 부피와 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럼에도 김훈씨 특유의 섬세하고도 씩씩한 문장을 만나는 기쁨은 여전하다.
“지나간 날들은 개를 사로잡지 못하고 개는 닥쳐올 날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근심하지 않는다.”(63쪽)
“겨울에는 가느다란 냄새들이 선명해진다. 세상의 냄새들이 메말라서 깨끗해지는 겨울의 헐거움을 나는 좋아했다.”(170쪽)
“세상에는 사납고 무례하고 힘센 것과 달려가서 쫓아버려야 할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186쪽)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진성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