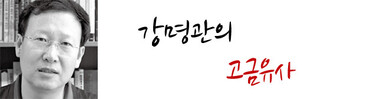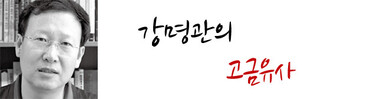전염병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허다한 전염병의 유행 기록이 남아 있다. 천연두와 홍역, 그리고 장티푸스와 콜레라, 페스트로 추측되는 전염병이 거의 해마다 발생했다. 질병의 속성과 치료법을 몰랐기에 전염병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희생자의 규모가 컸던 몇몇 경우를 보자.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전염병의 창궐로 1743년(영조 19)에는 6만~7만명, 1749년(영조 25)에는 50만~60만명이 죽었다. 1798년 말에서 1799년 초에 유행했던 전염병(장티푸스로 추정)에는 12만8천여명이, 1859년 가을에 시작된 콜레라에는 40여만명이 죽었다.
나라의 대책이 없었을 리는 없다. <벽온방>(僻瘟方) 등의 책을 언해하여 보급하기도 하고, 병막(病幕)을 세워 환자를 격리하기도 했지만,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대책이 먹혀들었다면 수만, 수십만명의 희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
영조 때의 어의(御醫) 유중림(柳重臨)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란 책을 썼다. 사족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지식을 모아 놓은 책이다. 농사짓는 법, 길쌈하는 법, 요리하는 법, 성생활과 임신, 출산과 육아, 취미생활, 구급처방 등이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과 관련하여 비상하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그는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는 법’(厚隣里)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염병에 걸려 온 가족이 앓는 경우가 있다면, 병막(病幕)을 지어 그들을 격리하고 약물(藥物)을 마련해 주고 죽을 쑤어 먹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돌보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동네의 일을 잘 아는 장로(長老)와 의논하여 상의한 뒤 각자 농기구를 갖추어 병자의 전답을 대신 경작해 준다. 그래서 농사를 망친 나머지, 동네를 떠나 떠돌이가 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동네의 풍기가 자연히 어질고 인정스러워질 것이다.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일단 병막을 지어 격리해야 한다. 당연히 약을 마련해서 먹이고 또 죽을 쑤어 먹인다. 수시로 찾아가 병세를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치료법이었을 것이다. 한편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병자의 생계다. 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병이 나아도 굶주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마을을 떠나 떠돌이가 되고 말 것이다. 누군가 나서서 사리를 아는 동네 어른과 상의하여 일을 분담한 뒤 각자 농기구를 들고 논밭으로 나가 대신 농사를 지어준다. 병자의 가족은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염병은 수없이 농촌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농민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 상호부조의 마을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이라고 다를까. ‘코로나19’가 더는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료에 더하여 공동체의 상호부조하는 심성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족. 유중림은 천연두 치료에 명성이 있었던 유상의 아들이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