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를 배경 삼은 로런 그로프의 소설집 <플로리다>에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폭풍우의 힘이 위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허리케인 어마로 플로리다 폰테 베드라 해변의 가옥이 무너져 내린 모습. AP 연합뉴스
플로리다
로런 그로프 지음, 정연희 옮김/문학동네·1만4500원
미국 동남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반도 플로리다는 햇빛을 뜻하는 ‘선샤인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지녔다. 그만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를 자랑한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그 플로리다를 무대로 삼은 로런 그로프의 소설집 <플로리다>는 그런 별칭이 주는 선입견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그로프는 두 장편 <아르카디아>와 <운명과 분노>가 한국에도 번역돼 있는 작가다. 그가 2018년에 낸 두 번째 소설집 <플로리다>는 <운명과 분노>(2015)에 이어 다시 한 번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책에는 길고 짧은 단편 열한 편이 묶였는데 그중 여덟은 플로리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고, 프랑스와 브라질을 무대로 삼은 나머지 세 작품에서도 주인공들은 플로리다의 주민들로 어디까지나 여행 차원에서 떠나와 있는 처지다.
소설집 <플로리다>를 지배하는 정조는 뜻밖에도 불안과 공포다. 화창한 날씨와 수려한 풍광 덕분에 주로 휴양과 관광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이 지역에 그토록 어둡고 불길한 구석이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작가는 집요하게 불안과 공포를 파고든다. 종려나무에서 에어컨 안으로 떨어져 팬의 날개가 돌아갈 때마다 조금씩 몸이 먹혀들어가는 뱀, 모종의 음모인 듯 파여 누군가 그 안으로 빠지기를 기다리는 싱크홀, 앨리게이터와 표범 같은 야생의 포식자들, 닫힌 문을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폭풍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강간과 폭행 그리고 굶주림과 외로움 같은 인간사의 모순과 혼돈이 소설 주인공들을 둘러싼 채 위협하고 경고한다. 굴복하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플로리다에서 밖에 나와 걸으면 뱀이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뱀은 뿌리덮개에도, 잡목숲에도 있다. 잔디밭에서 뱀은, 당신이 수영장을 떠나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기다리며 때를 노린다. 뱀은 송곳니를 깊이 박아넣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며 당신의 쥐 같은 발목을 지그시 바라본다.”(‘뱀 이야기’)
“나는 세상의 재앙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생물처럼 죽어가는 빙하, 소용돌이치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방대한 태평양,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수많은 종의 죽음, 중요하지 않은 듯 싱겁게 끝나버린 밀레니엄. 나는 읽는 것이 슬픔에 대한 내 허기를 얼마간 채워줄 것처럼, 그런 글을 읽으며 몹시 슬퍼한다.”(‘유령과 공허’)
플로리다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깝게는 뱀의 송곳니에서부터 멀게는 생명과 지구의 앞날에까지 너르게 걸쳐 있다. 인간의 시점에 머물지 않고 식물과 동물 심지어는 자연 현상 같은 무생물 역시 행위와 사고의 주체로 삼는 ‘생태적’ 관점은 소설집 <플로리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바람이 부서진 창틀 틈새를 뚫고 들어와 말을 걸었고, 종려나무는 채찍을 휘둘렀으며”(‘늑대가 된 개’), “집이 계단 수직판 위에서 기우뚱하더니 나를 굴려 욕조 밖으로 내보냈다”(‘아이월’), “그것이 여기 또 나타났다. 그것이 이포르에서 그녀를 또 찾아냈다. 그 공포가”(‘이포르’) 같은 문장들에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물론 자기 내부의 심리와도 행위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노숙인들이 살던 텐트촌에 불을 질러 그들을 쫓아내는 이들(‘유령과 공허’), 폭풍우 속에 갇힌 채 낯선 여자의 종아리를 더듬는 이방의 남자(‘살바도르’), 한때 교수 비슷한 신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을 굶주린 노숙인 처지로 내모는 가난(‘위와 아래’)은, 마르고 왜소한 갈매기를 부리로 쪼아 죽이는 동료 갈매기들(‘이포르’)처럼 잔혹한 자연 질서의 일부처럼 그려진다.
<플로리다>에 실린 열한 단편 가운데 남성 인물의 시점을 택한 작품은 ‘둥근 지구, 그 가상의 구석에서’ 한 편뿐이고, ‘사랑의 신을 위하여,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남녀 인물을 오가는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되며, 나머지 아홉 편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거느린 엄마가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데, 그 엄마들은 대체로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비관한다.
“2월의 어느 날, 나는 뼛속까지 슬픔을 느낀다. 한 남자가 환경을 관리하는 일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오로지 바퀴벌레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물려받을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뱀 이야기’)
“그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거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지만, 틀림없이 고통받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인류의 한밤이.”(‘이포르’) 소설집 속 몇몇 인물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여기 플로리다의 불모지”(‘미드나이트 존’)로부터 도망쳐 프랑스나 브라질 같은 이국으로 몸을 피하지만, 그곳들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어디에나 사막과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진 채, 죽음은 어디에나 있”(‘이포르’)기 때문이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은 플로리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조건인 것이다. ‘이포르’에서 기 드 모파상의 흔적을 조사하고자 두 아들을 데리고 노르망디의 해안 도시 이포르에 와 있는 여성 작가는 자주 “어머니인 그녀”로 지칭된다. 자신의 연구 주제인 모파상에 대한 환멸과 플로리다에 홀로 남겨 두고 온 남편을 향한 의구심, 숙소 관리인 남자의 불쾌한 관심 등이 그를 괴롭히지만 그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위와 행복이다. 소설집 전체를 관류하는 생태적 세계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모성과 통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며 그곳을 배경 삼은 단편집 <플로리다>를 낸 작가 로런 그로프. ⓒMegan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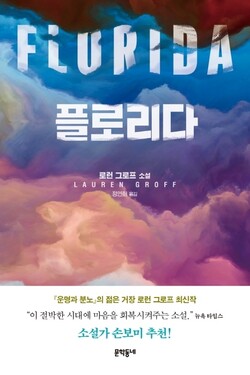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