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국 시집 <멀리서 오는 것들>
시인의 일이란. 자아에 몰두하지 않고 외부와 소통하기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낡음도 슬픔도 따뜻하게 껴안는 것음을…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낡음도 슬픔도 따뜻하게 껴안는 것음을…
어느덧 쉰 고개를 넘어선 시인 오정국(50·한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네 번째 시집 <멀리서 오는 것들>(세계사)을 묶어 냈다. 책이 나오기는 지난해 말이었는데, 연말 연초의 어수선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사이 한 해를 묵게 됐다.
시집에는 전체 제목 ‘멀리서 오는 것들’을 부제로 삼은 시가 네 편 들어 있다. 그 시들은 그야말로 멀리서 오는 신호에 반응하고 작용하는 주체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잡아낸다.
“그 어디서 누가/이토록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난데없이 내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올까 찔레꽃,/붉게 피는”(<몸살, 찔레꽃 붉게 피는 - 멀리서 오는 것들?1>)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 한 소절이 멀리 있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갸륵하고 거룩하다. 제가 부르는 노래인데 정작 그 원인이랄까 출처는 딴 데 있다니. 그러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는 ‘나’란 정작 무엇일까. 혹시 그 ‘누구’인가의 꼭두각시?
즉답 대신, 앞의 인용에 이어지는 이 시의 두 번째 연을 보자.
“해질녘이면/그 어딘가에서/또 다른 내가 저물고 있듯이”
‘또 다른 나’에 주목하자.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온전하고 자기충족적인 ‘나’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어딘가에 ‘또 다른 나’가 있다니. ‘나’는 최소한 그 ‘또 다른 나’와 만나서 합쳐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기보다는 ‘나의 불완전태’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정확할 터.
같은 시의 마지막 연은 첫째 연을 변주하되 개별 주체 ‘나’의 불완전성, 그리고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의 불가피성을 한층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옮아 간다.
“그 어디서 누가/이토록 간절하게 노래를 불러/난데없이 내 몸이 이런 몸살을 앓을까 찔레꽃,/붉게 피는” 내 노래는 곧 너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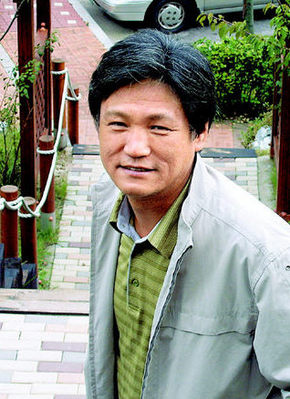 유심히 살펴 보면 첫째 연과 마지막 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바뀌어 있다. 첫째 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누구’였지만 정작 그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나’였던 데 비해 마지막 연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이가 아예 미지의 ‘누구’로 바뀌어 있고, ‘나’의 역할이란 그 노래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를 정말로 부르는 것이 ‘나’냐 ‘누구’냐 하는 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런 분별을 넘어서서 나와 남이 넘나들며 어우러지는 혼융의 경지를 구가하라는 것이 시인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곧 네가 부르는 노래이고, 네 노래는 곧 내 노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곧 남이요 남이 곧 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시인의 일이란 세상 만물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는 일과 같게 된다.
“저 빗소리를 다 받아 적고 나면, 이 몸 아프지 않을까요//아직도 짚어내지 못한/내 몸의 통점(痛點)들, 숨죽인 채/숨어 있는/시의 통점들//(…)//아 아 나는 저 소리를 받아 적는 붓이거나/장구이거나/징이거나”(<통점, 아직도 짚어내지 못한>)
시인의 본질이 다른 누군가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는 데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어 마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인 자신이 벌써 그러한 경지를 확보, 구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시인은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미안하게도 나는 바람의 책을 읽지 못했다(…)물의 책을 읽지 못했다(…)여태 흙의 책을 읽지 못했다”(<읽지 못한 책>)고. 남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고, 바람과 물과 흙의 책을 해독하는 경지란 시인이 도달하고 싶은 미답의 경지이지 이미 올라 서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다.
바람과 물과 흙의 책
그렇다 하더라도 시인의 시선과 촉수가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시가 태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 주체의 내부와 외부, 곧 안과 바깥 말이다. 물론 안과 밖은 말처럼 단순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강조점의 차이 정도로는 유효한 구분법이겠다. 새 시집의 머리말에서 오정국씨는 “내 등 뒤에도 아득한 통로가 있다는 생각”을 토로한다. 비슷한 생각을 담은 시도 있다.
“내 등 뒤에도 산 너머에도/인가가 있어/불빛 따스한 인가가 있어”(<내 몸을 어느 곳에>)
주체의 즉각적인 시선과 감각이 미치는 곳은 물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해도 그곳 역시 사람 사는 집이 있고 내가 통과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 만물이 인연과 관계로 얼크러진 인드라망을 이룬다는 통찰이다. 그러할 때 시를 쓰는 일이란 감응과 소통이라 바꿔 말할 수 있으리라. 인연과 관계, 감응과 소통이 왜 중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 낡음도 슬픔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쭈글쭈글한 빨래들, 볼품없는/빨래들, 물기 빠진 추억의 혓바닥 같은/것들, 낡고 바래고 구멍난 저것들이/이상하게도 사람의 몸에 붙으면/따뜻해지고 팽팽해지고 물컹해지기 때문이다”(<도둑일기>)
“울음과 울음이 뒤섞이는 것, 울음이/울음을 업어주고, 울음이/울음을 핥아주는 것”(<폭우>)
낡음과 울음은 비록 비루할망정 역시 몸과 숨을 지닌 것들의 노릇이라 하겠다. 시인이 생각하는 감응과 소통의 궁극은 이미 숨을 놓은 자들에게까지 가 닿는다. ‘멀리서 오는 것들’ 연작 네 번째 작품의 마지막 연이다.
“멀리서 와서 먼 곳으로 가는/홍제동 네거리, 문득 거기서/고개를 들면/멀리서 오는 별빛도 보인다/이미 죽은 것들의 상흔처럼 빛나는”(<흐르는 길목들 - 멀리서 오는 것들?4>)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오정국씨 제공
유심히 살펴 보면 첫째 연과 마지막 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바뀌어 있다. 첫째 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누구’였지만 정작 그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나’였던 데 비해 마지막 연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이가 아예 미지의 ‘누구’로 바뀌어 있고, ‘나’의 역할이란 그 노래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를 정말로 부르는 것이 ‘나’냐 ‘누구’냐 하는 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런 분별을 넘어서서 나와 남이 넘나들며 어우러지는 혼융의 경지를 구가하라는 것이 시인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곧 네가 부르는 노래이고, 네 노래는 곧 내 노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곧 남이요 남이 곧 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시인의 일이란 세상 만물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는 일과 같게 된다.
“저 빗소리를 다 받아 적고 나면, 이 몸 아프지 않을까요//아직도 짚어내지 못한/내 몸의 통점(痛點)들, 숨죽인 채/숨어 있는/시의 통점들//(…)//아 아 나는 저 소리를 받아 적는 붓이거나/장구이거나/징이거나”(<통점, 아직도 짚어내지 못한>)
시인의 본질이 다른 누군가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는 데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어 마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인 자신이 벌써 그러한 경지를 확보, 구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시인은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미안하게도 나는 바람의 책을 읽지 못했다(…)물의 책을 읽지 못했다(…)여태 흙의 책을 읽지 못했다”(<읽지 못한 책>)고. 남의 노래와 울음을 받아 적고, 바람과 물과 흙의 책을 해독하는 경지란 시인이 도달하고 싶은 미답의 경지이지 이미 올라 서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다.
바람과 물과 흙의 책
그렇다 하더라도 시인의 시선과 촉수가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시가 태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한다. 주체의 내부와 외부, 곧 안과 바깥 말이다. 물론 안과 밖은 말처럼 단순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강조점의 차이 정도로는 유효한 구분법이겠다. 새 시집의 머리말에서 오정국씨는 “내 등 뒤에도 아득한 통로가 있다는 생각”을 토로한다. 비슷한 생각을 담은 시도 있다.
“내 등 뒤에도 산 너머에도/인가가 있어/불빛 따스한 인가가 있어”(<내 몸을 어느 곳에>)
주체의 즉각적인 시선과 감각이 미치는 곳은 물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해도 그곳 역시 사람 사는 집이 있고 내가 통과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생각이다. 세상 만물이 인연과 관계로 얼크러진 인드라망을 이룬다는 통찰이다. 그러할 때 시를 쓰는 일이란 감응과 소통이라 바꿔 말할 수 있으리라. 인연과 관계, 감응과 소통이 왜 중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세계를 볼 때, 낡음도 슬픔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쭈글쭈글한 빨래들, 볼품없는/빨래들, 물기 빠진 추억의 혓바닥 같은/것들, 낡고 바래고 구멍난 저것들이/이상하게도 사람의 몸에 붙으면/따뜻해지고 팽팽해지고 물컹해지기 때문이다”(<도둑일기>)
“울음과 울음이 뒤섞이는 것, 울음이/울음을 업어주고, 울음이/울음을 핥아주는 것”(<폭우>)
낡음과 울음은 비록 비루할망정 역시 몸과 숨을 지닌 것들의 노릇이라 하겠다. 시인이 생각하는 감응과 소통의 궁극은 이미 숨을 놓은 자들에게까지 가 닿는다. ‘멀리서 오는 것들’ 연작 네 번째 작품의 마지막 연이다.
“멀리서 와서 먼 곳으로 가는/홍제동 네거리, 문득 거기서/고개를 들면/멀리서 오는 별빛도 보인다/이미 죽은 것들의 상흔처럼 빛나는”(<흐르는 길목들 - 멀리서 오는 것들?4>)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오정국씨 제공
“그 어디서 누가/이토록 간절하게 노래를 불러/난데없이 내 몸이 이런 몸살을 앓을까 찔레꽃,/붉게 피는” 내 노래는 곧 너의 노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