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을 키워드로 한 소설집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몬스터는 어떤 모습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아도 그렇다. “거울 속의 나”(이혁진), “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손원평), “사람을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최진영)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다시 묻게 된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걸까.”(윤이형)
낯설고 알 수 없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흔히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예전부터 그런 괴물들을 다룬 이야기는 많았다. 초자연적 변이체거나 외계의 생명체거나 아니면 폐가에 서식하는 귀신 같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피하거나 맞서 싸워야 할 사람 아닌 것들. 그 낯선 것들을 정의하면서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을 터인데. 스스로를 괴물이라 부르는 작가들은 대체 사람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시작은 평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워진 집안에서 근근이 살아오면서 피폐해진 삶을 벗어나고 싶었고,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이 자라 당당하고 해맑은 아내의 가족에 편입되고 싶었던 것이 잘못이냐고(이혁진, ‘달지도 쓰지도 않게’) 물을 것이다. 중매로 만난 남편과의 평온한 삶에 만족했지만, 그 평온함이 변질될 것이 두려워 여느 가족처럼 아이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손원평, ‘괴물들’) 그러나 좀처럼 남들 같은 가족에 편입될 수 없었고, 아이를 가진다고 평온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배신당하자 광기처럼 폭력이 솟아올랐고, 난임 끝에 낳은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물과도 같았다. 내가 낳은 괴물을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 평범하다.
불가능한 꿈이지만 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아이들은 자란다.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꿈에서 광기나 집착을 발견한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지속하는 얼굴들이 더 괴물처럼 섬뜩했다. 이 평온하고 무감각한 괴물의 얼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달갑지 않지만, 이렇게 무마되고 봉합되면서 영원할 수 없으리라는 불길함을 외면할 수는 없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불길함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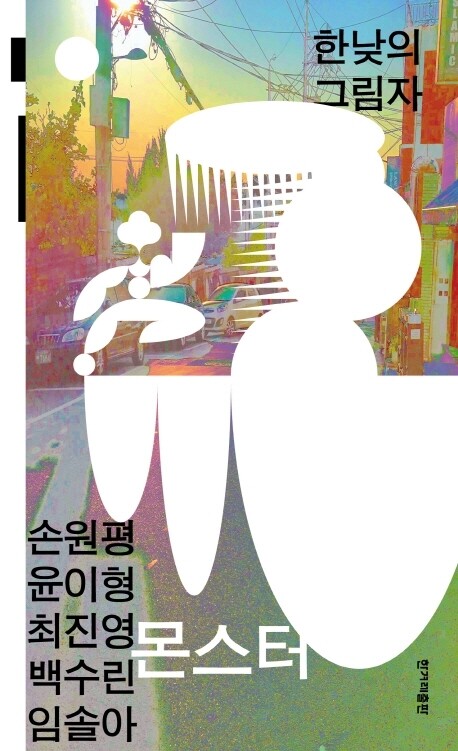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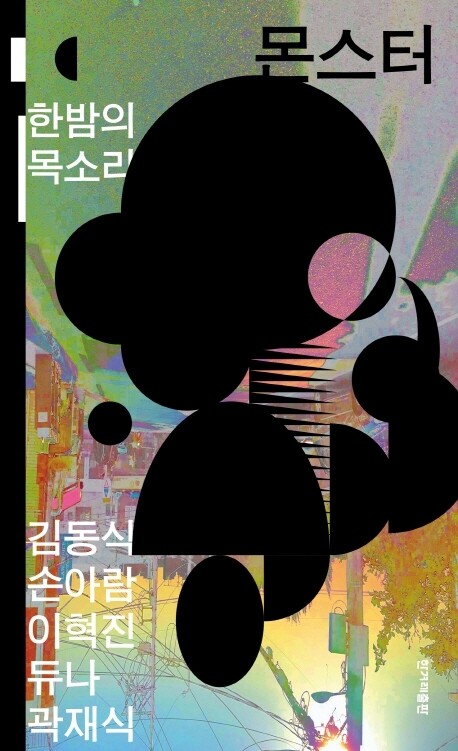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