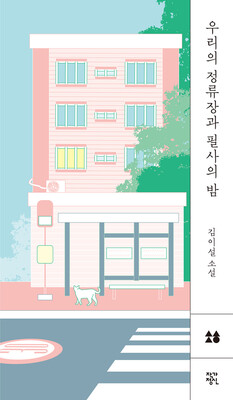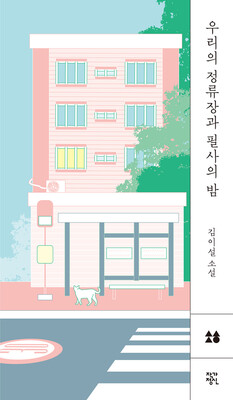[책&생각] 서영인의 책탐책틈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김이설 지음/작가정신(2020)
그런 사랑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고단한 귀갓길, 골목길 귀퉁이에 불을 밝힌 작은 서점 같은 사람, 보름에 한 번씩 만나 그저 곁에 누워 잠깐 단잠을 자는 것만으로 일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보고 지루하거나 외로우면 자신에게 오라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해 주는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따뜻한 위로이지만, 그건 그냥 힘든 날들을 버티기 위한 소망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에 비해 매일의 노동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당당한 실감이다. 여섯 살, 네 살 아이를 등원시키고 식구들의 먹을 것을 챙기고 집안을 건사하는 양육과 가사 노동의 면면은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친 기분이 들 정도로 고단하다. 가정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동생의 아이들을 돌보며, 갑자기 늘어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은 최초의 선의와 무관하게 ‘나’의 자존을 무너뜨린다. 별 볼일 없는 언니를 후원하고 응원했던 동생을 생각하며, 동생의 앞날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보람 없는 노동에 그 유대마저 흔들린다. 시를 쓰고 싶어 했던 ‘나’는 시를 쓰고 생각을 가다듬을 짧은 시간도 낼 수 없는 매일을 반복하며 지쳐 갔다.
보람 없는 노동의 나날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간의 상처를 보상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 가기보다 시를 쓰는 삶을 택했다. “서로의 체취로 속삭이던 노래와 지리멸렬한 계절에 속박되었던 오해와 피우지 못한 꽃과 기꺼운 약속과 작은 책상과 낡은 베갯잇과 차마 다하지 못한 희망과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 쓰기 위하여. ‘내’가 보람 없는 노동을 뛰어넘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보람 없이 지나간 날들에 담긴 진심과 노력과 좌절과 회한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존재감 없이 집과 일터를 오가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무기력했고, 우등생이었던 동생만을 챙기며 ‘나’에게 그악스러웠던 어머니는 야속했지만, 아이들을 떠맡기고 밖으로만 떠돌았던 동생에게는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연민과 책임감으로 내 자리를 지켰던 ‘나’를 ‘나’로 인정하기 위해 시가 필요했다. 여기가 아닌 저기를 꿈꾸는 ‘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저히 시를 쓸 수 없는 밤, 누군가의 시를 베끼는 필사(筆寫)의 밤이 고요하게 키워낸 꿈이다.
그러므로 시는 보람 없는 노동과 멀리 존재하는 사랑 사이에 있는 작은 구원이 된다. 까다롭고 고단하기는 하겠지만, 사랑보다 시가 더 현실적인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