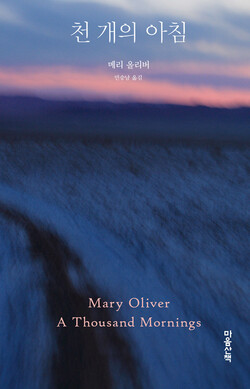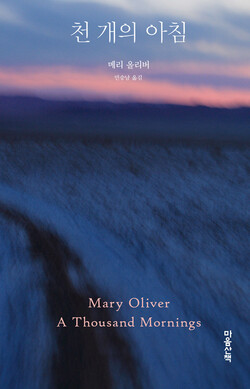천 개의 아침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마음산책∙1만3000원
“나는 눈 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고 그걸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미국 생태시인 메리 올리버(1935~2019)는 산문집 <휘파람 부는 사람>(2015)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가 담긴 시집 <천 개의 아침>이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나는 바닷가로 내려가’ ‘마침 거기 서 있다가’ ‘초록, 초록은 내 자매의 집’ 등 자연과 삶을 예찬하는 시 36편이 실렸다. 영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 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시집 제목은 올리버가 50여년 간 해변가 마을 프로빈스타운에서 살며 마주한 수많은 아침 풍경을 뜻한다. 날마다 뒷주머니에 작은 공책을 꽂고 숲과 바닷가를 거닐던 그는 “진주색 털옷 입은 흉내지빠귀”의 노래를, “시간에 따라 파도가 밀려들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모습을 시로 직조했다. 허리케인이 마을을 할퀴고 지나간 뒤에도 어김없이 “뭉툭한 가지들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탄생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시는 섬세한 언어로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한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고 연결돼 있으며, 생명은 태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순환한다는 의미를 일깨운다. “오늘 아침/ 아름다운 백로 한 마리/ 물 위를 떠가다가// 하늘로 날아갔지/ 우리 모두가 속한/ 하나의 세계//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른 모든 것들의 일부가 되는 곳”(‘하나의 세계에 대한 시’) 모든 것의 일부가 되는 순환의 세계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시인의 통찰이다.
올리버의 시에는 삶을 긍정하는 언어가 중심에 있다. 고통스럽고 우울한 날에도 기억해야 할 기쁨, 고마움, 행복, 사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모든 서늘한 날들에/ 우리 쾌활하게 살아가야지,”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쓰는 시’) “살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참으로 기뻐. 나는 삶의 끝에 가까워서/ 도,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그런 경이들을/ 잃은 후에도, 여기에서, 그것들을 위한/ 자세를 취할 거야.”(‘만약에 내가’)
시 ‘정원사’에서 생명을 돌보는 ‘나’는 스스로 묻고 또 묻는다. “나는 충분히 살았을까?/ 나는 충분히 사랑했을까?/ 올바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고심한 후에/ 결론에 이르렀을까?/ 나는 충분히 감사하며 행복을 누렸을까?/ 나는 우아하게 고독을 견뎠을까?” 세상 모든 ‘나’들이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시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