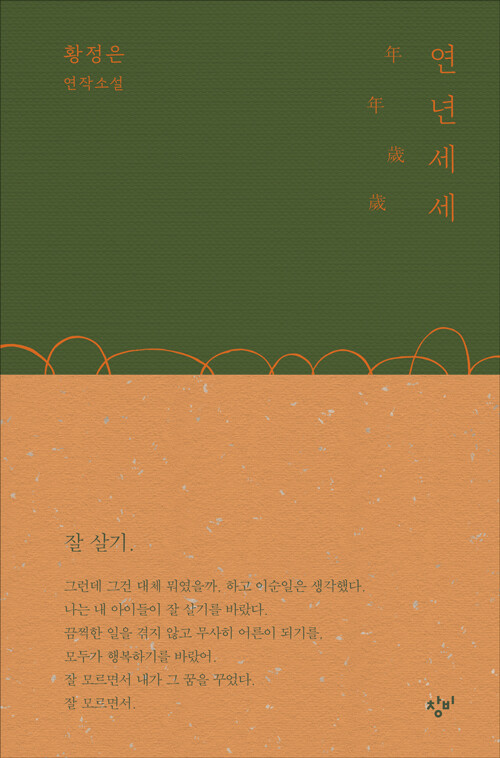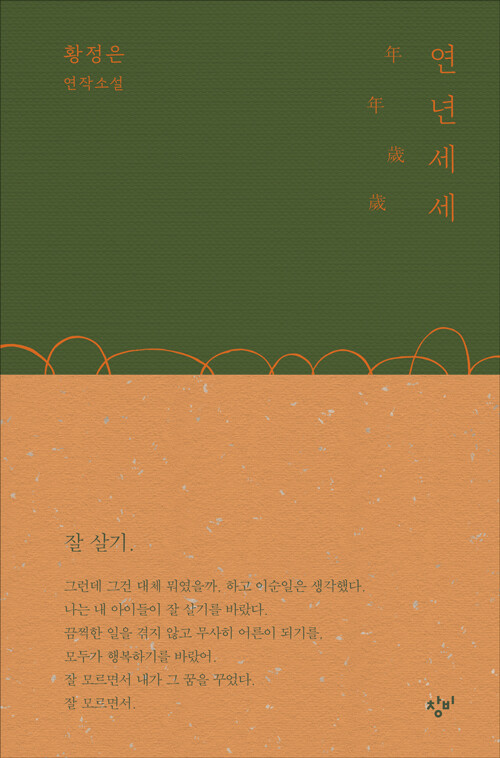연년세세
황정은 지음/창비(2020)
연말에 읽기에 <연년세세>만큼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관해 글을 쓰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 평범하고 담담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았다. 이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에서 오래 곰곰 생각하는 일, 연말에 하기 좋은 일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간사가 펼쳐진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전쟁 고아가 되었고, 가족 중 누군가는 월북을 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단하고 외롭게 살았다. 학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갔다. 고생 끝에 기반을 잡았으나 흔한 몰락을 겪었고, 말년에는 딸의 살림을 돌봐주며 여전히 하루하루 지쳐 죽을 만큼 피곤한 노동의 연속이다. 어디를 가든 꼭 있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에게 붙여진 이름 ‘순자’의 이야기이다.(‘무명’) 너무 흔한 이름이라 사실은 없는 것 같은 이름, 그래서 ‘무명(無名)’이다.
그러나 흔하고 뻔한 인생이 아니다. 전쟁이나 월북, 파독 광부나 간호사 같은 현대사의 클리셰를 배경으로 하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순자의 기억은 상투적이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 부모를 잃고 백부 집에 맡겨졌던 순자는 포탄을 피해 도망가던 어른들을 따라 배추밭을 기다가 혼자 살아남았다. 사실은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어린 동생을 업고 있었고, 그 동생은 몇 년을 더 살다가 화상(火傷)으로 고통 속에서 죽었다. 외조부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다 죽고 저거 하나 남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동생도 남았으니 둘이 남은 것이었고, 동생은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동생의 죽음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동생의 존재를 상투적 불행으로 떠밀어 버리는 것이다. 살아 있던 동생을 기억하게 하는 전쟁은, 존재조차 몰랐던 이모를 만났던 1987년의 광장은,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순자만이 간직한 그녀의 생애이다. 어떤 죽음도 만남도 다른 사건 속에 휘말려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절대로 흔해 빠진 순자가 아니다.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실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외조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있다.” 수치와 분노를 용서와 바꾸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뾰족하고 선연하다. 삶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쉽게 화해하지 않는다. “울고 실망하고 환멸하고 분노”하는 일이, “다시 말해 사랑”(‘다가오는 것들’)이 되려면, 그 실망과 환멸과 분노를 다른 것과 바꾸거나 무마하지 않아야 한다. 한 해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까. 그래야 비로소 내가 흔해 빠진 내가 아니게 될 터인데.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