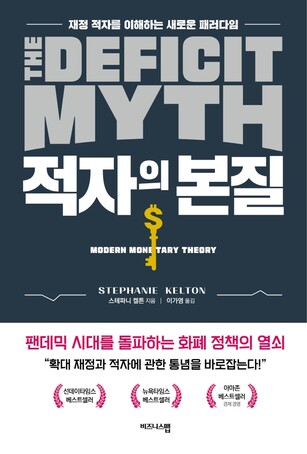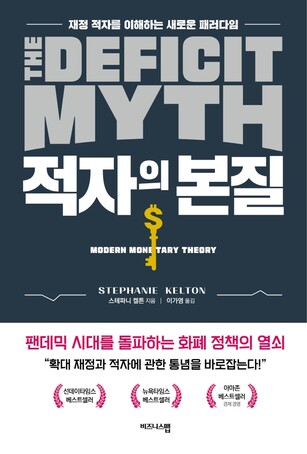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적자의 본질: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기영 옮김/비지니스맵·1만7800원
새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은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계획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중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금으로는 250억달러가 배정됐다. 세입자 퇴거 중단조처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됐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발표한 경기부양안에는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가 들어간다. 한국의 올해 총예산 558조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인 재정적자의 규모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현대통화이론(MMT)’이 꼽힌다. MMT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재정적자를 위험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적자는 민간 부분의 흑자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적자를 내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한다면 부와 소득은 보다 균형 있게 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MT 전문가로 손꼽히는 스테파니 켈튼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경제 및 공공정책 교수는 “정부는 재정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건 경제”라며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적절히 유지하고 가난을 줄이고 소득과 부를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가? 그렇다면 매년 예산보다 정확히 얼마나 더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재정적자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자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다.
시중에 풀린 돈이 잘 쓰인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만일 정부가 재정적자를 남발하다가 부도를 맞는 건 아닐까. 지은이는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미 연방정부는 ‘통화 사용자’가 아닌 ‘통화 발행자’로 필요한 만큼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주권을 지닌 국가는 자신이 발행한 통화를 금과 같은 다른 자산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때,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돈을 빌려서 돈을 마련하지 않는다. 정부지출로 화폐를 창출한다. MMT에서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일은 재정적자가 아니라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생겨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지은이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강한 화폐주권을 지닌 나라도 MMT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태환화폐를 쓰고 원화로 표시된 부채가 98%가 넘는 한국 역시 화폐 주권이 약하지 않다.
지은이가 바로잡는 적자의 편견은 모두 여섯 가지다. 하나, 정부는 일반가정과 달리 자신이 쓰는 돈을 직접 발행하고 있다. 둘, 재정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그 증거다. 셋, 국가 부채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넷, 정부 적자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부와 총저축을 늘린다. 다섯, 무역적자는 상품의 흑자다. 여섯,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은 부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 모든 편견을 깨고 나면 △좋은 일자리 적자 △의료 적자 △교육 적자 △민주주의 적자를 상상하게 된다. MMT를 뒷받치는 증거는 역사다.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일 때마다 불황에 빠졌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행한 미국은 경제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미국의 실험을 지켜보며 재정적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