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한국 고기구이의 문화사
이규진·조미숙 지음/따비·1만8000원
1991년 3월 국공립공원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가 전면금지 되기 전 서울 근교의 산골짜기에서는 냄새가 났다. 특히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이 심했다. 구기동, 정릉, 우이동, 북한산성 등 주요 계곡은 냄새가 먼저 그 위치를 알렸다. 불고기 냄새다.
등산을 가면 으레 고기를 구웠다. 산 오르기보다 먹고 마시는 데 무게를 두는 ‘중턱산악회’가 특히 그랬다. 대개 돼지 삼겹살이요, 부티 나는 축은 양념불고기다. 전날 밤 재워 냉동실에 두었다가 상추와 함께 싸오는 것은 막내 몫이었다. 손잡이 달린 코펠 뚜껑에 굽기 마련인데, 이때 반들반들한 돌구이판을 배낭에서 쓱 꺼내는 특이한 이도 있었다.
1930년대 대동강은 더 심했던 모양이다.
“대동강 변 40리 긴 숲의 풀빛을 뿌리까지 짓밟은 청일, 러일 두 싸움 통에 총상을 입은 채 서 있는 기림의 늙은 소나무 밑에는 ‘봄놀이’도 한창이다. 소고기를 굽는 것이다. 야유회의 맑은 운치도 있음직하거니와, 모진 뿌리가 죽지 않아 살아남은 노송들이 그 진저리나는 고기 굽는 냄새에 푸른빛조차 잃은 것 같다.”(오기영 ‘팔로춘색: 옛 생각은 잊어야 할까’, 1935년 5월1일 동아일보)
<불고기, 한국 고기구이의 문화사>는 불고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육류구이 문화 변천사인데, 우리가 왜 그토록 고기에 집착하는지를 넌지시 알려준다.
지은이는 불고기의 원조로 맥적, 설야멱, 너비아니를 꼽는다. 맥적은 삼국시대 제사 또는 잔치 때 먹었던 양념 통돼지구이로 추정한다. 설야멱은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 먹은 양념 꼬치구이, 너비아니는 조선시대 궁중요리로 넓적하게 저며 구운 쇠고기를 가리킨다.
너비아니를 비롯한 궁중요리는 1904년에 생긴 요릿집 명월관을 통해 저자로 유출됐다. 창업주 안순환은 한말 궁내부 주임관 및 전선사장 출신으로 임금님 수라와 궁중잔치 음식에 정통했다. 명월관을 본떠 식도원, 국일관, 고려관, 천향원, 춘경원, 장춘원, 창서원, 태서관 등 요릿집이 생겨났다.
‘불고기’라는 말이 조리서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50년 황혜성의 <조선요리대략>에서다. 너비아니의 속칭으로서다. 신문과 잡지에는 1930년대에 이미 널리 쓰였다. 1938년 박향림이 부른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 가사에도 나온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거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그러니까 불고기는 임금님이나 고관대작이 먹던, 보통사람에겐 꿈의 요리였다. 노랫말 속 오빠는 여동생 눈에 임금님처럼 보였을 테다.
불고기 전문점의 등장은 1946년 신문광고에서 확인된다. ‘한일백화점식당’과 ‘남산’에서 순평양식 불고기를 팔았다. 평양식은 자세한 레시피는 없고 석쇠에 구워서 연기가 난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한일관, 우래옥, 옥돌집도 이 무렵 창업했다. 종로 한일관은 1957년 불고기를 주 메뉴로 팔기 시작해 10년 만에 명동에다 5층짜리 사옥을 지어 자리를 옮겼다. 돈을 긁어들였다는 얘기다. 1969년 한식분야 고액납세 ‘빅3’ 중 한 곳이었다. 우래옥은 창업주 장원일이 평양에서 명월관을 경영하다 월남해 세웠다. 고기에다 마늘, 설탕, 참기름, 간장을 조미해 굽는 평양식이었다. 반면 옥돌집은 주물주물 양념한 고기를 자작한 국물과 함께 상에 올렸다고 한다. 석쇠 불고기와 육수 불고기가 공존했다는 얘기다.
요즘 불고기라 함은 파, 버섯 등 채소와 함께 황동 불고기판에 자작한 육수와 함께 끓여내는 쇠고기 요리를 이른다. 불판에 굽기와 전골로 끓이기가 결합된 형태다. 전문점에서 쓰는 원형 불고기판을 보면 가운데가 돔처럼 봉긋하게 솟아 구멍이 하나 또는 여럿 뚫리고, 주변은 둥글게 패여 국물이 고이게 돼 있다. 1962년에 처음 특허가 난 이래 수차례 변화를 거쳐 오늘날 형태에 이르렀다. 1963년에 개업한 진고개의 주물 불고기판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육수를 떠먹기 편하도록 돔 가장자리 두 군데를 오목하게 만들었다.
육수 불고기로 대세가 기운 때는 한국전쟁 이후로 본다. 석쇠 불고기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 등심, 안심 등 육질이 좋은 고기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쟁 통에 식자재가 달리자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이용해도 무리가 없고, 각종 채소를 곁들여 양을 늘리기에도 적합한 조리법을 고안하게 된 것이다.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불고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전성기를 맞는다. 1960년 1인 육류소비량이 3.5㎏이던 것이 1975년 6.4㎏, 1980년 11㎏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양을 감당하기 어려워 1976년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694톤으로 시작해 1977년 6323톤, 1978년 4만4435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수입을 포함해 소고기 소비량은 1970년대 10만톤을 돌파해 1995년 30만1200톤에 이른다. 1990년대 초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가 꺾인다.
불고기는 이렇게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것이 널리 국민요리가 됐고 어느덧 ‘bulgogi’란 이름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불고기 맛을 안단다.
불고기를 주제로 과연 책 한 권이 제대로 될까? 책을 접하며 든 의구심은 차례에서 사라진다. 읽어들수록 찾아낸 자료, 인물 인터뷰 그리고 이를 교직한 용의주도함에 반하게 된다. 들인 공이 역력하다.
그나저나 지리산 세석산장에서 남이 져 올려 구운 불고기를 옆 테이블 처자들한테 선심 쓴 그놈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임종업 <토마토뉴스> 편집위원
1961년 영화 <삼등과장>에 나온 육수 불고기 불판.
1982년 4월17일치 <동아일보>에 실린 이 사진에는 ‘꽃바람 속 군침 도는 불고기 냄새’라는 설명이 달렸다. 따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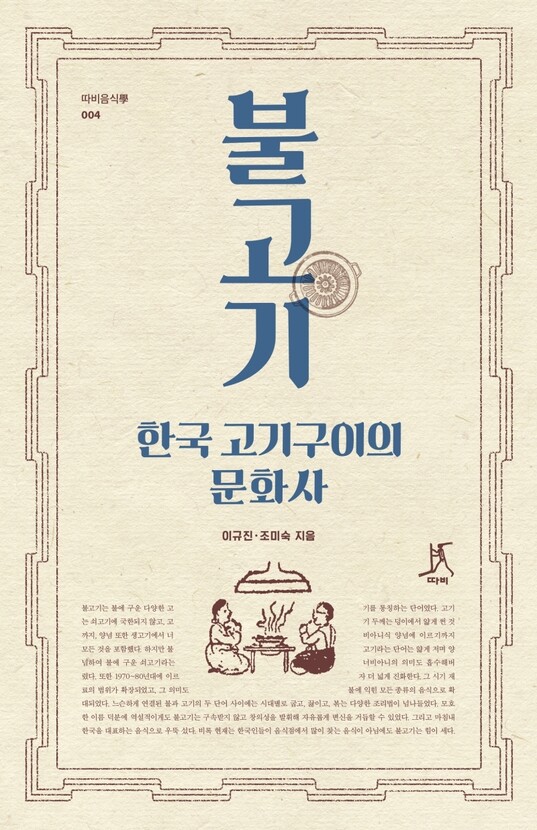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