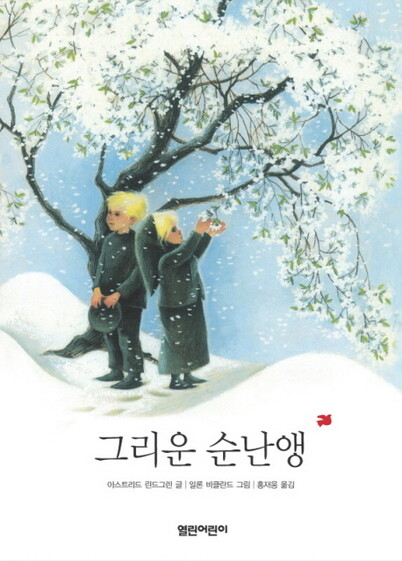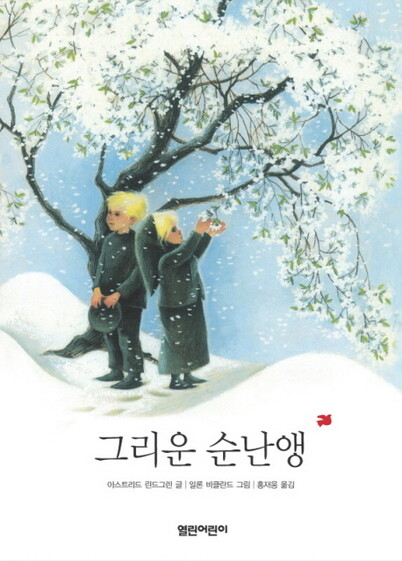그리운 순난앵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일론 비클란드 그림, 홍재웅 옮김/열린어린이(201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전기 영화인 <비커밍 아스트리드>가 개봉했지만 예상대로 금방 막을 내렸다. 세계적인 동화작가가 아니라 십대 후반 미혼모가 된 사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열여덟 아스트리드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다 편집장인 기혼남과 사랑에 빠져 덜컥 임신을 한다. 1920년대 스웨덴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덴마크에서 출산하고 위탁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주말에 아들 라세를 보러 스웨덴에서 덴마크까지 국경을 넘는 먼 길을 가야 했고 돈이 없어 갈 수 없는 날도 많았다. 가족과 헤어져 버려진 듯한 느낌, 아들을 먼 곳에 두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이 시기는 그에게 평생 영향을 미쳤다. 훗날 아동 폭력에 반대하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 애쓴 것도 이 시절이 거름이 되었을 테다.
또한 아스트리드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삐삐 롱스타킹이나 말썽꾸러기 에밀 같은 명랑한 캐릭터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덕꾸러기 고아 소년 미오나 종일 부모를 기다리는 베르틸처럼 외로운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도 여럿 있다. 어린 시절이 행복으로 가득 찬 낙원이지만 동시에 사랑이 없다면 더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인생이 즐거운 삐삐 롱스타킹의 엄마이자 딱한 고아 소년 미오의 엄마일 수 있었다.
린드그렌의 동화 중 가장 슬픈 작품을 고르라면 단연 <그리운 순난앵>이다. 작고 무력한 어린이의 마지막 안간힘이 담긴 작품들이 실려 있다. 모든 어린이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언제든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찾는다. <그리운 순난앵>의 아이들도 판타지를 만들고 잠시 위안을 찾지만 이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상에서 깨어난 후 더 고달픈 현실이 기다린다는 걸 알아차린다.
표제작인 ‘그리운 순난앵’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농부의 집에서 종일 허드렛일을 하는 남매가 나온다. 남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배고픔과 노동만이 아니다. 고향 순난앵에 있을 때처럼 재미난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현실이었다. 겨울 동안 잠시 학교에 다니게 되자 남매는 고향 순난앵을 닮은 상상의 마을을 만들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하지만 겨울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그날 남매는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순난앵 마을의 문을 조용히 닫는다. 이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 폭력과 학대가 없다 해도 어린이의 자리는 언제나 제일 낮고 그래서 “어린이가 겪는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 린드그렌은 어린이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을 어루만졌던 작가다. 그 기원을 담은 영화가 <비커밍 아스트리드>다. 초등 4학년 이상.
출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