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 위 댄스>의 한 장면.
[토요판] 김성윤의 덕후감
영화를 보다 보면 혼자만의 경험이 삐죽삐죽 오버랩 돼 본의 아니게 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다. 만든 사람이 울리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영화의 스토리라인에 핵심적인 장면이 아닌데도 말이다. 얼마 전 케이블 채널로 <쉘 위 댄스>(1996)를 보았다. 이 영화, 서너 번째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예전엔 몰랐던 기억과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바람에 기어이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날 겪은 감정이입은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부인으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었다. 남편의 춤바람에 사설탐정을 고용하면서까지 뒷조사를 했던 그녀. 결국 남편도 부인이 자신의 춤바람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안해한다. 그런데 이 부인, 춤바람이든 그냥 바람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웃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분해”라는 말 한마디를 툭 내뱉는다. 함께 웃지 않아서, 즉 시간을 함께 견딘 게 아니라는 원망이다. 이 순간부터 이입이 시작돼버렸다. 감정이 요동치는 와중에 몇몇 중요한 장면이 지나간다. 그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지라 영화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분하다….
아마도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다. 왜 자신으로 인해 기쁠 순 없는지에 대한 책망 말이다. 얄팍한 사람이라면 단지 질투심의 발로라고 폄훼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그 사람도 나를 책망했으나 난 줄곧 무지했으니까.
철이란, 깨달음이란 왜 이리 늦게야 찾아오는 걸까. 어쩌면 그건 나에 대한 강한 동일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나 역시 자신에게 동일시되길 바랐던 게 아니었을까. 나는 그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 사람은 자신과 내가 서로 교통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와 공유하고자 했지만, 난 그걸 소유욕이라 했다. 나와 함께이기를 바랐지만, 난 그걸 집착이라 했다. 한마디로 나는 어리석었던 것이다.
이윽고 남자 주인공은 댄스학원에 나가기를 포기한다. 켕기는 게 없진 않았던 거겠지. 그러나 그러면서 주인공은 다시금 일상의 무기력에 노출된다. 부인은 외려 힘을 잃은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견디다 못해 결국 남편에게 다시금 사교댄스를 권하기에 이른다. 차라리 웃으며 생기 넘치는 모습이 맘에 편하다면서. 분하다더니, 그러면서도 춤을 추라니. 하긴 애초에 춤이 문제는 아니었던 거다.
남편은 망설인다. 그러자 보다 못한 딸이 부모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둘이 함께 춤출 것을 강권한다. 두 사람은 부끄러운 듯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그런데 부인의 스텝이 처음 추는 것치고는 어딘지 익숙하다. 남편 몰래 혼자 책을 보면서 이미 스텝을 연습해봤기 때문이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함께이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더 가슴이 아리다. ‘슬로 슬로 퀵퀵’ 몇번을 밟더니, 남편은 나직이라도 속삭일 수밖에 없다.
“외롭게 해서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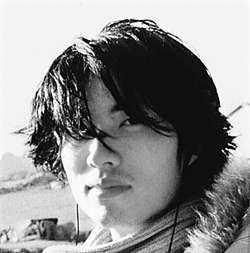 비로소 교통이 이뤄지자 부인은 지긋한 울음을 게워낸다. 나도 따라 울었다. 부러웠다. 주인공은 의연히 함께하지 않는가. 나는 왜 마다했던 것일까. 그 사람과 나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를 요청했을 때, 진즉 짐작이라도 했어야 했다. 어리석은 나는 감조차 잡지 못했다. 차라리 내게 ‘분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면….
나는 각자의 공간이 나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 믿었다. 난 그 자유를 택했고, 영원한 속박에 빠지고 말았다. 한낱 담배 한모금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 한낱 지적 부끄러움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한낱 이 영혼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가두려고 했던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비로소 교통이 이뤄지자 부인은 지긋한 울음을 게워낸다. 나도 따라 울었다. 부러웠다. 주인공은 의연히 함께하지 않는가. 나는 왜 마다했던 것일까. 그 사람과 나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를 요청했을 때, 진즉 짐작이라도 했어야 했다. 어리석은 나는 감조차 잡지 못했다. 차라리 내게 ‘분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면….
나는 각자의 공간이 나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 믿었다. 난 그 자유를 택했고, 영원한 속박에 빠지고 말았다. 한낱 담배 한모금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 한낱 지적 부끄러움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한낱 이 영혼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이라고 그걸 가두려고 했던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