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줄곧 ‘음식’만 취재해 온 이호준 작가는 “어머니가 식당을 하신 적도 있어 원래 음식 만드는 분들을 존경한다”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절대 음식에 까다로운 편이 아니고 미식가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문화'랑'] 나도 문화인
(26) 만화 스토리 작가 이호준씨
(26) 만화 스토리 작가 이호준씨
만화 <식객>은 역대 한국 만화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다. 2002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9년 동안 일간지에 연재되면서 ‘어머니와 쌀’을 시작으로 ‘밀면’까지 모두 135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의 음식을 소개했다. 만화 단행본은 2003년 9월 발행돼 27권까지 이어지며 모두 300만부 넘게 팔렸다. 영화로도 성공했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가히 ‘국민 만화’라 불릴 만하다.
사람들은 <식객>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만화가 허영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허씨가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까지 스토리 작가 이호준(42)씨가 늘 함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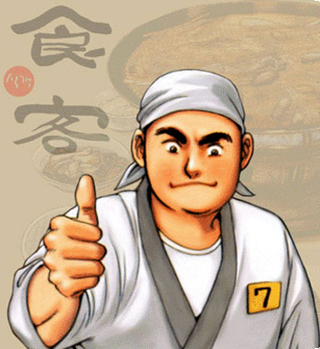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죠. 아, 아직까지 만화 스토리 작가가 ‘직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이호준씨는 ‘글쟁이 이호준’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다.
허영만 작가와 15년 넘게 협업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죠. 아, 아직까지 만화 스토리 작가가 ‘직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이호준씨는 ‘글쟁이 이호준’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다.
허영만 작가와 15년 넘게 협업
‘식객’ 기획한 뒤 현장 동행
“도축장과 흑산도 취재
힘들었던 만큼 기억에 남아” 자료 조사에서 콘티까지
할일 많지만 아직 입지 좁아
모바일로 무대 옮겨 새 도전 만화는 만화가 혼자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 두 직종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때 일부 만화가들이 스토리 작가 수십명을 거느리고 공장에서 만화를 ‘찍어내듯’ 그리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서서히 이 직종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화가의 그늘 아래 가려진 그림자 직종을 벗어나진 못한 형편이다. 다른 만화 스토리 작가와 이호준 작가의 다른 점은 그가 ‘취재 전문가’형 작가라는 점이다. 그는 만화에 들어갈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을 취재하고, 현장의 분위기와 특징을 잡아내고, 이를 만화로 그릴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또 하나 그가 독특한 점은 허영만 만화가와 15년 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다. <식객> 이외에도 칭기즈칸 이야기를 다룬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2010~2012), 일본의 맛과 멋을 다룬 <맛있게 잘 쉬었습니다>(2011)를 함께 집필했다. 이 작가는 허씨를 “인생의 또다른 아버지이자 스승”이라고 말한다. 그 만남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1학번으로 졸업과 동시에 외환위기를 맞은 ‘불운한 세대’였던 이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김치’를 소재로 글을 쓰겠다는 기획서를 만들었다. 허영만, 이현세 만화를 베고 잘 만큼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한 그는 자신의 기획을 현실화할 매체는 만화뿐이라 생각해 기획서를 들고 무작정 여기저기 기웃댔다. 그러다 한 만화 출판사 사장에게 허영만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허영만 화백이 <타짜>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때였다. “제 기획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허 선생님이 ‘김치 말고 음식 전반으로 확대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조건도 있었다. 적어도 1년은 함께 취재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꼬박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기초 취재’를 했다. 말은 기초 취재지만 전라도 1주일, 경상도 1주일 식으로 돌아다니며 지역 토박이를 만나 밥 먹고 술 먹는 게 전부였단다. “지금까지도 감사한 게 그때 허 선생님이 일종의 취재비를 1년 동안 꼬박꼬박 주셨어요. 하는 일도 없었는데. 하하하.” 그렇게 1년이 지나 연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취재와 집필이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만화에 대한 편견이 심해 초반에는 취재가 쉽지 않았다. “음식이나 먹고 그냥 가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일쑤였다고 한다. 가장 힘들었던 취재로 그는 ‘소고기 전쟁’(12~16화)과 ‘홍어를 찾아서’(42화)를 꼽았다. “대통령이 와도 공개 안 한다는 곳이 도축장이에요. 몰래 사진을 찍다 발각되면 도축장 전체 작업이 중지될 정도죠. 얼음 세례는 기본에, 칼 들고 쫓아내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애걸복걸하기를 수십번. 겨우 섭외를 해 10일 동안 도축장에 살다시피 했다. 홍어 취재 때는 외부 사람을 홍어잡이배에 태워주지 않는 관행이 문제였다. “무작정 전남 흑산도에 갔는데, 모든 홍어잡이배에서 취재를 거절당했어요. 결국 홍어잡이배를 탈 수 있다는 소문만 듣고 홍도 2구역으로 가기 위해 해 질 녘에 허 선생님과 함께 산을 하나 넘었어요. 밤이 이슥해 도착했더니 선주가 우리를 유령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하하하. 그 ‘무모함’에 감동했다며 배를 태워줬어요.” 이제는 허영만 만화가와 실과 바늘 같은 관계가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함께 취재 시작한 지 1년 넘게 선생님은 제게 존댓말을 했어요. 그러다 1년 반쯤 됐을 때 ‘호준아, 밥 먹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하하.” 스토리 작가의 일은 끝이 없다. 자료 조사를 하고, 취재하고, 사진 찍고, 스토리 쓰고, 때론 스토리 보드(콘티)까지 만드는 등 만화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만화가 못잖은 구실을 하지만 여전히 스토리 작가들이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다. 그런 현실은 여전히 그에게 아쉬운 부분이다. “아직도 ‘허영만 따라다니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비서 역할 하는 줄 아나 봐요. 하하하.” 요즘은 동료 만화가들과 함께 스토리 작가들의 영역을 시스템화하는 문제를 고민중이다. 웹툰이 국민적인 인기를 끌면서 만화 스토리 작가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다. 올봄부터 스마트폰용 모바일 만화로 무대를 옮긴 <식객 2> 역시 새로운 도전이다. 책과 웹이 아닌 모바일이란 새로운 만화 플랫폼을 개척하고, 만화를 유료로 소비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그에게 앞으로의 구상을 물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꼭 함께할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첫번째는 허영만, 두번째는 음식, 세번째는 만화예요. 그 세 가지가 제 인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식객>
‘식객’ 기획한 뒤 현장 동행
“도축장과 흑산도 취재
힘들었던 만큼 기억에 남아” 자료 조사에서 콘티까지
할일 많지만 아직 입지 좁아
모바일로 무대 옮겨 새 도전 만화는 만화가 혼자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 두 직종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때 일부 만화가들이 스토리 작가 수십명을 거느리고 공장에서 만화를 ‘찍어내듯’ 그리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서서히 이 직종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화가의 그늘 아래 가려진 그림자 직종을 벗어나진 못한 형편이다. 다른 만화 스토리 작가와 이호준 작가의 다른 점은 그가 ‘취재 전문가’형 작가라는 점이다. 그는 만화에 들어갈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을 취재하고, 현장의 분위기와 특징을 잡아내고, 이를 만화로 그릴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또 하나 그가 독특한 점은 허영만 만화가와 15년 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다. <식객> 이외에도 칭기즈칸 이야기를 다룬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2010~2012), 일본의 맛과 멋을 다룬 <맛있게 잘 쉬었습니다>(2011)를 함께 집필했다. 이 작가는 허씨를 “인생의 또다른 아버지이자 스승”이라고 말한다. 그 만남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1학번으로 졸업과 동시에 외환위기를 맞은 ‘불운한 세대’였던 이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김치’를 소재로 글을 쓰겠다는 기획서를 만들었다. 허영만, 이현세 만화를 베고 잘 만큼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한 그는 자신의 기획을 현실화할 매체는 만화뿐이라 생각해 기획서를 들고 무작정 여기저기 기웃댔다. 그러다 한 만화 출판사 사장에게 허영만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허영만 화백이 <타짜>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때였다. “제 기획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허 선생님이 ‘김치 말고 음식 전반으로 확대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조건도 있었다. 적어도 1년은 함께 취재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꼬박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기초 취재’를 했다. 말은 기초 취재지만 전라도 1주일, 경상도 1주일 식으로 돌아다니며 지역 토박이를 만나 밥 먹고 술 먹는 게 전부였단다. “지금까지도 감사한 게 그때 허 선생님이 일종의 취재비를 1년 동안 꼬박꼬박 주셨어요. 하는 일도 없었는데. 하하하.” 그렇게 1년이 지나 연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취재와 집필이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만화에 대한 편견이 심해 초반에는 취재가 쉽지 않았다. “음식이나 먹고 그냥 가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일쑤였다고 한다. 가장 힘들었던 취재로 그는 ‘소고기 전쟁’(12~16화)과 ‘홍어를 찾아서’(42화)를 꼽았다. “대통령이 와도 공개 안 한다는 곳이 도축장이에요. 몰래 사진을 찍다 발각되면 도축장 전체 작업이 중지될 정도죠. 얼음 세례는 기본에, 칼 들고 쫓아내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애걸복걸하기를 수십번. 겨우 섭외를 해 10일 동안 도축장에 살다시피 했다. 홍어 취재 때는 외부 사람을 홍어잡이배에 태워주지 않는 관행이 문제였다. “무작정 전남 흑산도에 갔는데, 모든 홍어잡이배에서 취재를 거절당했어요. 결국 홍어잡이배를 탈 수 있다는 소문만 듣고 홍도 2구역으로 가기 위해 해 질 녘에 허 선생님과 함께 산을 하나 넘었어요. 밤이 이슥해 도착했더니 선주가 우리를 유령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하하하. 그 ‘무모함’에 감동했다며 배를 태워줬어요.” 이제는 허영만 만화가와 실과 바늘 같은 관계가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함께 취재 시작한 지 1년 넘게 선생님은 제게 존댓말을 했어요. 그러다 1년 반쯤 됐을 때 ‘호준아, 밥 먹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하하.” 스토리 작가의 일은 끝이 없다. 자료 조사를 하고, 취재하고, 사진 찍고, 스토리 쓰고, 때론 스토리 보드(콘티)까지 만드는 등 만화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만화가 못잖은 구실을 하지만 여전히 스토리 작가들이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다. 그런 현실은 여전히 그에게 아쉬운 부분이다. “아직도 ‘허영만 따라다니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비서 역할 하는 줄 아나 봐요. 하하하.” 요즘은 동료 만화가들과 함께 스토리 작가들의 영역을 시스템화하는 문제를 고민중이다. 웹툰이 국민적인 인기를 끌면서 만화 스토리 작가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다. 올봄부터 스마트폰용 모바일 만화로 무대를 옮긴 <식객 2> 역시 새로운 도전이다. 책과 웹이 아닌 모바일이란 새로운 만화 플랫폼을 개척하고, 만화를 유료로 소비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그에게 앞으로의 구상을 물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꼭 함께할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첫번째는 허영만, 두번째는 음식, 세번째는 만화예요. 그 세 가지가 제 인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