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비자금에 연루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도둑’
지방 대안공간 ‘반디’ 폐관
‘김진숙 프로젝트’로 자존심
국립현대미술관 ‘내부도둑’
지방 대안공간 ‘반디’ 폐관
‘김진숙 프로젝트’로 자존심
미술계 20인이 뽑은 최대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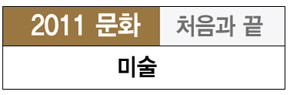 2011년 한국 미술판은 연초부터 흉흉했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미술품 비자금 조성 의혹이 파문을 빚었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술품 도난, 신정아 자서전 파문,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사퇴 등이 이어졌다. 반면, 작품시장 침체 속에서도 이우환, 이용백, 양혜규, 김세현씨 등 몇몇 작가들은 주목할 만한 해외 전시로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렸다. 국내 주요 미술관·화랑·대안공간 큐레이터와 평론가 등 20명에게 물어 올해 미술판 흐름을 몇 가지 짚어봤다. 눈길을 끈 건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 구린내 나는 ‘명작 스캔들’? 2008년 삼성가 비자금 사건의 주역이었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올 상반기 미술품 비자금 비리에 연루되면서 다시 입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씨를 비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0월 1심에서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미술시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면서 더욱 얼어붙었다. 응답자들도 “한국 미술시장이 검은돈의 복마전임을 드러낸 사례”(강재현, 김준기)로서 올해 미술판 최대 스캔들로 꼽았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이 자신을 통해 구매한 거장 빌럼 더 코닝 등의 작품 값 50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1월 취하하기도 했다.
2011년 한국 미술판은 연초부터 흉흉했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미술품 비자금 조성 의혹이 파문을 빚었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술품 도난, 신정아 자서전 파문,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사퇴 등이 이어졌다. 반면, 작품시장 침체 속에서도 이우환, 이용백, 양혜규, 김세현씨 등 몇몇 작가들은 주목할 만한 해외 전시로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렸다. 국내 주요 미술관·화랑·대안공간 큐레이터와 평론가 등 20명에게 물어 올해 미술판 흐름을 몇 가지 짚어봤다. 눈길을 끈 건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 구린내 나는 ‘명작 스캔들’? 2008년 삼성가 비자금 사건의 주역이었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올 상반기 미술품 비자금 비리에 연루되면서 다시 입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씨를 비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0월 1심에서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미술시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면서 더욱 얼어붙었다. 응답자들도 “한국 미술시장이 검은돈의 복마전임을 드러낸 사례”(강재현, 김준기)로서 올해 미술판 최대 스캔들로 꼽았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이 자신을 통해 구매한 거장 빌럼 더 코닝 등의 작품 값 50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1월 취하하기도 했다.
 ■ 바람 잘 날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지난 6월 서울 소격동 옛 국군기무사 터에서 숙원이던 서울관(2013년 개관 예정) 기공식을 열었지만,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배순훈 관장이 임기를 넉달 남겨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 사령탑 없이 새해를 맞게 됐다. 대기업 회장과 장관 등을 지낸 그가 사퇴한 것은 국정감사 당시 서울관 명칭으로 ‘UUL(울) 국립서울미술관’을 채택한 경위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날선 추궁을 받았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질타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일로 자존심이 상한 데서 비롯했으리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앞서 미술관은 올 1월 유종하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십여년 전 수리·보관을 편법으로 맡긴 19세기 서양화를 전직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소장품인 주경의 스케치 그림을 분실하는 등 미술품 관리에도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 지역 대안공간의 안타까운 폐관 지난 10월 대표적인 지역 미술공간이던 부산의 ‘대안공간 반디’가 운영난으로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1999년 대안공간 섬으로 출발한 반디는 130여차례 전시회와 주민참여 행사, 교육·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 소외된 지방 작가들의 작품 공간과 지역 미술 담론장 구실을 해왔던 터라 아쉬움은 더욱 컸다. 반디의 폐관은 “대안공간 1세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한 계기”(김종길)가 되었다.
이밖에 2007년 학력위조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직 큐레이터 신정아씨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 등을 바탕으로 자전 에세이 <4001>을 지난 3월 출간하며 미술판에 얽힌 언론인·정치인들의 음습한 이면을 실명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9월엔 예술가 70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진숙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만들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온라인 전시를 펼쳐 잔잔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 바람 잘 날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지난 6월 서울 소격동 옛 국군기무사 터에서 숙원이던 서울관(2013년 개관 예정) 기공식을 열었지만,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배순훈 관장이 임기를 넉달 남겨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 사령탑 없이 새해를 맞게 됐다. 대기업 회장과 장관 등을 지낸 그가 사퇴한 것은 국정감사 당시 서울관 명칭으로 ‘UUL(울) 국립서울미술관’을 채택한 경위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날선 추궁을 받았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질타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일로 자존심이 상한 데서 비롯했으리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앞서 미술관은 올 1월 유종하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십여년 전 수리·보관을 편법으로 맡긴 19세기 서양화를 전직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소장품인 주경의 스케치 그림을 분실하는 등 미술품 관리에도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 지역 대안공간의 안타까운 폐관 지난 10월 대표적인 지역 미술공간이던 부산의 ‘대안공간 반디’가 운영난으로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1999년 대안공간 섬으로 출발한 반디는 130여차례 전시회와 주민참여 행사, 교육·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 소외된 지방 작가들의 작품 공간과 지역 미술 담론장 구실을 해왔던 터라 아쉬움은 더욱 컸다. 반디의 폐관은 “대안공간 1세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한 계기”(김종길)가 되었다.
이밖에 2007년 학력위조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직 큐레이터 신정아씨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 등을 바탕으로 자전 에세이 <4001>을 지난 3월 출간하며 미술판에 얽힌 언론인·정치인들의 음습한 이면을 실명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9월엔 예술가 70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진숙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만들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온라인 전시를 펼쳐 잔잔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