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잉여 싸롱] ‘토토가’ 열풍
<무한도전>에서 최근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가 신드롬 수준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1990년대 가요들이 음원차트에 재등장하고, 거리에는 그 시절 댄스음악이 다시 울려퍼진다. 단순한 추억팔이냐, 90년대 가요에 대한 재평가냐, 말들도 많다. 이번주 잉여싸롱에서도 말 하나 더 보태긴 했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일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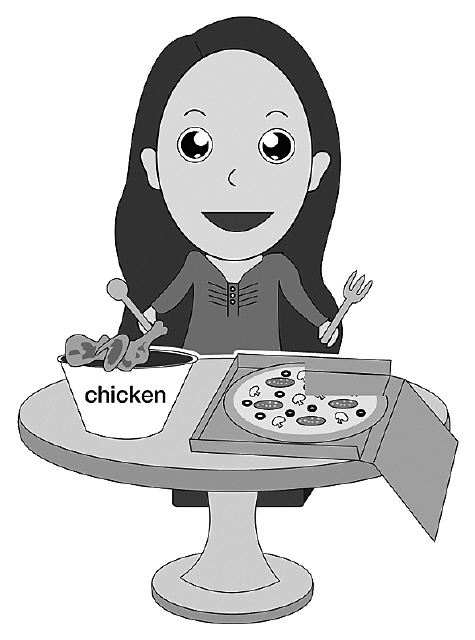 김선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한 순간들이 있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선 사회자 이본과 에스이에스의 슈가 울 때 특히 그랬다. 그 시절과 현재의 간극에서 오는 감정이랄까. 90년대 열풍에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성기의 추억을 첫사랑으로 순정만화처럼 포장해서 향수를 불러왔는데, ‘토토가’는 아련한 추억이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한 여러 감정을 끌어내서 더 특별했던 것 같다.
김선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한 순간들이 있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선 사회자 이본과 에스이에스의 슈가 울 때 특히 그랬다. 그 시절과 현재의 간극에서 오는 감정이랄까. 90년대 열풍에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성기의 추억을 첫사랑으로 순정만화처럼 포장해서 향수를 불러왔는데, ‘토토가’는 아련한 추억이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한 여러 감정을 끌어내서 더 특별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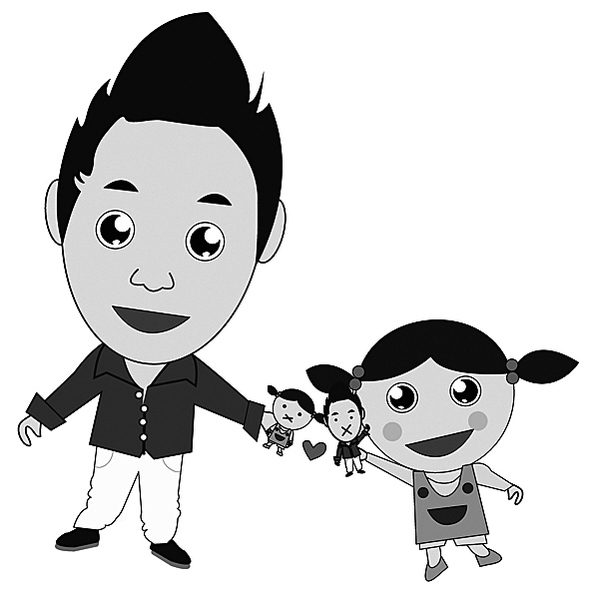 서정민 신승훈, 넥스트, 공일오비 같은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 아니라 ‘길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댄스음악을 소환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연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별에 아파하는 노랫말, 특유의 ‘뽕끼’ 있는 멜로디에 빠른 비트를 넣어 흥겹게 춤추며 부르는 노래들이 평론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다.
서정민 신승훈, 넥스트, 공일오비 같은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 아니라 ‘길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댄스음악을 소환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연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별에 아파하는 노랫말, 특유의 ‘뽕끼’ 있는 멜로디에 빠른 비트를 넣어 흥겹게 춤추며 부르는 노래들이 평론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승한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때 가요는 뭐든 조금씩 과잉이었다. 정체불명의 랩이나 “쓰랍따 뚜리룹” 같은 스캣, 귓전을 때리는 오케스트라 신스의 남발로 사운드를 넘치게 채우는 게 미덕이던 시절. 어쩌면 그건 90년대의 경제 호황이 남긴, 아이엠에프(IMF) 관리체제 때조차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근거 없는 낙관의 흔적인지도 모르겠다.
이승한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때 가요는 뭐든 조금씩 과잉이었다. 정체불명의 랩이나 “쓰랍따 뚜리룹” 같은 스캣, 귓전을 때리는 오케스트라 신스의 남발로 사운드를 넘치게 채우는 게 미덕이던 시절. 어쩌면 그건 90년대의 경제 호황이 남긴, 아이엠에프(IMF) 관리체제 때조차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근거 없는 낙관의 흔적인지도 모르겠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