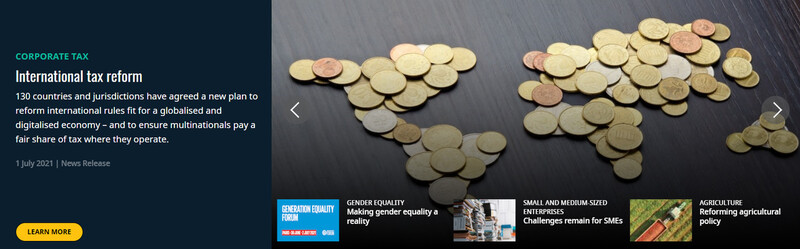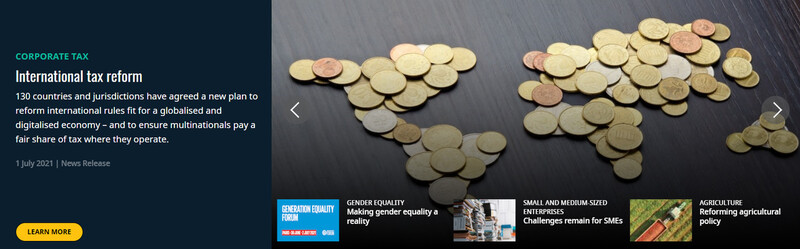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도입에 130개국이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걷는 세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다른 입장이었지만, 일부를 양보하면서 합의안에 지지를 보냈다.
2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따른 세수 영향은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함께 있어 정확한 영향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국내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수 감소폭이 새로 과세권 배분에 따른 글로벌기업로부터 받는 세수 증가폭보다 크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디지털세 도입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부터 받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새로 받는 될 세금이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고려해 중간재 업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 또 초과이윤에 대한 배분율도 20%로 국한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협의에서 영국 등이 주장한 금융업은 제외됐지만 중간재 업종은 포함돼 향후 과세권 배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배분율 역시 20∼30%로 기존 입장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에서 적용 대상, 매출액, 이익률, 업종, 배분비율, 매출귀속기준 등 첨예한 논점이 많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양보한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애초 디지털세 도입 취지가 글로벌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아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인 한국에게는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선진국에 주로 위치한 글로벌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이를 신흥국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이기 떄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부터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가 국제기구와 각국에게서 터져나온 바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사무총장도 최근 “역사적으로 전쟁이 조세 정책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위기는 국제 조세 제도를 재고하고 고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