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비친 갑을병 사회
(상) 어느 점주의 정산서 살펴보니
물건값 빼면 670만원 남지만
본사에 가맹수수료 240만원 내고
19개 부담비용·임대료에 ‘-72만원’
“최저임금 올라 당연히 힘들지만
본사 이중삼중 수탈이 진짜 문제”
(상) 어느 점주의 정산서 살펴보니
물건값 빼면 670만원 남지만
본사에 가맹수수료 240만원 내고
19개 부담비용·임대료에 ‘-72만원’
“최저임금 올라 당연히 힘들지만
본사 이중삼중 수탈이 진짜 문제”
월매출 3100만원 중 2400만원 차지
본사 대량구매로 유통마진 남기면서
애초 납품원가 상대적으로 고가 책정 또 떼가는 로열티
8년째 운영해도 가맹수수료는 35%
중소 프랜차이즈에는 없는 이중수탈
가맹점 부담비용까지 합하면 ‘삼중’ 편의점주의 소망
“비용 많다보니 인건비가 부담으로
본사는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하고
정부는 근접출점 금지 제도 마련을” 정산서 마지막 장 마지막 항목엔 이 모든 항목을 더하고 뺀 ‘가맹정산실금액’이 적혀 있다. ‘278만원’이다. 한달 3100만원 매출을 올린 김씨에게 최종 입금된 돈이다. 이게 끝일까? 여기서 아르바이트 직원 두명의 인건비(250만원)와 임대료(100만원)가 빠져나간다. 바로 72만원 적자로 돌아선다. 김씨 매장의 한해 매출은 3억원 정도로 편의점 평균 매출(약 6억원)보다 떨어지는 곳이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영세 편의점주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방증한다. 점주들이 인건비에 민감한 것은, 이미 뗄 거 다 떼고 남은 액수에서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본사에 입금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데, 최종 수익에서 인건비를 덜어내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것이다. 김씨는 “편의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곳”이라며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 기회란 근처 편의점 점주가 먼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김씨 편의점 근처에만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편의점 8곳이 있다. 현행 제도는 이를 규제하지 못한다.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 건물 안에 두곳이 영업 중일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거리 25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4년 슬그머니 폐지됐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규제 완화 여론의 흐름을 탄 것이다. 그 이후로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만 아니면 얼마든지 근접 출점이 가능해졌다. 김씨도 2010년 창업 뒤 한동안 2곳의 편의점을 운영했다. 한달에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근접 출점 금지 제도가 없어진 뒤부터 수익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는 무관한 제도의 탓이 크다. 인건비가 오르면 힘든 건 사실이다. 본사에 나가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법정 최저임금은 맞추려고 노력해온 김씨는 지난해 월평균 22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게 올해 들어 250만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27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 하지만 그는 인건비보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건비는 많이 올라봤자 시간당 천원이다. 반면 무제한으로 편의점 개설이 가능해진 뒤 편의점 본사는 수천억원을 더 벌었다. 그 수익은 점주들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점주 사정은 어찌 됐든, 일단 가맹점을 늘리면 본사가 유통마진을 남기고 로열티도 받아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맹 본사는 가맹수수료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하고, 정부는 원천적으로 근접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들이 단체로 가맹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세 편의점을 “난파선”이라며 “주변에 가맹 본사와 정부라는 구명보트가 있는데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에게 “누군가 편의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누가 옆에서 죽어가는 꼴 보고 싶으면 하라”였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편집국에서] 노동의 산수 / 김회승 [편집국에서] 노동의 산수 / 김회승](https://img.hani.co.kr/imgdb/resize/2018/0718/53_1531910932_00503223_2018071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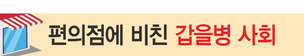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