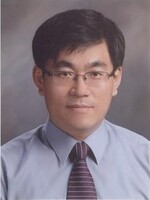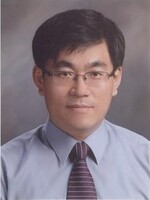[왜냐면] 반영운 |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장·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경계 2㎞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서, 접근성이 좋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3기 신도시는 현재 법적으로 총 22만6천 가구 중에서 35%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 약 65%가 공공과 민간의 이름으로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는 분양 주택이 중심이다. 분양 주택은 성남시 대장동 주택공급사업처럼 주택 수분양자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탓에 토지 투기의 대상이 된다.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니며, 토지의 가치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의 노력으로 결정된다. 공공개발에서 공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용한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분양받는 개발업자나 수분양자가 토지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노력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지대)의 독점, 즉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주택 개발의 경우, 수용한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 즉,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을 매각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면 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아파트)도 그 대안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치를 토지임대료로 환수하여 토지 개발비용을 충당하거나 주거는 물론 다양한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토지임대 비율을 100%로 상향시켜 토지불로소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즉, 현재 결정된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방식을 ‘토지임대 건물분양’이나 ‘토지건물 공공임대’ 방식으로 변경하고, 입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분양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를 30년 또는 60년 동안 임대하되 건물은 짓거나 분양받아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어 건물을 아껴서 사용하게 된다. 토지임대주택은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매나 양도도 할 수 있어 매우 자유롭게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2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주택으로 공급될 때 임대나 분양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서 서서히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공공임대나 토지임대 주택이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대량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향후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대부분 공공임대·토지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 곧 ‘사는 곳’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선 대부분의 주택이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거나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최근 싱가포르의 자가 주택 소유율은 90%를 넘고 있으며,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의 90%가 중대형 아파트이며, 정부가 토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책임지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처럼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반드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더 이상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개발, 매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와 토지임대 분양주택 200만 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가구의 특성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청년과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양질의 공공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가 바로 3기 신도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