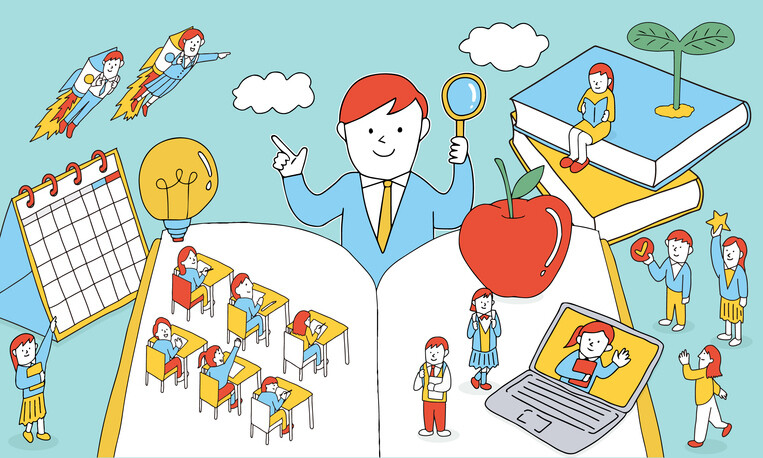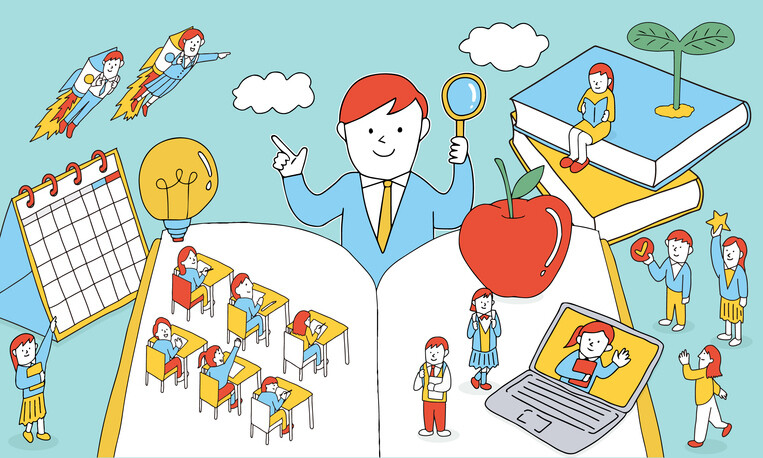[서울 말고] 명인(命人) | 인권교육연구소 ‘너머’ 대표
특성화 고등학교에 노동인권 수업을 하러 가면 담당 교사로부터 가끔 듣는 말이 있다. “전남의 꼴통들만 다 모아놓은 학교인 거 아시죠?” 나름은 강사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인사다.
수업이 시작되어도 엎드려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 수업 시간 내내 화장을 하는 학생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강사 목소리보다 더 크게 떠드는 학생들.
그래서 필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먼저 협상을 하곤 한다. 내가 하는 수업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으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만은 하지 않기로. 내가 아무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해도 학생들은 이 수업을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이 협상 과정은 학생들과의 라포(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이 다 자는 건 아니다. 나는 그런 학생 옆을 지나칠 때면 가볍게 그 학생의 등을 짚으며 “너무 피곤하죠?” 한다. 내내 화장을 하는 학생 옆을 지날 땐 뭔가를 설명하다 말고 “눈썹 비뚤어졌어요. 다시 그려야겠네!” 한다.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 옆을 지날 땐 슬쩍 묻기도 한다. “나는 한때 디아블로 폐인이었다가 게임 끊었는데, 요즘은 무슨 게임이 핫해요?” 이건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보내는 내 간절한 신호다.
그러다 보면 엎드려 자는 줄 알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적극적이 될 때가 있다. 여전히 손으로는 화장에 열중하면서도 입만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우호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끝내 그것을 외면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결국 반응을 하고 싶어지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수업 시작 30분이 지나도 집중하는 학생이 몇 명 없어서 몹시 힘든 날이었다. 한 학생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선생님 시간에만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 원래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다 엎드려 있어서 모둠토론을 못 하고 혼자 멀뚱히 앉아있던 한 학생은 눈짓으로 친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꿈도 희망도 없는 학교인 거.”
그런데 바로 그날, 두 번째 시간이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표어가 걸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 사진을 보여주고서,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냐고 물었을 때였다. 학생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교도소! 학교! 공장! 나는 정답을 알려주길 유보하고 여러분이 말한 이 세 곳의 공통점이 있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대답했다. 첫째, 사람들이 갇혀있다. 둘째, 계급이 있다. 셋째, 권력관계가 있다. 넷째, 강제노동을 한다. 나는 학생들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라면서 물었다. 계급과 권력관계는 어떻게 다른 거냐고. 학생들 간에도 넘을 수 없는 가정환경의 차이와 성적 차이가 있는 것이 계급이요, 교사와 학생 간에, 또 선도부거나 힘이 세서 권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있는 것이 권력관계란다. 이렇게 이어진 토론은 수업 시간이 지나 쉬는 시간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결국 시작종이 쳐서 다음 수업을 하러 온 교사가 깜짝 놀라며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대체 이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3년 동안 이 학생들의 이런 진지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이분법의 모순을 극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세계’를 다시 이름 지을 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스스로 꿈도 희망도 없는 학교라고 말하던 학생과 놀라운 토론을 보여주던 학생들은 같은 학생들이다. 이 간극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우리 교육은, 바로 그 간극에서부터 다시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