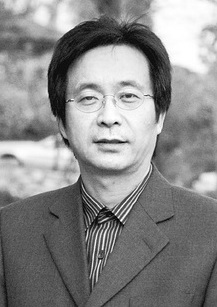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 독립성을 놓고 공영방송사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사표를 던졌고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방송>(KBS)도 이미 이전 사장이 불법 해임됐고, 현 대통령의 당선에 나섰던 이가 사장이 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던 언론인들은 징계를 받거나 지방으로 전출됐다. <와이티엔>(YTN)도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냈던 이가 사장이 된 지난 2008년 이를 반대하던 기자 6명을 해고 하였다. 결국 문제의 인물은 물러나고 이들의 해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새로 임명된 사장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서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사실, 새로이 임명된 사장들이나 이사들은 모두가 해당 방송사 출신으로서 해고나 징계를 받은 젊은 언론인의 선배들이다. 한국방송의 김인규 사장은 공채 1기 기자 출신이고, 와이티엔 배석규 사장도 회사 창립 당시부터 함께해온 기자 선배다. 노조원들이 출근을 막고 있는 문화방송 새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사내의 후배 언론인 모두가 이들 경영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기자와 피디들이 새로 만든 한국방송 노조(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김 사장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만 기존 노조의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새 경영진에 반대하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쪽을 구별하는 데는 여러 결이 있겠지만 가장 굵은 것은 ‘세대’이다. 방송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 등 군사정권의 폭압을 현직 초기부터 경험해본 50대들은 “이런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후배 징계에 나선다. 그 유명했던 ‘386 세대’들도 어느새 40대말 50대초 간부급이 돼버려 젊음의 패기를 잃어가는 눈치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방송개입을 보아왔기 때문에 “회사 발전을 위해서”라며 기대수준을 낮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민주정부 이후 입사한 현재 20·30대와 40대초 언론인들은 독립성 훼손 사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이례적(?) 자율성을 제작 일선에서 경험했고 인터넷 등 개방형 미디어에도 친숙한 세대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어린 세대가 공영방송에 대한 이상과 기대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 방송의 진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위주의 문화에 물들지 않은 이 세대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학자 헤벨과 데니스도 1990년대 초에 이미 한국 방송 민주화에서 ‘세대 차’가 중요한 개념임을 주목한 바 있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도 최근 <오마이뉴스>에 쓴 글에서 젊은 세대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은 공영방송 개혁에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이른바 ‘진보적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가치는 유보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유주의 가치를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진보냐 보수냐보다는 자유와 억압의 문제가 더 주목거리이다. 자명한 것을 가지고 계속 우기면서 지속적으로 ‘피디수첩 때리기’에 나서는 등 ‘진보 척결’을 내세우며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빵꾸똥꾸’ 같은 짓으로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어찌됐든 공영방송 제도만 살려낸다면 새로운 세대가 한국 방송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본주가 있는 사영 미디어와 달리 공영방송 제도 자체가 이들이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