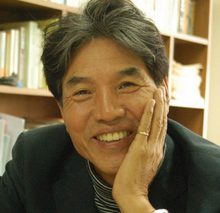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유명한 커피체인점에서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수십명의 독자들과 만나 한시간 넘게 강의와 토론을 했다. 놀라운 것은 행사를 하고 나서 작가인 내게 전혀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당시 ‘대화’의 텍스트가 된 책을 간행한 출판사에서 서둘러 ‘봉투’를 들고 왔다. 출판사에서 마련한 ‘봉투’였다. 커피체인점에선 행사를 통하여 작가와 작품을 홍보했고 장소를 제공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눈치였다.
이런 야만적 무례는 다국적기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유수한 인터넷서점에서도 ‘작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정작 작가에겐 사례금을 내지 않는 게 관행처럼 되었다. 책을 홍보해주었으니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무례가 가능한 것은 물론 홍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출판사 마케팅 전략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그 주체가 ‘서점’일진대, 고객에 대한 의미있는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부가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자기들 이름으로 작가를 불러놓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표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어떤 관점으로든 이해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면 원고료 문제도 있다. 내 소설 <촐라체> 연재 이후, 이제 인터넷 연재가 보편적인 문화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인터넷서점들도 연재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편소설 위주로 발전해온 한국문학의 협소한 지형을 장편 중심으로 재편해내는 데 매우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작품이 연재되는 공간의 주인인 인터넷서점은 원고료를 내지 않는다. 작가와 계약한 출판사에서 원고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반적 수준의 고료를 제공할 뿐이다. 마치 <한겨레>에 소설을 연재시켜놓고 원고료는 출판사에서 다 부담하는 꼴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관행은 원고료조차 떼어먹히는 일까지 종종 있었던 절대빈곤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촐라체’의 경우, 나는 연재 공간을 제공한 ‘네이버’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다. 소설 발표는 상업적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이미지나 문화 콘텐츠 생산력 신장에 기여할 것이므로 연재 계약을 맺으며 ‘내 연재가 끝나도 이 공간을 계속 살려달라’고 ‘네이버’ 쪽에 말했고, 그쪽에서도 기꺼이 내 말에 동의했다. 내 소망은 신문 연재도 거의 사라져 장편 발표의 지면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좀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긴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내 소망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인터넷 연재는 많아졌지만 원고료는 오르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본력이 좋은 포털업체에서는 소설 연재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화가 다양하게 연재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활자로 매개되는 문학은 모든 문화콘텐츠의 최저층에 있으므로, 예컨대 산업으로 치면 쌀농사와 같다. 쌀이 생산되어야 비로소 떡도 빚고 향기로운 술도 빚고 갖가지 과자도 만들 수 있다. 단지 세속적인 인기만을 고려해서 ‘쌀농사’를 버리고 나면 우리의 문화 정체성은 물론 다양한 ‘한류문화’조차 한계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크게 대접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만신창이가 된 모국어를 붙잡고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발목을 진흙탕에 담그고 문화의 ‘논’을 갈고 있는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 예절 속엔 조회수와 상관없이 포털업체에서 작품 발표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것과, 인터넷서점들도 당연히 원고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출판사와 함께 부담해 지면 연재의 일반적 관례보다 원고료가 좀더 상향조정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인터넷 연재는 독자에게 일일이 덧글도 달아야 하고 때론 악플에도 시달려야 하니, 지면 연재보다 원고료를 더 받을 권리가 작가에게 충분히 있다고 본다.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