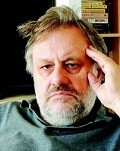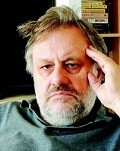슬라보이 지제크 ㅣ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경희대 ES 교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으려 한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을 보자. 독일에서는 좌파가, 미국에서는 우파가 이런 시위를 주도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료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적 입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알지 않으려 하는 태도다. 이들은 이미 다가온 위험을 외면한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우파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의 자유라는 것은, 굶느냐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느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18세기 영국 광산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우리는 생업을 하려면 목숨을 감수해야 한다.
놀랍게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감염을 피하려면 자기격리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감염자 수가 너무 적어지면 코로나 재유행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를 걸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바이러스의 여러 변종이 발견되었고, 이런 변종은 백신 개발 노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코로나를 단기에 종식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코로나 위기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동아시아 문화는 서구 문화와 달리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죽음은 어디에서도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현황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보다 암이나 심장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코로나만 벗어나면 그것이 곧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다른 고통, 다른 죽음도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의 확산세가 곧 절정을 맞은 뒤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큰 파국이 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증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진다.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다 해도 그것은 상황이 그저 조금 나아지는 것일 뿐이다.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전망했지만 결국 그 종언 자체가 종언하지 않고 있듯이, 코로나의 종식은 종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괴한 상황에 갇힌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새로운 생태학적 위기들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시기의 시작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한 예측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물론 있다.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발명해야 한다.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제사회에는 인류를 생존하게 할 자원이 충분하다. 이 자원들을 이용하여, 지구 어딘가에서 식량난이 발생하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갖추자. 향후 다가올 감염병 유행들을 대비하여, 한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만 집중되는 사이, 지금도 지속되는 전쟁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새로운 야만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시리아 내전과 같은 열전, 또는 재점화한 미국과 중국의 냉전 등은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해 모든 전쟁을 중단하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무산되었다. 바이러스 범유행은 전쟁과 다르지 않다. 어느 순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의학의 문제도, 과학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온당히 정치적인 문제다. 번역 김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