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최재천의 정치를 읽는 밤_‘민주주의의 유형’, 타협이 답이다
“사람들이 절대 지켜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소시지 만드는 것과 법률 만드는 것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그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사례는 수두룩하다.
경제활성화법으로 과포장된 관광진흥법이 있었다. 2012년 10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학교 앞 호텔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3년이 지난 2015년 19대 마지막 국회에서야 타협이 이뤄졌다. 크게는 모자보건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쟁점 법안과 맞교환했다. 법 자체로는 5년짜리 한시법으로 제한했고, 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거리를 기존 200m에서 75m로 좁혔다. 여야 모두 만족하는 이, 없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자 뉴딜 정책의 막후 조력자인 프랜시스 퍼킨스가 뉴욕에서 시민운동가로 일할 때의 일이다. 그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일은 주당 노동시간을 5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었다. 오랜 토론 끝에 주 의회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정치적으로 막강했던 통조림 산업이 빠져 있었다. 동료들은 법안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선 빵을 반쪽이라도 받아들자고 설득했다. “법안을 지지할 것이고, 그 책임을 물어 죽으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퍼킨스는 이후 오랫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빵 반쪽짜리 여인’으로 불렸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9월19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2196건. 통과된 법안은 없다.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며 비판이 시작됐다. 먼저 변명 두 가지. 첫째, 모든 법안이 통과를 목표로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록 소수의견에 불과하더라도 시민이 헌법적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어느 땐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고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이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 특히 행정부의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의원 입법의 통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질적 대안은 뭘까? 최근 출간된 비교정치학의 고전 <민주주의의 유형>(아렌드 레이프하트 지음, 김석동 옮김, 성균관대출판부)에서 답을 찾아보자.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면 근본 문제가 뒤따른다. 인민의 선호가 분산될 때, 통치자는 누구이며, 정부는 누구의 이익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인민의 다수”라는 것이다. ‘다수결 모델’이다. 다른 대답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다. 즉, ‘합의 모델’이다. 다수결 모델은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파트너 간에 적대적인 반면, 합의 모델은 협상과 타협으로 정리된다. 합의와 타협의 과정이 지난하기에 다수결이 효과적일까? 지은이는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합의제적 국가는 다수결제적 국가보다 효과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질 양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결론내렸다.
본질적 대안은 뭘까? 최근 출간된 비교정치학의 고전 <민주주의의 유형>(아렌드 레이프하트 지음, 김석동 옮김, 성균관대출판부)에서 답을 찾아보자.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면 근본 문제가 뒤따른다. 인민의 선호가 분산될 때, 통치자는 누구이며, 정부는 누구의 이익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인민의 다수”라는 것이다. ‘다수결 모델’이다. 다른 대답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다. 즉, ‘합의 모델’이다. 다수결 모델은 배타적이고 경쟁적이며, 파트너 간에 적대적인 반면, 합의 모델은 협상과 타협으로 정리된다. 합의와 타협의 과정이 지난하기에 다수결이 효과적일까? 지은이는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합의제적 국가는 다수결제적 국가보다 효과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질 양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결론내렸다.
 최재천 전 의원은 이름난 독서광입니다. 현역 시절에도 한 달에 스무 권씩 읽을 정도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풀어냅니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의 ‘낯선 정치’와 격주로 연재됩니다.
최재천 전 의원은 이름난 독서광입니다. 현역 시절에도 한 달에 스무 권씩 읽을 정도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풀어냅니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의 ‘낯선 정치’와 격주로 연재됩니다.
전 국회의원·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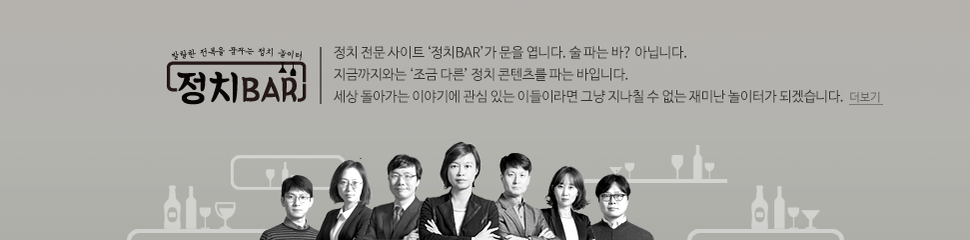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전 국회의원·변호사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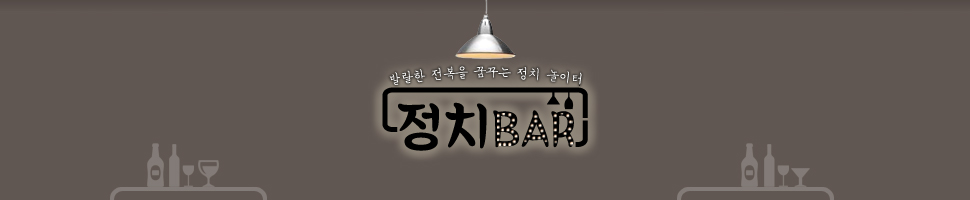







![[영상] 김민석 “국힘, 100일 안에 윤석열 부정하고 간판 바꿔 달 것” [영상] 김민석 “국힘, 100일 안에 윤석열 부정하고 간판 바꿔 달 것”](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4/2025011450372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