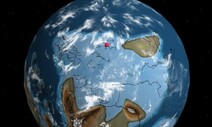[창간 30년, 한겨레 보도-1]
1988년 이근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까지의 뒷이야기
1988년 이근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까지의 뒷이야기
1988년 12월 21일 한겨레신문 1면 기사의 일부.
“그 고문 기술자 이름을 아직도 모릅니까?”문학진이 물었다.
“조금 알아내긴 했는데, 이근, 뭐라던데. 현재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확인해본 건 아니야.”김근태가 말했다. 문학진의 귀가 번쩍 띄었다. 바로 경기도경 담당인 배경록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부탁했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은 김 아무개고, 다만 공안분실장 이름이 이근안”이라고 배경록이 잠시 뒤 알려왔다. 문학진은 자신의 담당인 치안본부로 달려갔다. 경찰 인사 파일을 구했다. 이근안의 거주지 등 인적 사항과 함께 희미한 사진 복사본이 있었다. 김근태를 찾아가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근태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쳐다봤다.
“맞습니다. 바로 그자요.”문학진은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듭 확인을 받았다. 동대문서를 출입하던 김성걸 기자와 종로서를 출입하던 안영진 기자가 이근안 주소지의 동사무소로 뛰었다. 동사무소 직원이 내미는 주민등록대장에 이근안의 최근 모습이 담긴 증명사진이 있었다. 하루 반나절의 맹렬한 취재 끝에 1988년 12월 21일, ‘이름 모르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기사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고문 기술자의 이름과 사진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보도 일주일 전 백남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등 김근태 고문사건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경찰간부 4명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에도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성명 미상자’의 얼굴을 공개한 특종이었다.
2001년 1월 서울시내에 걸린 고문경찰 이근안의 현상수배 대자보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8년 12월 29일 한겨레신문 5면에 실린 기사의 일부.
김근태 의장을 고문한 이근안 전 경감이 공소시효가 지난 1999년 10월 자수를 한 뒤 그해 1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한겨레 창간 30돌을 맞아,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한 특종이나 기획 기사의 뒷이야기를 <창간 30년, 한겨레 보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이 글은 디지털 역사관인 '한겨레 아카이브'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겨레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한겨레 아카이브 페이지(www.hani.co.kr/arti/archives)를 찾아주세요. 한겨레 30년사 편찬팀 achiv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