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리의 별헤는 지구]
7월 폭염 때 줄었던 모기, 9월초·하순 평년보다 늘어
온난화로 모기 개체수 늘고 일교차 커지자 실내로
7월 폭염 때 줄었던 모기, 9월초·하순 평년보다 늘어
온난화로 모기 개체수 늘고 일교차 커지자 실내로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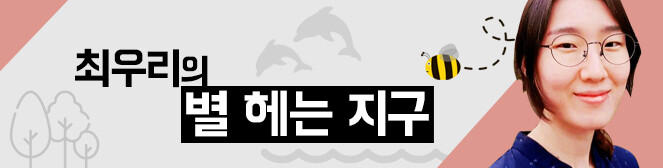
9월 평년보다 모기 개체 수 많았다 27~32도 사이에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모기는 ‘적당한’ 고온이 유지되면 성장이 빨라져 수명은 단축됩니다. 그러나 세대교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체수는 늘어납니다. 이 교수는 “모기는 변온동물”이라며 “체온이 빨리 올라가면 대사작용이 활발해져 성장속도가 빨라 성충의 수명이 줄지만 그만큼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서 이후 추워지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던 ‘전통’ 모기들이 기후변화로 온난해지자 계속 산란하며 세를 불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름보다 가을에도 모기가 잘 살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고신대 등에 위탁해 전국 9개 축사 등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채집·집계하고 있는 모기 수 통계를 보면, 올여름 모기들이 보낸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모기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올해 5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예년과 대비한 전체 모기 수 변동 추이를 보면, 올해는 7월 초 짧은 늦장마와 7월 중하순의 폭염, 건조했던 8월 중순까지는 평년과 비교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비가 안 와도 모기가 살기 힘든 환경인 거죠. 그러나 비가 오고 폭염이 꺾인 8월 말부터 서서히 모기 수가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모기 수는 9개 지점에서 트랩 하나당 채집된 평균 모기 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20일 전까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 300~400마리에 머물렀습니다. 6월20일 이후에는 1000여 마리로 그 수가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수가 적었습니다. 늦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7월초에는 평년보다 소폭 많은 개체수인 1600여 마리가 기록됐지만 짧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7월11일 무렵 개체수가 800여 마리에 그쳐 평년보다 300여 마리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폭염이 살짝 꺾인 7월말 다시 개체수가 평년보다 250여 마리 많은 840여마리로 늘었습니다. 8월은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변동폭은 있었지만 평년 수준이 유지되었고 8월 중순 이후로는 평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9월 초부터 평년(814개체)보다 300여 마리 많은 1187마리가 확인돼 모기 수가 늘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서늘했던 추석 연휴 기간(9월19~25일)에는 개체수가 줄었지만,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는 평년보다 7마리 많은 216마리가 채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가을 모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10월초까지 낮 기온이 여전히 높고 밤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커졌다. 낮기온이 높은 것은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채집을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통계에는 이게 정확히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또 일교차가 커서 야간에는 실내로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9월 하순 이후부터는 모기가 여름철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매개하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_______
겨울 기온 10도 넘으면 성충으로 월동…열대 풍토병 토착화 경고도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경고도 잇따릅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뎅기열·황열·지카바이러스 등 모기가 매개하는 열대 기후의 풍토병이 한국에서도 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들을 매개하는 모기는 흰줄숲모기입니다. 등에 흰 줄이 있어 일명 ‘아디다스 모기’라고도 불리는 모기 맞습니다. 이 모기는 현재 한국에서 알 상태로 월동을 하지만,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이 10도를 넘을 경우 성충인 상태로 월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바이러스 등 풍토병에 감염된 사람을 문 모기가 한국에서 한 해를 보낸 뒤 또 다른 사람들을 물며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2019년 과학·의학 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바이오메드센트럴(BMC Public Health)에 발표한 ‘뎅기열 비위험국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협-기후학적, 비기후학적 데이터를 이용한 뎅기열 고위험지역 분석’ 논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부산 일대와 울산광역시 서부, 전라북도 군산, 전라남도 무안 남부와 제주 지역을 뎅기열 위험 지역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0월 초 남부지역의 기온이 110여 년만에 최고기온을 경신한 것을 고려할 때 긴장하게 됩니다.

지난 6월16일 경북 포항 남구 송도동에서 방역 담당자가 하수도 주변에 모기약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기가 그래도 너무 많다면… 일단 실내에 모기가 너무 많다면, 이 교수는 그 이유를 분석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우선 낮과 밤에 활동하는 모기가 다릅니다. 몸길이 3.5㎜의 흰줄숲모기는 낮에, 5㎜가량으로 좀 더 큰 빨간집모기는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만약 모기가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면 빨간집모기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낮에 잘 물린다면 숲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주로 숲에 사는 흰줄숲모기라면 외부에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벽과 창틀 사이에 붙은 실리콘이 벌어지는 등 모기만 아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 모기가 외부로 이동하기 곤란한 15층 이상이고, 지나치게 집에 모기가 많다면 지하에 집수정이나 정화조 등 고인 물이 있는 공간 중심으로 모기가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환풍구·배수관 등을 타고 세대간 이동이 가능하다. 관리실에 부탁해 소독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