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태동한 한국 가톨릭의 농민운동은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에 맞서며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사진은 78년 4월 광주 북동성당에서 윤공희 대주교와 전국의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단이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을 위한 농민의 기도회’를 집전하는 모습(왼쪽)과 미사를 끝낸 뒤 거리시위를 나서려는 농민회원들이 성당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오른쪽)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70)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학생과 재야 인사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농민운동이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는 동아투위·조선투위가 ‘민주민족언론선언’을 발표하던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다.
70년대 농민운동은 가톨릭농민회(가농)가 중심이었다. 가농은 76~78년 ‘함평 고구마 사건’, 77년부터의 ‘농협 민주화운동’, 78년 이래 ‘쌀값·생산비 보장 운동’, 79년의 ‘노풍피해 보상 운동’, 안동교구의 ‘새품종 감자농사 피해 보상 운동’ 등을 벌였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무책임 행정, 저농산물 정책, 무대책 농산물 개방에 저항했다.
64년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안의 ‘농촌청년부’로 시작해 66년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자립한 뒤, 72년 새로 출범한 ‘가톨릭농민회’(초대 총재 이동호 아빠스 분도수도원장, 초대 회장 이길재)는 출범 초기 “농협의 민주화”, “농업의 협동화와 조직화”를 내걸고 협업적 대농 경영. 농촌신용조합의 보급과 육성 운동에 주력했다.
76년 가톨릭의 공식 인준단체로 승인받아 대전으로 본부를 옮긴 가농(당시 회장 최병욱)한테 77년은 특히 중요한 해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때부터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농업을 홀대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77년 농협은 비료를 부정 도입해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가농은 피해 농민들에게 40억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농은 76년 11월 일어난 ‘함평 고구마 사건’에 대한 배상 운동도 전개했다. 이 사건은 전남 함평군의 농협에서 76년 160여 농가와 고구마 수매계약을 맺고는 가을에 약속을 불이행하는 바람에 농민들에게 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배상은커녕 회유와 협박만 일삼아 집단 원성을 산 것이었다. 77년 4월22일 가농이 광주 계림동 성당에서 이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자, 정부는 마지못해 피해 조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배상 없이 1년을 방치했다. 78년 4월24일 광주 북동성당에서 다시 기도회가 열리고 가농 회원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그제야 농협은 309만원을 배상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주정회사와 짜고 무려 80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가농은 78년 쌀생산비 보장 운동을 전개했다. 11월13~14일에는 강원지역 농민 1200여명이 원주에서, 16~17일에는 대전에서 중부지역 농민 800여명이, 11월21~22일에는 경북 상주 함창에서 영남지역 1000여 농민들이, 11월27~28일에는 광주에서 호남지역 1300여 농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 쌀생산비 보장운동은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78년 수확량이 좋다면서 ‘노풍’이라는 신품종 벼 종자를 권장했다. 농림부는 전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종자 ‘권장’을 넘어 강제하고 강요했다. 그런데 ‘노풍’은 냉해를 입어 오히려 수확량이 격감해버렸다. 가농은 78년 12월~79년 1월 전국적으로 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벌여 피해 보상운동을 전개했다. 79년 1월2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노풍 피해 농민들은 읍사무소로 몰려가 3시간 집단 농성을 했고, 전북 완주군 고산 천주교회(담임 문규현 신부)도 3월17~26일 비봉·고산·운주 등 3개 면 11개 리 164농가의 피해조사를 한 다음 피해보상 집회를 했다. 이때 조사에 응한 농가는 보상을 받았으나, 정부의 협박에 넘어가 피해 조사를 거부한 농가 122가구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가농의 이런 운동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탄압으로 되돌아왔다. 춘천교구 가농(회장 유남선)은 77년 12월27일치 유인물을 통해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공안당국은 유 회장과 총무 김문돈, 가농 전국본부 협동사업부장 정성헌(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연행했다. 김 총무와 정 부장은 사흘 만에 풀려났으나, 유 회장은 20일 이상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것도 잠시, 79년 4월 초 유 회장과 정 부장은 다시 연행되어 ‘긴조 9호’ 위반으로 고법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을 위한 석방 기도회를 연 가농 춘천교구연합회 부회장 박명근도 구속돼 고법에 가서야 집행유예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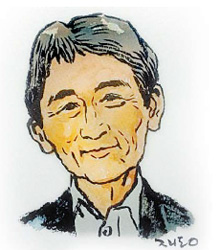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78년 안동교구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은’ 한편의 3류 드라마로 널리 회자됐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의 가농 분회장으로서 정부에서 알선해준 불량 감자씨의 피해 배상운동에 앞장선 오원춘은 기관원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뒤 7월17일 안동교구를 통해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에게 유언비어 날조 혐의를 씌워 ‘긴조 9호’로 구속시켰다. 오원춘이 재판을 받던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78년 안동교구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은’ 한편의 3류 드라마로 널리 회자됐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의 가농 분회장으로서 정부에서 알선해준 불량 감자씨의 피해 배상운동에 앞장선 오원춘은 기관원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뒤 7월17일 안동교구를 통해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에게 유언비어 날조 혐의를 씌워 ‘긴조 9호’로 구속시켰다. 오원춘이 재판을 받던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24/00505861601_201406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