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호인 여우비와 외계인 요요, 자폐아 종이, 숲 속 반달곰은 전혀 이질적인 존재들이지만, 진지하게 소통하며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 이들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살아 있는 것들의 제일 원리”라고 했다. 영화인 제공
김용석 교수의 대중문화로 철학하기 / 이성강 <천년여우, 여우비>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에서, “영혼에 대한 앎은 모든 진리, 특히 자연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영혼은 살아 있는 것들의 제일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영혼을 눈에 보이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는 여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천 년을 산다는 구미호로서 이제 백 년 쯤 살아, 사람으로 말하면 막 사춘기에 들어선 소녀다. 그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요요들과 친구가 된다. 어느 날 요요 한 명이 산을 내려와 마을의 폐교에 있는 청소년 수양관으로 들어간다. 요요들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 여우를 수양관으로 보낸다. 소녀로 둔갑한 여우는, 자신을 성이 ‘여’씨이고 이름은 ‘우비’라고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여우비가 말썽 요요를 구출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이라는 자폐아와 뗄 수 없는 친구 사이가 돼 있다. 종이는 자폐증 때문에 말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대신 커다란 곰 인형을 가슴에 안고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산다. 그런 종이가 어느 날 곰 인형 대신 털북숭이 요요를 친구로 삼은 것이다. 여우비는 새끼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숲 속의 반달곰에게 곰 인형을 준다. 그러는 사이에 여우비는 전에도 이곳 숲에서 본 적이 있는 황금이라는 남자 아이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들은 모두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서로 진지하게 소통하고 있다. 외계에서 온 요요들과 여우비가 숲 속 집에서 함께 살고, 종이는 쇠붙이를 먹어야 하는 말썽 요요에게 쇠못을 계속 대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어미 반달곰은 곰 인형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종이와 여우비를 위기에서 구출해준다. 무엇보다도 금이와 여우비는 서로 좋아하게 된다.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이다. 그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 그거야 환상적 이야기니까 그렇지!”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현실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른 존재끼리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기 때문이다. 곧 마음 또는 영혼이 통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동물과 무엇으로 소통하겠는가? 좀 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지구인이 언젠가 외계인과 만난다면 무엇으로 소통할 텐가?
서로 소통(communication)한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구어에서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곧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우비의 이야기도 이질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영혼을 매개로 한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영혼의 자유는 타자에게 가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소통에 의한 합일과 공동체적 연대감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타자를 위한 희생이다. 여우비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영혼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우비는 오히려 금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한다. 여우비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새로 변해 날아가는 카나바 호수의 심연에서 금이의 영혼이 갇혀 있는 새장을 갖고 나온다. 금이의 영혼을 놓아주는 대신 자신의 영혼은 새장에 갇혀버린다.
이 작품은 영혼의 소통과 함께 영혼이 곧 정체성이라는 메시지 또한 전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림자로서만 존재하는 ‘정체 불명’의 그림자 탐정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탈취해서 ‘정체 분명’한 존재가 되려고 금이의 영혼을 빼앗으려 한다. 반면 이 작품에는 ‘영혼 있는 존재’와 대비되는 ‘영혼 없는 존재’가 등장한다. 그것은 허수아비다. 도깨비와 처녀귀신의 머리를 한 허수아비들은 무섭고 위협적이다. 야간 극기 훈련에 참가한 수양관 아이들은 허수아비의 공격에 혼비백산해 도망치지만, 쓰러진 허수아비 머리 속에서 지푸라기를 한 움큼 빼내고는 그 기만을 알아차린다. “쳇 이게 뭐야, 잘 좀 만들지 킥킥” 하고는 그 무섭던 허수아비를 무시한다. 영혼이 없는 존재와는 상호 소통이 불가능하고, 일방적 위협과 기만 그리고 무시가 있을 뿐이다. 이제 철학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서구사상사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철학사에서는 그 책임을 주로 고대의 플라톤에게 돌리며 그런 이원론적 사유 구조는 근대의 데카르트에까지 이어진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의 전통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영육분리가 그 목적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육이원론의 진정한 의미는 분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비가시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원적 분리는 그런 강조를 도식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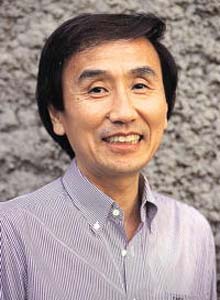 그렇게 강조한 까닭은 가시적인 것에 견줘 비가시적인 것은 지나치기 쉽기 때문이다. “나도 영혼이 있을까?”하는 여우비의 말에, 구릉나무의 영혼은 “그럼!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어”라고 강조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대 영혼을 돌보라”고 가르친 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견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잊고 사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영혼의 존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들의 세계에서 소중한 역할을 함으로써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분리의 이원론’이라기보다 ‘공존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육분리설을 영육공존론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영산대 교수 anemos@ysu.ac.kr
그렇게 강조한 까닭은 가시적인 것에 견줘 비가시적인 것은 지나치기 쉽기 때문이다. “나도 영혼이 있을까?”하는 여우비의 말에, 구릉나무의 영혼은 “그럼!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어”라고 강조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대 영혼을 돌보라”고 가르친 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견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잊고 사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영혼의 존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들의 세계에서 소중한 역할을 함으로써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분리의 이원론’이라기보다 ‘공존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육분리설을 영육공존론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영산대 교수 anemos@ysu.ac.kr
이 작품은 영혼의 소통과 함께 영혼이 곧 정체성이라는 메시지 또한 전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림자로서만 존재하는 ‘정체 불명’의 그림자 탐정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탈취해서 ‘정체 분명’한 존재가 되려고 금이의 영혼을 빼앗으려 한다. 반면 이 작품에는 ‘영혼 있는 존재’와 대비되는 ‘영혼 없는 존재’가 등장한다. 그것은 허수아비다. 도깨비와 처녀귀신의 머리를 한 허수아비들은 무섭고 위협적이다. 야간 극기 훈련에 참가한 수양관 아이들은 허수아비의 공격에 혼비백산해 도망치지만, 쓰러진 허수아비 머리 속에서 지푸라기를 한 움큼 빼내고는 그 기만을 알아차린다. “쳇 이게 뭐야, 잘 좀 만들지 킥킥” 하고는 그 무섭던 허수아비를 무시한다. 영혼이 없는 존재와는 상호 소통이 불가능하고, 일방적 위협과 기만 그리고 무시가 있을 뿐이다. 이제 철학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서구사상사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철학사에서는 그 책임을 주로 고대의 플라톤에게 돌리며 그런 이원론적 사유 구조는 근대의 데카르트에까지 이어진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의 전통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영육분리가 그 목적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육이원론의 진정한 의미는 분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비가시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원적 분리는 그런 강조를 도식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용석/영산대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