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함께하는 교육]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29.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워런 버핏은 왜 금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을까?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홍성민 옮김/뜨인돌 이집트인들은 금을 ‘신(神)의 살(肉)’로 여겼다. 썩지도 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죽으면 몸이 황금으로 된 신이 된다고 믿었다. 옛 비석에 따르면, 신 가운데 최고인 태양신 라(Ra)도 ‘나의 피부는 순금이다’라고 했단다. 파라오들이 금으로 몸을 둘렀던 까닭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금관과 금장식을 차려입으며 ‘신의 살’로 온몸을 감싼다고 믿었다. 그래야 신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황금에 대한 생각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부처의 몸은 ‘신금색상’(身金色相)이라 하여 금색으로 빛났다고 한다. 지금도 불상(佛像)에는 금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은 어떨까? 기독교가 뿌리내린 유럽에서는 신의 모습을 직접 빚어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오래된 성당 곳곳에는 금으로 된 장식들로 가득하다. 이처럼 금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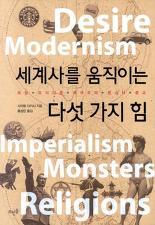
금은 가치를 매기는 잣대이기도 했다. 금은 아무데서나 구하기도 힘들었다. 번쩍이는 금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손에 쥘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다. 600여년 전,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동쪽 끝의 나라 ‘지팡구’(지금의 일본)를 ‘황금의 나라’로 그렸다. 상업이 뻗어나가던 시기, 유럽인들의 황금 사랑은 남달랐다. 그들이 서둘러 세계를 향해 배를 띄웠던 데는 금에 대한 욕망이 큰 몫을 했다. 1500년대, 스페인인들은 신대륙에서 황금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곤, 금을 잔뜩 빼앗았다. 스페인 사람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곳곳에서 금광을 찾아 금을 캐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오를 잡아들여 노예처럼 부렸다. 고된 일과 전염병으로 인디오들은 속절없이 죽어갔다. 그러자 부족한 일꾼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하고 ‘수입’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황금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흑인들만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 유럽 사람들도 삶이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대륙에서 황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른바 ‘가격 혁명’이 닥친 것이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품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를 사고팔 때 쓰는 황금만 많아지니 당연히 물가가 뛸 수밖에 없겠다. 높은 물가는 많은 이들을 굶주림과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황금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와 같다. 황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투고 싸우게 한다. 신대륙의 금을 움켜쥔 스페인은 16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Armada)를 물리친 영국은 신대륙의 금을 차지했다. 게다가 브라질에서 금광을 찾아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대한 황금을 깔고 앉은 ‘대영제국’ 역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한편, 황금은 종이돈을 낳기도 했다. 지폐는 원래 ‘황금 교환권’이었다. 무거운 금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 금을 맡겨두고 종이로 된 ‘교환권’만 들고 다녔다. 이 교환권이 바로 ‘종이돈’이다.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영국은 화폐 가치를 금으로 가늠했다. 금 1온스는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로 매겨졌다. 금으로 화폐 가치를 뒷받침하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로써 영국 파운드는 국제적으로 믿고 쓰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파운드는 필요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 금이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는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의 달러로 바뀌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된 것도 이즈음이다. 하지만 금본위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가 훌쩍 웃자라, 세상에 금보다 더 많은 화폐가 돌아다니게 된 탓이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금과 달러를 바꾸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사이토 다카시가 화폐를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종이돈은 휴짓조각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위태로울 때, 한 나라 화폐 전체가 순식간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금본위제가 막을 내린 지금, 이제 황금은 ‘돈’이 아니다. ‘신의 살’은 더더욱 아니다. 금은 이제 귀금속 가운데 하나로 팔고 사는 ‘상품’일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황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황금은 인간의 깊은 욕망을 채워주고, (얻고자 하는 것의) 상징으로 이용하기를 재촉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금은 쓸모가 없다”고 내뱉는다. 금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버핏은 금 대신 생산 시설에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나아가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資産)”이라며 금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런데도 금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한 관계자는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금융위기를 몇 차례 거친 지금, 달러의 가치는 위태위태해 보인다. 찰리 멍거는 금은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말이 되레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즘이다. 투기 바람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세상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을까?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요즘, 금융시장이 더더욱 불안하게만 다가온다. 안광복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워런 버핏은 왜 금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을까?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홍성민 옮김/뜨인돌 이집트인들은 금을 ‘신(神)의 살(肉)’로 여겼다. 썩지도 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죽으면 몸이 황금으로 된 신이 된다고 믿었다. 옛 비석에 따르면, 신 가운데 최고인 태양신 라(Ra)도 ‘나의 피부는 순금이다’라고 했단다. 파라오들이 금으로 몸을 둘렀던 까닭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금관과 금장식을 차려입으며 ‘신의 살’로 온몸을 감싼다고 믿었다. 그래야 신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황금에 대한 생각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부처의 몸은 ‘신금색상’(身金色相)이라 하여 금색으로 빛났다고 한다. 지금도 불상(佛像)에는 금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은 어떨까? 기독교가 뿌리내린 유럽에서는 신의 모습을 직접 빚어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오래된 성당 곳곳에는 금으로 된 장식들로 가득하다. 이처럼 금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금은 가치를 매기는 잣대이기도 했다. 금은 아무데서나 구하기도 힘들었다. 번쩍이는 금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손에 쥘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다. 600여년 전,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동쪽 끝의 나라 ‘지팡구’(지금의 일본)를 ‘황금의 나라’로 그렸다. 상업이 뻗어나가던 시기, 유럽인들의 황금 사랑은 남달랐다. 그들이 서둘러 세계를 향해 배를 띄웠던 데는 금에 대한 욕망이 큰 몫을 했다. 1500년대, 스페인인들은 신대륙에서 황금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곤, 금을 잔뜩 빼앗았다. 스페인 사람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곳곳에서 금광을 찾아 금을 캐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오를 잡아들여 노예처럼 부렸다. 고된 일과 전염병으로 인디오들은 속절없이 죽어갔다. 그러자 부족한 일꾼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하고 ‘수입’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황금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흑인들만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 유럽 사람들도 삶이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대륙에서 황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른바 ‘가격 혁명’이 닥친 것이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품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를 사고팔 때 쓰는 황금만 많아지니 당연히 물가가 뛸 수밖에 없겠다. 높은 물가는 많은 이들을 굶주림과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황금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와 같다. 황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투고 싸우게 한다. 신대륙의 금을 움켜쥔 스페인은 16세기에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Armada)를 물리친 영국은 신대륙의 금을 차지했다. 게다가 브라질에서 금광을 찾아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대한 황금을 깔고 앉은 ‘대영제국’ 역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한편, 황금은 종이돈을 낳기도 했다. 지폐는 원래 ‘황금 교환권’이었다. 무거운 금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 금을 맡겨두고 종이로 된 ‘교환권’만 들고 다녔다. 이 교환권이 바로 ‘종이돈’이다. 영국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영국은 화폐 가치를 금으로 가늠했다. 금 1온스는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로 매겨졌다. 금으로 화폐 가치를 뒷받침하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로써 영국 파운드는 국제적으로 믿고 쓰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파운드는 필요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 금이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는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의 달러로 바뀌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된 것도 이즈음이다. 하지만 금본위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가 훌쩍 웃자라, 세상에 금보다 더 많은 화폐가 돌아다니게 된 탓이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금과 달러를 바꾸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사이토 다카시가 화폐를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종이돈은 휴짓조각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위태로울 때, 한 나라 화폐 전체가 순식간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금본위제가 막을 내린 지금, 이제 황금은 ‘돈’이 아니다. ‘신의 살’은 더더욱 아니다. 금은 이제 귀금속 가운데 하나로 팔고 사는 ‘상품’일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황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황금은 인간의 깊은 욕망을 채워주고, (얻고자 하는 것의) 상징으로 이용하기를 재촉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금은 쓸모가 없다”고 내뱉는다. 금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버핏은 금 대신 생산 시설에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나아가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資産)”이라며 금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런데도 금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한 관계자는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금융위기를 몇 차례 거친 지금, 달러의 가치는 위태위태해 보인다. 찰리 멍거는 금은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말이 되레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즘이다. 투기 바람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세상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을까?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요즘, 금융시장이 더더욱 불안하게만 다가온다. 안광복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