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가 9살에 입합했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초등학교(당시 정관소학교) 교정의 ‘3·1만세운동 기념비’. 정관면 일대는 1919년 3월9일 좌천장날 만세운동을 벌어졌던 항일 유적지로 이름이 높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①
박정기는 1928년 10월29일(음력·호적상 생일은 1929년 3월11일) 경남 동래군(현재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 박영복과 정금순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월평리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으론 철마산, 소심산이 펼쳐져 있고, 뒤편엔 원효산과 천성산이 마을을 품고 있다. 마을 들머리엔 서너 채의 주막이 행인들을 불러모았다.
박정기가 태어날 무렵 월평리에는 100여가구가 살고 있었다. 평야지대가 아니라 주민들은 근근이 연명하며 서로 기대어 살았다.
박정기의 집안은 400여년 전부터 월평리에서 살았다. 4대조인 박정관은 무과에 급제한 무관이었다. 이때부터 흥한 살림이 대를 이었다. 박정기의 집은 건물 여러 채가 있는 번듯한 집으로 마을 어디에서 보아도 눈에 띄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옥엔 가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의 집안은 백마지기의 논을 소작 주고 머슴 둘을 둘 정도로 형편이 여유로웠다. 박정기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로 자랐다.
아버지 박영복은 범어사 금정암에 문을 연 명정학교를 다녔다. 명정학교는 대한제국 때인 1906년 개교한 학교로, 독립운동이 활발했다. 박영복은 명정학교 축구팀에서 활약했다. 인근에서 명성을 날린 강팀이었다. 그는 하체가 단단하고 굵었으며, 뜀박질이 빠르고 순발력이 남달랐다. 아들 박정기도 운동에 소질이 있어 학교 육상 대표로 뛰었다.
명정학교를 졸업한 박영복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훗날 처남이 되는 정일모와 김일한이 함께 유학시절을 보냈다. 김일한은 나중에 박정기가 다닌 원예중학교의 영어교사가 되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고등문관시험을 준비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박영복이 시험을 포기하고 먼저 귀국했다. 종손이 오래 집을 비우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성화 때문이었다.
박영복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관동(간토)대지진이 발생했다. 10만명이 넘게 사망한 재앙이었다. 박정기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겪은 수난을 여러차례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때 김일한과 정일모가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조선인이 1만명 가까이 학살되었다고 하니 목숨을 부지한 것이나마 다행이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박영복은 마을에 야학을 열었다. 한글과 일본어, 산수를 가르쳤다. 월평리와 인근 마을에서 배움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농민들은 낮엔 농사일을 하고 밤엔 야학을 다녔다. 배우는 이들은 남녀노소 없이 연령대가 다양했다. 박정기도 동무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한글을 익혔다.
박정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종손’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너는 집안의 대들보다.” “너는 종손이다.” 장남인 박영복도 종손이었고, 형제가 없는 박정기도 종손이었다. 대를 이은 ‘종손 의식’은 박정기에게 평생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짐지워진 삶을 부여했다. 박정기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일이 없을 만큼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그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랐다. 어머니 정금순은 정일모의 누이동생이다. 그이는 범어사 아랫동네인 동래군 북면 대롱리 태생이다. 대사찰인 범어사는 월평리에서 20리 남짓한 거리에 있었다. 정일모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범어사의 승려가 되었다. 정금순은 불심이 깊은 여성으로 아들 박정기를 이끌고 범어사를 종종 오갔다. 박정기의 불교 신앙은 어릴 때부터 내면에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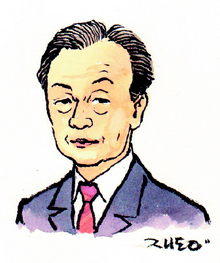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정금순은 종손의 며느리에게 주어진 대소사 많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다. 심지어 동네에서 불리는 그이의 별명이 ‘동네 며느리’였다. 정금순은 열아홉에 아들 박정기를 낳았다.
박정기는 아홉살에 정관소학교에 입학했다. 월평리에서 정관소학교까지 거리는 10리 남짓했다. 소학교 4학년 때 인생의 첫 시련을 겪었다. 전국에 유행하던 돌림병인 장질부사(장티푸스)에 걸린 것이다. ‘반 죽고 반 산다’는 병이었다. 월평리의 여러 아이들이 장질부사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리자 부모님은 노심초사였다. 박정기는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한 상태로 1년 가까이 누워 지냈다. 몸은 비쩍 말라 겉모습이 시체와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극진한 병간호가 그의 목숨을 살렸다. 구술작가/송기역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정금순은 종손의 며느리에게 주어진 대소사 많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다. 심지어 동네에서 불리는 그이의 별명이 ‘동네 며느리’였다. 정금순은 열아홉에 아들 박정기를 낳았다.
박정기는 아홉살에 정관소학교에 입학했다. 월평리에서 정관소학교까지 거리는 10리 남짓했다. 소학교 4학년 때 인생의 첫 시련을 겪었다. 전국에 유행하던 돌림병인 장질부사(장티푸스)에 걸린 것이다. ‘반 죽고 반 산다’는 병이었다. 월평리의 여러 아이들이 장질부사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리자 부모님은 노심초사였다. 박정기는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한 상태로 1년 가까이 누워 지냈다. 몸은 비쩍 말라 겉모습이 시체와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극진한 병간호가 그의 목숨을 살렸다. 구술작가/송기역
박정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종손’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너는 집안의 대들보다.” “너는 종손이다.” 장남인 박영복도 종손이었고, 형제가 없는 박정기도 종손이었다. 대를 이은 ‘종손 의식’은 박정기에게 평생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짐지워진 삶을 부여했다. 박정기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일이 없을 만큼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그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랐다. 어머니 정금순은 정일모의 누이동생이다. 그이는 범어사 아랫동네인 동래군 북면 대롱리 태생이다. 대사찰인 범어사는 월평리에서 20리 남짓한 거리에 있었다. 정일모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범어사의 승려가 되었다. 정금순은 불심이 깊은 여성으로 아들 박정기를 이끌고 범어사를 종종 오갔다. 박정기의 불교 신앙은 어릴 때부터 내면에 자리잡았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