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씨는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 부산에서 국민대에 입학했으나 재단이 분리되면서 경남 합천 해인사로 옮겨간 해인대학을 1년 남짓 다녔다. 사진은 당시 해인사 경내에 있던 체육장 입구 모습.
사진 경남대 누리집 갈무리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1952년 3월 박정기는 국민대 정경학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농대 시험에 떨어진 뒤, 마침 후기 모집 중인 국민대에 합격한 것이다. 서울의 대학들이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와 있던 시절이었다. 부산 서구의 동대신동에 천막을 치고 지은 가설 대학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국민대는 부산방송국 인근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국민대는 두 개로 갈라졌다. 하나는 서울로 돌아가고, 하나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경내로 옮겼다. 해인사로 옮긴 학교는 아예 이름을 해인대학으로 바꾸었다. 그 후 해인대학은 학교명을 마산대학(1961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재단이 경남학원으로 넘어간 뒤 이름도 경남대학(1971년)이 되었다.
부산지역 학생들은 주로 해인대를 선택했다. 박정기도 해인대를 다녔다. 해인사 경내엔 대학교 외에도 국민학교·중학교·농업고등학교가 문을 열고 있어 경내는 종일 학생들로 붐볐다. 대학생들의 숙소는 원당암이었다. 그는 원당암에서 학생 간부인 후생부 차장을 맡았다. 주로 학생들의 식사를 관리하고 사찰 쪽과 연락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해 처음 술을 입에 댔는데 타고난 술꾼이었다. 마셨다 하면 말술이었다. 한번은 친구와 함께 교수 한 분과 ‘드라이 진’을 밤새 마시고 곯아떨어졌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그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함께 술을 마신 교수가 과음으로 밤새 세상을 떠났단다.
그가 훗날 한동안 술을 끊기도 했다. 큰아들 종부를 낳기 전 중병에 걸려 서너 해 병앓이를 했을 때다. 아내(정차순)와 15년간 술을 끊기로 약속한 그는 실제로 17년간 안 마셨다. 그는 약속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성격이었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 집에서 지내던 어느날 그는 초량시장을 지나다 헌병들에게 붙잡혔다. 헌병들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붙잡아 강제입영시키던 때였다. 이를 ‘홀치기’라고 했다. 박정기는 영락없이 걸렸다 싶었다. 전쟁 초기엔 학생증을 보여주면 징집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즈음엔 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헌병 앞에 선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는 기지를 발휘했다.
“내는 지금 군에 지원하러 가는 길입니더. 내는 잡지 마이소.” “그라믄 잘됐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으니 함께 가자.”
박정기는 징병자들과 함께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서 강당엔 끌려온 청년들로 가득했다. 헌병대는 강당에서 지원자들과 징집자들을 구분했다. 강당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인근의 명륜국민학교로 이동했다.
학교 운동장에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집결해 있었다. 한켠에서는 군인들이 징집자에게 해대는 몽둥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원자로 분류된 박정기는 예외였다. 그는 매질 소리를 들으며 입영 서류를 작성했다. 머릿속에선 군에 끌려온 상황을 어떻게든 집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방도가 없었다. 잠시 뒤 헌병대원이 입영 수속을 마치고 학생수첩과 도민증을 돌려주며 복무할 곳이 해병대라고 알려줬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해병대라니!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또 한번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헌병에게 보고하고 담장에 붙어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여닫이창을 열고 밖을 살폈다. 마침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틀을 붙잡고 뛰어올라 밖으로 빠져나갔다. 전력을 다해 뛰었다. 땅이 질척거렸다. 논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산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총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산길에 접어들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중거리 육상 선수였던 게 도움이 되었다. 숲을 헤치고 산을 타고 넘어 집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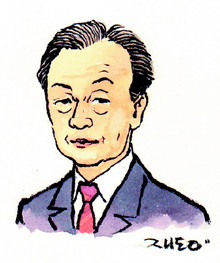 그는 구사일생의 정황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박영복은 독자를 국가에 빼앗길 수 없다며 아들을 천성산 자락의 저수지 근처에 숨겼다. 박정기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며 지내다 몇달 뒤 2학기 개강에 맞춰 다시 해인사로 들어갔다.
전쟁 막바지인 53년 6월,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박정기는 부산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귀향할 채비를 했다. 새벽 6시 첫차를 타기로 한 전날 밤 그는 입학 동기인 정덕기와 함께 아랫마을로 나섰다. 동네 청년들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덕기는 전라도 사람으로 그에게 ‘형님’ 소리를 입에 달고 지낸 사이였다.
마을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해준 청년들은 시냇가에 술상을 차렸다. 백숙 안주에 얼큰하게 취했다. 자연스레 해인대와 해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한 술자리인 줄 그때는 몰랐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그는 구사일생의 정황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박영복은 독자를 국가에 빼앗길 수 없다며 아들을 천성산 자락의 저수지 근처에 숨겼다. 박정기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며 지내다 몇달 뒤 2학기 개강에 맞춰 다시 해인사로 들어갔다.
전쟁 막바지인 53년 6월,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박정기는 부산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귀향할 채비를 했다. 새벽 6시 첫차를 타기로 한 전날 밤 그는 입학 동기인 정덕기와 함께 아랫마을로 나섰다. 동네 청년들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덕기는 전라도 사람으로 그에게 ‘형님’ 소리를 입에 달고 지낸 사이였다.
마을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해준 청년들은 시냇가에 술상을 차렸다. 백숙 안주에 얼큰하게 취했다. 자연스레 해인대와 해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한 술자리인 줄 그때는 몰랐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학교 운동장에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집결해 있었다. 한켠에서는 군인들이 징집자에게 해대는 몽둥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원자로 분류된 박정기는 예외였다. 그는 매질 소리를 들으며 입영 서류를 작성했다. 머릿속에선 군에 끌려온 상황을 어떻게든 집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방도가 없었다. 잠시 뒤 헌병대원이 입영 수속을 마치고 학생수첩과 도민증을 돌려주며 복무할 곳이 해병대라고 알려줬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해병대라니!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또 한번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헌병에게 보고하고 담장에 붙어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여닫이창을 열고 밖을 살폈다. 마침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틀을 붙잡고 뛰어올라 밖으로 빠져나갔다. 전력을 다해 뛰었다. 땅이 질척거렸다. 논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산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총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산길에 접어들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중거리 육상 선수였던 게 도움이 되었다. 숲을 헤치고 산을 타고 넘어 집에 도착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