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14일 저녁 박정기는 정체불명의 기관원들한테 끌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나 그들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사진은 아들 박종철씨가 그 1주일 전쯤 서울대 앞 신림동의 하숙집 친구들과 경기도 일산 백마의 한 민속주점에 놀러 갔을 때 찍은 것으로, 생전 마지막 모습이다. 하숙집 선배였던 하종문 한신대 교수가 보관해왔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⑨
1987년 1월14일 저녁 7시 무렵. 일을 마친 박정기는 작업복 차림으로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집에 들어섰다. 그의 집은 청학양수장 관사에 딸린 사택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딸 은숙이 근처 다방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아버지. 시청 총무과장이 다녀갔어예.”
의아했다. 수도국 공무원들에게 총무과장은 볼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본청 과장이 관여하고 나섰다면 예삿일은 아니었다.
그는 관사 옆 파출소를 돌아 다방에 들어섰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네 명의 낯선 얼굴들이 그를 맞이했다. 공무원의 차림새가 아니었다. 두 명은 바로 자리를 피했다. 먼저 일어선 두 명은 부산 지역 안기부 요원인 것 같았다. 나머지 두 명은 경찰 간부들이었다. 한 사람이 박정기를 다른 테이블로 이끌었다.
“저흰 서울에서 왔습니다. 박 선생님. 함께 서울에 가셔야겠습니다.”
다짜고짜 서울로 향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 땜에 그러요? 서울엔 먼 일로 가자는 깁니까?”
“가보면 압니다.”
순간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서울대 다니는 막내아들 종철이었다. 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들 문젭니껴?”
“……네.”
그는 종철이 또 감옥에 갇힌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라면 부산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리 만무했다. 뭔가 큰일이었다.
“교통사곱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인 게요?”
“자꾸 그렇게 따져 물을 게 아닙니다. 가보면 압니다. 어서 갑시다.”
대답이 퉁명스럽고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들은 더 이상의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일어서며 말했다.
“마음을 크게 먹으셔야 합니다.”
순간 박정기는 아득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며 그가 말했다.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겠십니더.”
집에 들러 옷을 입고 급히 나서는 그를 보고 아내와 은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철이한테 먼 일 생겼소?”
“내 서울 가서 알아보고 전화할 거구마.”
현관문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리던 경찰 간부들이 택시에 등을 떠밀었다. 부산역에서 서울행 새마을호 기차를 탄 시각은 밤 10시쯤이었다. 박정기는 그 시간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입을 열기가 두려웠다. 들려올 말이 무서웠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차창 밖은 캄캄한 암흑이었다. 동행한 이들도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암흑 속에서 종철을 떠올렸다.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은 이틀 전인 1월12일 집을 다녀갔다. 서울에 올라가면 일본어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13일인 어제가 수업을 듣는 첫날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다방 안에서 들었던 말이 되풀이 들려왔다.
‘마음을 크게 먹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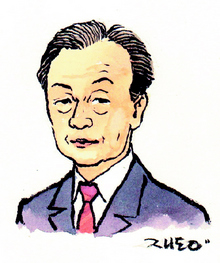 그는 다가올 일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종철이 집에 다녀가던 날 아내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다짐을 받아두었다.
“니 다시는 데모하지 않을 기지? 내캉 약속하자.”
아들은 학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이미 넉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밤낮으로 불안해하던 아내가 이번엔 단단히 아들을 단속했다.
정적을 깨며 경찰 간부들이 질문을 시작했다. 주로 친인척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이었다. 친인척 중에 좌익 인사는 없었다. 그는 질문을 흘려들으면서도 꼬박꼬박 대답했다.
새벽녘, 서울 용산역 플랫폼에 내리자 계단 위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네댓 명의 건장한 체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의 몸에서 살벌한 기운이 풍겼다. 그들의 모습을 대하니 왠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그는 다가올 일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종철이 집에 다녀가던 날 아내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다짐을 받아두었다.
“니 다시는 데모하지 않을 기지? 내캉 약속하자.”
아들은 학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이미 넉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밤낮으로 불안해하던 아내가 이번엔 단단히 아들을 단속했다.
정적을 깨며 경찰 간부들이 질문을 시작했다. 주로 친인척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이었다. 친인척 중에 좌익 인사는 없었다. 그는 질문을 흘려들으면서도 꼬박꼬박 대답했다.
새벽녘, 서울 용산역 플랫폼에 내리자 계단 위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네댓 명의 건장한 체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의 몸에서 살벌한 기운이 풍겼다. 그들의 모습을 대하니 왠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