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중략)/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시인 이상(1910~1937)이 쓴 시 ‘거울’의 일부분이다. 이상은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를 썼다. 이상의 시를 연구한 이들은 그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까닭을 반항, 불복종, 미학적 자유 갈망 등으로 분석하지만, 독자 처지에선 200자가 넘는 시를 띄어쓰기 없이 읽어야 해서 불편하다. 이상의 시가 신문에 발표됐던 때 담당자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우리말은 영어, 한문과 달리 띄어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띄어쓰기를 틀리면 글쓴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가죽을먹는다’란 문장은 ‘돼지가 죽을 먹는다’와 ‘돼지가죽을 먹는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물론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돼지가죽’보다는 ‘돼지껍데기’란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문장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막차가 떠났다’와 ‘지금 막 차가 떠났다’는 문장은 ‘막’과 ‘차’ 사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앞뒤 문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만 떼 놓고 본다면 글쓴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시글 1은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 예다.
|
예시글 1
(가) 오늘밤 나무 사 온다.
(오늘밤에 나무를 사 온다.)
(나) 오늘밤 나 무 사 온다.
(오늘밤에 내가 무를 사 온다.)
(다) 오늘밤 나 무사 온다.
(오늘밤에 나씨 성의 무사가 온다.)
(라) 오늘 밤나무 사 온다.
(오늘 밤나무를 사 온다.)
|
|
|
우리말은 조사를 생략해도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어와 단어가 붙어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닌 단어로 바뀌기도 하므로 띄어쓰기를 철저하게 해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문 (가)~(라)에서 ‘오늘’, ‘밤’, ‘나’, ‘무’는 제각각 뜻을 지닌 독립된 낱말이다. ‘오늘’과 ‘밤’이 만나 ‘오늘밤’이 됐고, ‘나’와 ‘무’가 붙어 전혀 다른 뜻인 ‘나무’를 만들었다. 여기에 ‘밤’을 더하면 ‘밤나무’로 바뀐다. 역시 ‘무’와 ‘사다’의 어간 ‘사’가 결합하면 ‘무사’란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생긴다. 이처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한 낱말들이 붙거나 떨어져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이다→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이다’, ‘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전부 드러운(더러운) 남자입니다’, ‘나도 박사다→나 도박사다’처럼 띄어쓰기를 잘못해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띄어쓰기를 하는 까닭은 독자에게 호흡 조절 시간을 줘 읽기 편하게 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말 띄어쓰기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규정마다 예외가 많아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조차 규정대로 완벽하게 쓰긴 어렵다. 게다가 같은 단어인데 쓰임새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리기 십상이다. 다음은 <아하! 한겨레> 누리집(ahahan.co.kr)에 올라온 글이다.
|
|
예시글 2
(마) 차가 많아지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데는 점점 사라지고 즐길 거라곤 컴퓨터게임 밖에 남지 않았다.
(바) 학과를 선택할 땐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지 맞지 않는 지 잘 따져야 한다.
(사) 시청 광장에 촛불이 3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
|
|
‘데’가 장소·경우·일·것을 뜻할 땐 띄어 쓴다. 그러나 ‘~했는데 …’처럼 ‘데’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내가 안 했는데’처럼 종결형 어미로 쓰일 땐 붙여 쓴다. 예문 (마)의 ‘뛰어놀데’는 ‘뛰어놀 장소’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 ‘밖’은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겉이 되는 쪽,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일을 뜻할 땐 띄어 쓰고, ‘이밖에, 그밖에’처럼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낼 땐 붙여 쓴다. ‘컴퓨터게임 밖에’는 ‘컴퓨터 게임 이외에는’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붙여 써야 맞다.
‘지’도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 여부가 결정된다. ‘고래는 짐승이지 물고기가 아니다’처럼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대조하거나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이면 붙여 쓴다. 그러나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만난 지 한 달이 됐다’와 같이 지나간 시간을 나타낼 땐 띄어 쓴다. 따라서 예문 (바)의 ‘맞는 지 맞지 않는 지’의 ‘지’는 어미의 일부로 쓰였으므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로 바꿔야 한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낼 땐 붙여 쓰지만, ‘사흘 만에 돌아왔다’, ‘1년 만에 떠나갔다’처럼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엔 띄어 쓴다. 예문 (사)의 ‘3년만에’에서 ‘만’은 지나간 시간을 뜻하므로 띄어 써 ‘3년 만에’로 바꿔야 한다.
(마-1) 차가 많아지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데는 점점 사라지고 즐길 거라곤 컴퓨터게임밖에 남지 않았다.
(바-1) 학과를 선택할 땐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따져야 한다.
(사-1) 시청 광장에 촛불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띄어쓰기를 틀리면 내용이 좋더라도 글이 볼품없어지고, 완성도도 떨어져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특히 앞으로 논술문을 써야 할 수험생들은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는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로’, ‘뿐’, ‘만큼’도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므로 눈여겨봐야 한다.
|
|
예시글 3
(아) 예상했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날치기로 처리됐다. 시민들은 야당이 막는 시늉만 했을뿐이라며 비판했다.
(자)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이해한다.
|
|
|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낼 땐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와 같이 용언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엔 띄어 쓴다. 예문 (아)의 ‘예상했던대로’에서 ‘대로’ 앞의 ‘예상했던’이 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땐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와 같이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띄어 쓴다. 예문 (아)의 ‘했을뿐’은 ‘했을 따름’으로 바꿔 써도 되므로 띄어 써야 옳다.
‘만큼’도 ‘대로’와 같다.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낼 땐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엔 띄어 쓴다. 예문 (자)의 ‘아는만큼’과 ‘보이는만큼’에서 ‘만큼’ 앞에 붙은 ‘아는’과 ‘보이는’은 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아-1) 예상했던 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날치기로 처리됐다. 시민들은 야당이 막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자-1)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한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 트위터 등에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쓴 글을 자주 본다.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띄어쓰기에 신경 쓰지 못해 생긴 문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논술문에 그대로 전염돼 감점요인이 된다. 띄어쓰기가 틀린 글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애써 글을 써 놓고 띄어쓰기를 틀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글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띄어쓰기 규정대로 완벽히 글을 쓰기란 매우 어렵다. 먼저 띄어쓰기 원리를 익히되, 예외 규정도 수시로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전을 찾아 확인하는 버릇이 필수다.
정종법 <함께하는 교육>, <아하! 한겨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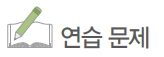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올바로 고쳐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올바로 고쳐 보세요.
1. 모두들 구경만 할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2.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 밖에 더하겠니?
3. 친구가 도착한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예시답안은
<아하! 한겨레> 누리집(ahahan.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난이도 : 초등 고학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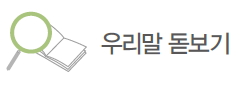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①
제1절 조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①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예)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기는커녕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독립적 의미는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명사 기능을 담당하므로 한 단어로 다룬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 문제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른다.
예) 아는 것, 먹을 만큼, 뜻한 바, 떠난 지(가 오래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음절 단어가 이어지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도 부담된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한 덩이를 이루는 구조에 적용된다.
예) 이 곳 저 곳→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한 음절로 된 단어를 무조건 붙여 쓰진 못한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다.
예) 더 큰 새 집→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중략)/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시인 이상(1910~1937)이 쓴 시 ‘거울’의 일부분이다. 이상은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를 썼다. 이상의 시를 연구한 이들은 그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까닭을 반항, 불복종, 미학적 자유 갈망 등으로 분석하지만, 독자 처지에선 200자가 넘는 시를 띄어쓰기 없이 읽어야 해서 불편하다. 이상의 시가 신문에 발표됐던 때 담당자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우리말은 영어, 한문과 달리 띄어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띄어쓰기를 틀리면 글쓴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가죽을먹는다’란 문장은 ‘돼지가 죽을 먹는다’와 ‘돼지가죽을 먹는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물론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돼지가죽’보다는 ‘돼지껍데기’란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문장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막차가 떠났다’와 ‘지금 막 차가 떠났다’는 문장은 ‘막’과 ‘차’ 사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앞뒤 문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만 떼 놓고 본다면 글쓴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시글 1은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 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중략)/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시인 이상(1910~1937)이 쓴 시 ‘거울’의 일부분이다. 이상은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를 썼다. 이상의 시를 연구한 이들은 그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까닭을 반항, 불복종, 미학적 자유 갈망 등으로 분석하지만, 독자 처지에선 200자가 넘는 시를 띄어쓰기 없이 읽어야 해서 불편하다. 이상의 시가 신문에 발표됐던 때 담당자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우리말은 영어, 한문과 달리 띄어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띄어쓰기를 틀리면 글쓴이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가죽을먹는다’란 문장은 ‘돼지가 죽을 먹는다’와 ‘돼지가죽을 먹는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물론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돼지가죽’보다는 ‘돼지껍데기’란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문장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막차가 떠났다’와 ‘지금 막 차가 떠났다’는 문장은 ‘막’과 ‘차’ 사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앞뒤 문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만 떼 놓고 본다면 글쓴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시글 1은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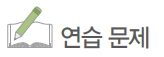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올바로 고쳐 보세요.
1. 모두들 구경만 할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2.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 밖에 더하겠니?
3. 친구가 도착한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예시답안은 <아하! 한겨레> 누리집(ahahan.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올바로 고쳐 보세요.
1. 모두들 구경만 할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2.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 밖에 더하겠니?
3. 친구가 도착한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예시답안은 <아하! 한겨레> 누리집(ahahan.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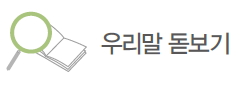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①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예)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기는커녕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독립적 의미는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명사 기능을 담당하므로 한 단어로 다룬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 문제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른다.
예) 아는 것, 먹을 만큼, 뜻한 바, 떠난 지(가 오래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음절 단어가 이어지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도 부담된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한 덩이를 이루는 구조에 적용된다.
예) 이 곳 저 곳→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한 음절로 된 단어를 무조건 붙여 쓰진 못한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다.
예) 더 큰 새 집→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①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으므로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예)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기는커녕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독립적 의미는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명사 기능을 담당하므로 한 단어로 다룬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 문제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른다.
예) 아는 것, 먹을 만큼, 뜻한 바, 떠난 지(가 오래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 음절 단어가 이어지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도 부담된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땐 붙여 쓸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한 덩이를 이루는 구조에 적용된다.
예) 이 곳 저 곳→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한 음절로 된 단어를 무조건 붙여 쓰진 못한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의미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다.
예) 더 큰 새 집→더큰 새집(×),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