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16일 임진강에서 박종철씨의 장례를 마치고 이튿날 새벽 부산 집에 도착한 박정기(맨 가운데)씨와 가족들은 어머니 정차순(오른쪽 세번째)씨가 다니던 인근 사리암에 아들의 영정을 모셨다. 3월3일 주지 백우 스님(맨 오른쪽)이 49재를 인도하고 있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31
박정기가 철이(종철)의 회상에서 깨어날 무렵 버스는 부산으로 들어섰다. 1987년 1월17일 새벽이었다. 임진강 샛강에 철이를 흘려보낸 뒤 출발한 버스는 밤새 달려 날이 바뀌어서야 도착했다. 박정기가 아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집 앞에 다다르자 주위에 수백명의 조문객이 모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알은체를 했다.
“욕봤데이.”
고개를 돌리니 부산원예중학교 친구인 영도구청장 이영택이 서 있었다. 그와 함께 아들이 쓰던 작은방에 들어가 영정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두었다. 이영택이 말했다.
“친구, 종철이 영정을 여기 두지 말고 선걸음에 가차운 절에 모시는 게 어떻겠나? 가족들과 의논해 보게.”
불자인 박정기는 아들을 부처님 곁에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족들과 논의해 아내 정차순이 다니는 가까운 절 사리암에 영정사진을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정기는 다시 길을 나서 사리암으로 갔다. 사리암은 공찰이 아닌 사찰로, 도승 백우 스님이 주지였다.
백우 스님은 박종철의 영정사진을 받은 일로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2월7일 ‘박종철군 추모대회’와 3월3일 49재가 사리암에서 열렸는데, 스님은 행사를 방해하려는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치러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1월16일 이래로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박정기는 한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니 그럴 경황이 없었다. 훗날 알고 난 뒤에도 한동안 신문을 펼쳐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떠난 뒤 자신의 행동들을 회고하며 후회한다고 말했다.
“내가 과오를 저질렀으니까 엄두가 안 났지.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지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 모양을 당했으니…난 죄를 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박정기는 아들이 떠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처절하게, 철이 없는 세상에, 철이 떠나보내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던 때였다.” 그날 이후 박정기 주변엔 두세명의 기관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목욕탕에 가도, 시장에 가도 고개를 돌려보면 그들이 서 있었다. 정차순과 맏이 종부, 딸 은숙에게도 형사들이 따라붙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기관원 중 한명은 박정기의 중학 동창이자 친척이었다. 그는 아예 박정기의 집과 직장에 출퇴근을 하며 감시했다. 직업상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서로 난처했다. 부산 수도국 청학양수장의 직장 동료들은 뜻과 무관하게 박정기의 동태를 알리는 일을 맡아야 했다. 시시때때로 기관에서 전화해 그의 동태를 확인하는 통에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박정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자신이 허깨비처럼 느껴졌다. 어떤 날은 직장을 이탈해 배회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간섭하지 않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였는데 근무가 없는 날이면 부산 거리를 떠돌았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한편 화가 치밀고 한편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있는 사리암엔 거의 매일 찾아갔다.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어딘가로 무작정 떠났고, 버스에서 버스로 옮겨다녔다. 그는 유령처럼 시내를 흘러다녔다. 버스 안에서 정신이 깨어 보면 김해에 도착해 있을 때가 많았다. 부산 시내에서 집회가 있는 날엔 형사들을 따돌리고 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부산의 거리에서 서울의 도로 위에서 그는 철이를 찾았다. 아내도, 딸도 대학교와 재야단체 집회를 찾아다녔다. 형사들의 감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거리를 헤맸다. 정차순은 멍하게 혼잣말하곤 했다. 혼잣말은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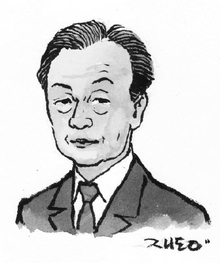 “우리 철이 어디 갔나? 내 새끼 내가 낳아 키웠건만, 스물세 해 고이고이 키웠건만, 언제 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열다섯 해 애써 공부시켰는데 엄마 버리고 누굴 따라갔나? 그토록 좋아하고 따르던 형님 누나 버리고 어디 갔나? 지가 원해 간 대학 졸업도 못하고 우리 철이 어디 갔나? 너털웃음 웃으며 재미나게 놀던 친구 버리고 누굴 따라 어디 갔나?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전화해서 하숙비라도 한번 달랬으면,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엄마 버리고 어디 갔나?”
아내는 철이가 떠난 뒤에야 아들의 행동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온몸에 수포가 생긴 채 내려온 적이 있었다. 피부병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최루탄을 온몸에 뒤집어써서 생긴 것이었다. 한푼 두푼 아껴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 옷가게에 데려가면 “메이커 있는 옷은 입지 않겠다”고 이상하게 고집을 부렸다. 그땐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야속했다. 아들은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우리 철이 어디 갔나? 내 새끼 내가 낳아 키웠건만, 스물세 해 고이고이 키웠건만, 언제 온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열다섯 해 애써 공부시켰는데 엄마 버리고 누굴 따라갔나? 그토록 좋아하고 따르던 형님 누나 버리고 어디 갔나? 지가 원해 간 대학 졸업도 못하고 우리 철이 어디 갔나? 너털웃음 웃으며 재미나게 놀던 친구 버리고 누굴 따라 어디 갔나?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전화해서 하숙비라도 한번 달랬으면,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우리 철이 어디 갔나, 엄마 버리고 어디 갔나?”
아내는 철이가 떠난 뒤에야 아들의 행동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온몸에 수포가 생긴 채 내려온 적이 있었다. 피부병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최루탄을 온몸에 뒤집어써서 생긴 것이었다. 한푼 두푼 아껴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 옷가게에 데려가면 “메이커 있는 옷은 입지 않겠다”고 이상하게 고집을 부렸다. 그땐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야속했다. 아들은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박정기는 아들이 떠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처절하게, 철이 없는 세상에, 철이 떠나보내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던 때였다.” 그날 이후 박정기 주변엔 두세명의 기관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목욕탕에 가도, 시장에 가도 고개를 돌려보면 그들이 서 있었다. 정차순과 맏이 종부, 딸 은숙에게도 형사들이 따라붙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기관원 중 한명은 박정기의 중학 동창이자 친척이었다. 그는 아예 박정기의 집과 직장에 출퇴근을 하며 감시했다. 직업상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서로 난처했다. 부산 수도국 청학양수장의 직장 동료들은 뜻과 무관하게 박정기의 동태를 알리는 일을 맡아야 했다. 시시때때로 기관에서 전화해 그의 동태를 확인하는 통에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박정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자신이 허깨비처럼 느껴졌다. 어떤 날은 직장을 이탈해 배회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간섭하지 않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였는데 근무가 없는 날이면 부산 거리를 떠돌았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한편 화가 치밀고 한편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있는 사리암엔 거의 매일 찾아갔다.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어딘가로 무작정 떠났고, 버스에서 버스로 옮겨다녔다. 그는 유령처럼 시내를 흘러다녔다. 버스 안에서 정신이 깨어 보면 김해에 도착해 있을 때가 많았다. 부산 시내에서 집회가 있는 날엔 형사들을 따돌리고 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부산의 거리에서 서울의 도로 위에서 그는 철이를 찾았다. 아내도, 딸도 대학교와 재야단체 집회를 찾아다녔다. 형사들의 감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거리를 헤맸다. 정차순은 멍하게 혼잣말하곤 했다. 혼잣말은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