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17일부터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나선 유가협 회원들은 11월1일부터 5공 청문회가 개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야당 당사 등을 방문해 시위를 했다. 사진작가 박용수씨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57
1988년 10월17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유가협 회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평가회의를 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밤엔 열명가량의 회원이 번갈아가며 농성장을 지켰다. 아침이면 유가족들이 다시 모여 간사 정미경과 박래군이 짠 일정에 따라 거리로 나섰다. 짬이 날 때마다 두 사람은 민중가요를 가르쳤다. 새로 온 유가족들에겐 구호와 팔뚝질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박정기는 아침에 가장 먼저 농성장에 나왔다. 새벽 일찍 기독교회관 주변 골목을 쓸고, 농성장을 걸레질했다. 그는 자발적인 청소 당번이었다. 일거리가 보이면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다.
평가회의는 주로 어머니들이 주도했다. 온건한 아버지들과 달리 그네들은 몸싸움에도 물러섬이 없었다. 집회에 새로 참여한 유가족일수록 더 그랬다. 경찰, 군인 등 공권력에 자식을 잃은 처지여서 더 그랬는지도 몰랐다. 특히 경찰들에게 욕설이라도 들으면 조용히 지나치지 못했다. 행진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순식간에 대열이 흐트러졌다.
어머니들의 서슬 퍼런 공격에 경찰들은 맥을 못 추었다. 송광영의 어머니는 경찰의 무전기를 박살내는 데 선수였다. 무전기가 눈에 띄기만 하면 순식간에 빼앗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 어떤 어머니는 전경들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게 특기였다. 전경들은 그분이 다가가면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아따, 어머닌 암찌케나 발을 휘둘러도 쟈들 ‘불알’을 반쪽내부러잉. 그러다 고자 되믄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러요? 살살 혀.”
경찰은 유가족들을 붙잡으면 닭장차에 실어 서울 시내나 외곽 곳곳에 내려놓았다. 연행되는 이는 주로 어머니들이었다. 경찰이 유가족들을 먼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유치장에 가두면 민가협 등에서 금세 달려와 항의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처음엔 회원들을 난지도로 끌고 갔지만 나중엔 수유리·일산·문산·성남·하남·미사리 등으로 점점 더 멀어졌다. 들판 가운데에도 내려놓고, 산 밑에도 내려놓고, 공동묘지 인근에도 내려놓았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절대로 한곳에 내려놓지 않았다. 한명 또는 두세명씩 내려놓고 몇 개 마을을 지나친 뒤 다시 몇명을 내려놓는 식이었다.
회원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이들도 있어서 농성장을 되찾아오는 데 애를 먹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유가족들도 서울 지리를 몰라 오랜 시간 헤매다 밤이 깊어서야 겨우 찾아오기도 했다. 박정기 역시 밤늦게 낯선 땅에 서 있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웠다. 컴컴한 시골길을 걸어 불빛이 보이는 마을에 도착한 뒤에야 돌아갈 방법을 궁리했다. 시골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렸고, 차가 끊기면 지나가는 차를 얻어탄 적도 많았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박정기는 서서히 변화를 겪었다. 농성 초기 그는 전경들에게 큰소리치는 일이 드물었다.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망설임이 없어졌다. 여성들과 얘기 나누는 걸 꺼리는 보수적인 면모도 서서히 바뀌었다.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던 그는 농담도 즐기고 어머니들과 허물없이 어울렸다. ‘내외해야 하는 아낙’이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로 어머니들에게 다가갔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찬 바닥에 모포 한 장 덮고 잠을 이룰 때면 누군가 떠난 자식을 그리며 홀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이가 달래려다 함께 훌쩍였다. 박정기와 아버지들은 애써 담담한 척했다. 꿈속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내뱉는 이들도 있었다. 박정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치곤 했다.
박래군은 그 와중에 의문사 자료집을 제작했다. 의문사의 여러 사례를 모아 국회에 제출하고 방문객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려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문사는 언론에 ‘의문의 죽음’, ‘의혹의 죽음’ 등으로 소개되었다. 박래군의 제안으로 유가협에서 ‘의문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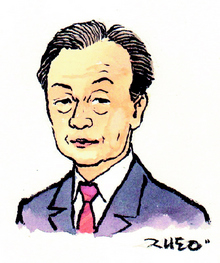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그가 밤마다 갓 배운 타자를 치고 있으면 유가족들이 한명씩 찾아와 사연을 풀어놓았다. 농성장에 오기까지 억울한 죽음의 사연 한번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들이었다. 그들에겐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것이 씻김굿이었다.
10월29일, 유가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다 전원 연행되었다. 11월1일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대원여객 버스운전기사 이문철이 분신했다. 유가족들은 대원여객으로 달려갔다. 이문철은 일주일 뒤 숨졌다. 농성 27일째인 11월12일, 박정기는 의문사 유가족들과 함께 ‘전두환 이순자 구속 촉구 행진’에 참여했다. 대여섯명으로 시작한 의문사 유가족은 이 시기에 서른명 넘게 불어 농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그가 밤마다 갓 배운 타자를 치고 있으면 유가족들이 한명씩 찾아와 사연을 풀어놓았다. 농성장에 오기까지 억울한 죽음의 사연 한번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들이었다. 그들에겐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것이 씻김굿이었다.
10월29일, 유가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다 전원 연행되었다. 11월1일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대원여객 버스운전기사 이문철이 분신했다. 유가족들은 대원여객으로 달려갔다. 이문철은 일주일 뒤 숨졌다. 농성 27일째인 11월12일, 박정기는 의문사 유가족들과 함께 ‘전두환 이순자 구속 촉구 행진’에 참여했다. 대여섯명으로 시작한 의문사 유가족은 이 시기에 서른명 넘게 불어 농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