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26일 최루탄 제조회사인 삼양화학의 서울 마포 본사 사장실에서 점거농성 중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왼쪽)씨와 한영자 사장이 만나는 장면. 당시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두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것’으로 왜곡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60
1988년 10월15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박선영의 어머니 오영자는 면회 온 박정기와 이소선을 보자 주저앉으며 하소연했다.
“이놈들아, 날 폭행하고 치료도 못 받게 할 수 있느냐? 아고, 억울해라.”
박정기도 경찰들에게 항의했다.
“아니, 우리 오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 가둬놓고 폭행합니껴?”
그 순간 이소선이 오영자의 감방을 살피더니 자물쇠를 들어올렸다. 열쇠를 잠그지 않고 허술하게 걸어둔 상태여서 문이 열렸다. 누군가 외쳤다.
“다 감방으로 들어갑시다!”
이소선이 앞장서고 면회 온 유가족들이 우르르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경찰들은 미처 손을 쓸 수 없었다. 열댓명이 들어서니 감방이 가득 찼다. 박정기가 경찰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떠들었으니 구속시키시오.”
그렇게 유치장을 점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 남짓한 형사들이 들어와 한명씩 끌어냈다. 맨 먼저 오영자를 끌어내 임분이의 감방으로 옮긴 뒤 열쇠로 잠갔다. 덩치 큰 경찰 4명이 팔다리 하나씩을 나눠 잡고 들어올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음엔 박래군과 박채영을 들어 유치장 바깥으로 끌어냈다. 박정기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감방 안의 유가족들이 모두 끌려나왔다. 유가족들은 둘째 날도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밤을 지샜다. 그러자 다음날 경찰은 연행한 유가족들을 여러 경찰서로 분산배치했다. 박정기는 이소선과 함께 경찰서를 순회하며 면회했다. 유가족들은 오영자·임분이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송치될 때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태춘·우종원·정경식·김성수의 어머니는 즉결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오영자·임분이는 “법원이 생긴 이래 세계적으로 재판 서류를 찢는 일은 처음”이라는 판사의 준엄한 판결과 함께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유가협의 의문사 농성 투쟁을 방해하려는 과도한 실형이었다. 두 사람의 수감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은 구속자 석방 투쟁과 함께 진행됐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정은 농성장이 되었다. 한번은 재판 도중 민가협의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방해하자 판사가 제지했다. “누구야? 지금 떠든 사람 일어나!” 누군가가 맞받아쳤다. “모두 일어납시다.” 방청객들이 너도나도 일어났다. “나도 떠들었습니다.” “나도 떠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일어서자 판사는 할 말을 잃었다. 유가족들의 법정 투쟁은 다른 재판에선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투쟁 전술이 구사되어 매번 재판부가 골머리를 앓았다. 그 무렵부터 기독교회관 농성장에 ‘사제 폭발물 사건’에 관련된 학교의 대학생들이 찾아오면서 한층 북적였다. 유가족들은 “오영자·임분이가 석방될 때까지 의문사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 일은 의문사 농성이 장기화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두 사람이 자릴 비우면서 농성장의 분위기는 심란해졌다. 유가족들은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끼니를 멀리했다. 농성장을 찾아온 학생들이 울며 호소했다. “어머니, 밥 좀 들어요. 먹어야 싸우죠.” 학생들은 밥을 지어 유가족들의 끼니를 챙겼다. 88년 10월29일 박정기는 조선일보사 편집국에 들어섰다. 배은심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길이었다. 배은심은 10월26일 최루탄부상자협의회 회원 11명과 함께 최루탄 제조회사인 서울 마포의 삼양화학 본사로 찾아가 사장실 점거 농성을 했다. 8시간 남짓 기다린 끝에 한영자 사장이 나타나 말했다. “한열이 어머님께 품어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로 인해 한열이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루탄을 생산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사장실을 나설 때 한영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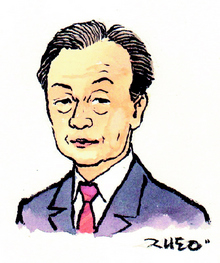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배은심은 손을 뿌리치며 문을 나섰다. 그런데 이튿날 신문기사를 읽은 박정기는 깜짝 놀랐다. 10월27일치 조선일보에 한영자와 배은심이 악수를 하는 사진과 기사가 크게 실렸기 때문이다.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글이 붙어 있었다.
“최루탄을 만든 사람과 그 최루탄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손을 잡고 아픔을 나누고 있다.”
다른 유가족들도 기사를 읽고 어안이 벙벙했다. 연일 최루탄으로 부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사였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배은심은 손을 뿌리치며 문을 나섰다. 그런데 이튿날 신문기사를 읽은 박정기는 깜짝 놀랐다. 10월27일치 조선일보에 한영자와 배은심이 악수를 하는 사진과 기사가 크게 실렸기 때문이다.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글이 붙어 있었다.
“최루탄을 만든 사람과 그 최루탄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손을 잡고 아픔을 나누고 있다.”
다른 유가족들도 기사를 읽고 어안이 벙벙했다. 연일 최루탄으로 부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사였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 김재철 사장 쉬는날에만 호텔결제 98번, 왜?
■ 이건희 회장 형 이맹희, ‘삼성 킬러’와 손잡았다
■ 자궁경부암 백신, 필요한 소녀 못맞고…불필요한 아줌마 맞고…
■ 워싱턴포스트의 반성문 “유혹을 이기지 못해…”
■ 삼성·하이닉스와의 ‘치킨게임‘에…일본 엘피다 침몰
그렇게 유치장을 점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 남짓한 형사들이 들어와 한명씩 끌어냈다. 맨 먼저 오영자를 끌어내 임분이의 감방으로 옮긴 뒤 열쇠로 잠갔다. 덩치 큰 경찰 4명이 팔다리 하나씩을 나눠 잡고 들어올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음엔 박래군과 박채영을 들어 유치장 바깥으로 끌어냈다. 박정기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감방 안의 유가족들이 모두 끌려나왔다. 유가족들은 둘째 날도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밤을 지샜다. 그러자 다음날 경찰은 연행한 유가족들을 여러 경찰서로 분산배치했다. 박정기는 이소선과 함께 경찰서를 순회하며 면회했다. 유가족들은 오영자·임분이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송치될 때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태춘·우종원·정경식·김성수의 어머니는 즉결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오영자·임분이는 “법원이 생긴 이래 세계적으로 재판 서류를 찢는 일은 처음”이라는 판사의 준엄한 판결과 함께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유가협의 의문사 농성 투쟁을 방해하려는 과도한 실형이었다. 두 사람의 수감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은 구속자 석방 투쟁과 함께 진행됐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정은 농성장이 되었다. 한번은 재판 도중 민가협의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방해하자 판사가 제지했다. “누구야? 지금 떠든 사람 일어나!” 누군가가 맞받아쳤다. “모두 일어납시다.” 방청객들이 너도나도 일어났다. “나도 떠들었습니다.” “나도 떠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일어서자 판사는 할 말을 잃었다. 유가족들의 법정 투쟁은 다른 재판에선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투쟁 전술이 구사되어 매번 재판부가 골머리를 앓았다. 그 무렵부터 기독교회관 농성장에 ‘사제 폭발물 사건’에 관련된 학교의 대학생들이 찾아오면서 한층 북적였다. 유가족들은 “오영자·임분이가 석방될 때까지 의문사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 일은 의문사 농성이 장기화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두 사람이 자릴 비우면서 농성장의 분위기는 심란해졌다. 유가족들은 감옥에 갇힌 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끼니를 멀리했다. 농성장을 찾아온 학생들이 울며 호소했다. “어머니, 밥 좀 들어요. 먹어야 싸우죠.” 학생들은 밥을 지어 유가족들의 끼니를 챙겼다. 88년 10월29일 박정기는 조선일보사 편집국에 들어섰다. 배은심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길이었다. 배은심은 10월26일 최루탄부상자협의회 회원 11명과 함께 최루탄 제조회사인 서울 마포의 삼양화학 본사로 찾아가 사장실 점거 농성을 했다. 8시간 남짓 기다린 끝에 한영자 사장이 나타나 말했다. “한열이 어머님께 품어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로 인해 한열이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루탄을 생산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사장실을 나설 때 한영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한겨레 인기기사>
■ 김재철 사장 쉬는날에만 호텔결제 98번, 왜?
■ 이건희 회장 형 이맹희, ‘삼성 킬러’와 손잡았다
■ 자궁경부암 백신, 필요한 소녀 못맞고…불필요한 아줌마 맞고…
■ 워싱턴포스트의 반성문 “유혹을 이기지 못해…”
■ 삼성·하이닉스와의 ‘치킨게임‘에…일본 엘피다 침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