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2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재일동포 양심수 이철(왼쪽부터)씨와 민가협 간사 민향숙씨가 주례를 선 문익환 목사와 함께 명동길에서 카페이드를 하고 있다. 75년 약혼한 이 부부는 간첩단 사건으로 각각 옥고를 치르고 13년 만에 지각 결혼식을 올렸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64
1988년 12월7일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을 거쳐 유가족들은 마산 진동 김을선의 집으로 갔다. 헛간 한켠에 놓인 사과상자 안에 정경식의 뼈가 흩어져 있었다. 어떤 이는 차마 볼 수 없어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다. 박정기는 북받치는 감정을 다독이며 김을선에게 말했다.
“이래선 안 됩니데이. 이카다 산 사람 다 잡는데이.”
“어마이, 그라지 말고 아 델꼬 모란공원으로 갑시더.”
그러잖아도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동네 한가운데 장가도 안 가고 죽은 총각 뼉다구가 있으이 재수가 없다.” “지발 땅에 묻든가 다른 곳으로 치우라.”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생선장사를 하는 김을선에게 부탁했다.
“고기를 그렇게 팔면 부정하데이. 지사 지내는 고기 팔믄서 그람 쓰나?”
1년 뒤 김을선은 박정기에게 부탁해 정경식의 유골을 떠나보냈다. 박정기는 마산에 내려가 흩어진 뼈를 그러모아 유골함에 넣었다. 그는 유골을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 안치했다.
아들이 떠난 이후 김을선은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노동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회사에서 장례를 치르자며 거액의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어용노조에서는 못하겠다. 진상이 밝혀지고, 민주노동자장이라야 초상을 치르겠다”며 거부했다. 김을선은 이제 마산·창원 지역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정경식의 의문사’에 대해 2002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고, 2010년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왔다. 영원한 미제가 된 것이다. 정경식은 사망한 지 23년 만인 2010년 9월8일 모란공원 납골당을 떠나 경남 양산 솥발산 열사 묘역에 묻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정경식을 기려 ‘노동해방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백무산 시인은 정경식의 영전에 “노동자의 죽음은 모두 타살이다”라는 시구를 바쳤다. 88년 ‘의문사 규명’ 장기농성 중에 박정기와 유가족들이 잊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해 10월28일 민가협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민향숙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다. 민향숙과 이철의 결혼식은 약혼한 지 13년 만에 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75년 결혼식을 석달 앞두고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 재일동포 유학생인 이철은 사형을, 숙명여대생 민향숙은 간첩 방조 혐의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향숙은 출소한 뒤 민가협에 가입하고 이철의 옥바라지와 구명운동을 했다. 그의 지난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철은 그해 10월3일 개천절에 석방되었다. 유가족들은 결혼식장인 명동성당으로 몰려갔다.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미사가 열렸다. 이날의 극적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예식이 끝나고 기독교회관으로 돌아온 어머니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계남(우종원)과 김종태의 어머니가 농성장 한쪽 구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이상한 침묵이 농성장을 감쌌다. 누군가가 침묵을 깨뜨리며 주저앉았다. “내 자식이 장기수이기만 해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텐데 죽은 자식이라 결혼식도 못 보는구나.” “민가협 엄마들은 자식이 징역살이를 해도 언젠가는 나와서 제 짝 만나 결혼할 거 아입니까? 살아있는 자식은 언젠가 볼 수 있지만 죽은 자식은 어떡합니까?”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자와 갇힌 자. 의문사당한 이와 구속당한 이는 모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이지만, ‘죽은 자’는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잠들 때도 가슴에 영정사진을 매달고 있었다.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억을 떠올리고 꿈을 꾸고 사진을 보는 일뿐이었다. 유가족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 게 아니라, 가슴에 매달고 살고 있었다. 민가협의 어머니들과 한마음으로 투쟁하면서도 그네들과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날처럼 선명하게 깨달은 날은 없었다. 박정기는 어머니들을 달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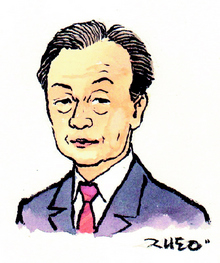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고마해라. 고마하이소.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이소. 진상규명을 꼭 해냅시데이.”
농성장의 공기가 무거웠다. 유가족들은 이날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다. 긴 밤이었다. 많은 일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13년 만의 결혼식이 열린 이날은 박정기에게 잊히지 않고 남아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고마해라. 고마하이소.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이소. 진상규명을 꼭 해냅시데이.”
농성장의 공기가 무거웠다. 유가족들은 이날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다. 긴 밤이었다. 많은 일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13년 만의 결혼식이 열린 이날은 박정기에게 잊히지 않고 남아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 다짜고짜 아슬아슬 성교육, 아들 답이 걸작
■ “속옷 보일까 걱정…” 아시아나 왜 치마만 입나요
■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 방통위원 김태호 PD에 “초등학교 나왔냐”
■ “박지성 선수, 산개구리는 이제 그만”
아들이 떠난 이후 김을선은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노동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회사에서 장례를 치르자며 거액의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어용노조에서는 못하겠다. 진상이 밝혀지고, 민주노동자장이라야 초상을 치르겠다”며 거부했다. 김을선은 이제 마산·창원 지역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정경식의 의문사’에 대해 2002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고, 2010년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왔다. 영원한 미제가 된 것이다. 정경식은 사망한 지 23년 만인 2010년 9월8일 모란공원 납골당을 떠나 경남 양산 솥발산 열사 묘역에 묻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정경식을 기려 ‘노동해방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백무산 시인은 정경식의 영전에 “노동자의 죽음은 모두 타살이다”라는 시구를 바쳤다. 88년 ‘의문사 규명’ 장기농성 중에 박정기와 유가족들이 잊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해 10월28일 민가협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민향숙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다. 민향숙과 이철의 결혼식은 약혼한 지 13년 만에 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75년 결혼식을 석달 앞두고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 재일동포 유학생인 이철은 사형을, 숙명여대생 민향숙은 간첩 방조 혐의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향숙은 출소한 뒤 민가협에 가입하고 이철의 옥바라지와 구명운동을 했다. 그의 지난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철은 그해 10월3일 개천절에 석방되었다. 유가족들은 결혼식장인 명동성당으로 몰려갔다.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미사가 열렸다. 이날의 극적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예식이 끝나고 기독교회관으로 돌아온 어머니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계남(우종원)과 김종태의 어머니가 농성장 한쪽 구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이상한 침묵이 농성장을 감쌌다. 누군가가 침묵을 깨뜨리며 주저앉았다. “내 자식이 장기수이기만 해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텐데 죽은 자식이라 결혼식도 못 보는구나.” “민가협 엄마들은 자식이 징역살이를 해도 언젠가는 나와서 제 짝 만나 결혼할 거 아입니까? 살아있는 자식은 언젠가 볼 수 있지만 죽은 자식은 어떡합니까?”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자와 갇힌 자. 의문사당한 이와 구속당한 이는 모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이지만, ‘죽은 자’는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잠들 때도 가슴에 영정사진을 매달고 있었다.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억을 떠올리고 꿈을 꾸고 사진을 보는 일뿐이었다. 유가족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 게 아니라, 가슴에 매달고 살고 있었다. 민가협의 어머니들과 한마음으로 투쟁하면서도 그네들과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날처럼 선명하게 깨달은 날은 없었다. 박정기는 어머니들을 달래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다짜고짜 아슬아슬 성교육, 아들 답이 걸작
■ “속옷 보일까 걱정…” 아시아나 왜 치마만 입나요
■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 방통위원 김태호 PD에 “초등학교 나왔냐”
■ “박지성 선수, 산개구리는 이제 그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