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충남 태안 안면도의 개락금 마을에서 살던 1950년 무렵, 10대 초반에 혼자 놀이터로 삼았던 정당리 독개의 최근 전경. 일제 때 간척사업으로 방조제를 쌓아 포구로 이용한 곳으로 지금은 서산 남면과 안면도 사이에 다리가 놓여 배는 끊겼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9
충남 서산 달산리에서 지내던 12살 무렵부터 나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인지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태안 안면도 개락금으로 옮겨온 뒤에도 혼자 바닷가에서 무진장 널려 있는 굴을 따 먹기도 하고 꼬챙이로 바위굴에 숨어 있는 낙지를 잡아 먹기도 했다. 또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도 했으며 말목을 친 어장에서 숭어 따위를 몰래 들고 오기도 했다. 이곳에서도 논산 대둔산에서처럼 나름의 영양보충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모래와 벌이 어우러진 공해 한 점 없는 선경이라고 해야 할까? 근래에 이곳을 가보니 벌을 막아 논으로 바꾸어놓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었다.
우리 식구들은 그때 작은형과 사촌형이 야산에 널려 있는 잡목을 베어 묶어서 광천장에 내다 팔아 겨우겨우 생계를 잇느라 늘 멀건 콩죽이나, 곡식 낟알은 거의 섞이지 않은 무밥으로 연명했다. 논산 수락리 시절의 하지감자보다는 나았지만 먹고 돌아서서 방귀 한 번 뀌고 나면 배가 꺼졌다. 그래서 저녁에는 등불을 켤 기름도 없고 해서 활동을 멈추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튼 굴을 실컷 핥아 먹어 배가 두둑해지면 나는 바다 건너 광천을 바라보면서 하얀 모래 위에 만경창파(萬頃蒼波), 붕정만리(鵬程萬里)와 같은 글씨를 쓰며 놀았다. 어쩌면 이런 낙서로 내 꿈을 키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1950년 6·25가 터진 뒤에는 밤에 폭격하는 불빛을 보고는 광천에 있는 아버지와 이리에 있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사건이 터졌다. 나보다 다섯살 많은 김병철이란 친구가 글을 배우는 자리에서 내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 그런데 마침 내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오른쪽 눈 옆 관자놀이를 찔렀다. 연필을 뽑아 보니 심이 잘려 있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라도 다닌 견문 때문인지, 연필심이 살에 박히면 살이 썩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서 큰형님은 나를 광천의 병원으로 보내주었다.
처음으로 광천의 공장에 가본 나는 아버지를 뵈었다. 병원에 몇 번 드나들면서 아픈 곳이 낫자 아버지가 약간의 용돈을 주었다. 그 돈을 가지고 광천역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연희전문대 유자후 교수가 지은 <율곡의 생애와 사상>이란 책을 샀다. 내가 태어나 한문 고서가 아닌 책을 산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책을 당겨 대충 훑어보더니 나무라지 않고 던져주었다. 그때 나에 대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될 낌새였을 것이다.
상처가 나은 뒤 일단 개락금으로 돌아온 내게 잠깐이나마 맛본 작은 도시 광천의 인상은 매우 깊었다. 홍성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다.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 육지나 도시로 향하는 싹이 돋기 시작했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도 개락금 시절은 이리나 대둔산 때처럼 평생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우리 큰어머니(최씨)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분은 아버지보다 한 살 위로 17살에 시집을 왔다. 고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아낙네들에게는 인기가 좋았다. 고루 나누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했다. 나에게도 서자라고 푸대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내 몸이 약하다고 달걀을 몰래 먹이거나 새옷을 지어주려 내 형수들과 다투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큰어머니로부터 서자의 서러움을 받지 않았으며 우리 어머니와도 서로 반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큰어머니의 친정 조카가 부모가 없어서 고모집인 우리집에서 얹혀산 적이 있었다. 이 아이는 글 읽기를 아주 싫어했다. 이 아이가 사건 하나를 저질렀다. 어느날 내가 이리에 따로 떨어져 살던 어머니에게 갔다가 돌아오니 그 아이가 많은 돈을 보여주었다. 황성수(훗날 대구 계명대 교수)라는 분이 걸어둔 양복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숨겨두었다고 했다. 그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 했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큰형님에게 사실대로 알리라고 나무라자 그 아이는 그러면 자기는 쫓겨난다며 한사코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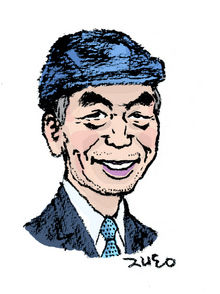 그와 나는 날마다 돈을 조금씩 꺼내 들고 정당리 독개(석포) 옆에 있던 가게에 가서 오징어·양갱·땅콩 같은 것을 사먹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양이 작아서 배탈이 났다고 밥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콩죽이고 뭐고 다 먹어치웠다. 끝내 들통이 나지는 않았다. 내 정직성은 평생 이 수준이었다. 나름대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마음을 썼지만 솔직한 정직성은 지니지 못했고 무슨 일이든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민주운동 과정에서도 이런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이화 역사학자
그와 나는 날마다 돈을 조금씩 꺼내 들고 정당리 독개(석포) 옆에 있던 가게에 가서 오징어·양갱·땅콩 같은 것을 사먹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양이 작아서 배탈이 났다고 밥을 먹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콩죽이고 뭐고 다 먹어치웠다. 끝내 들통이 나지는 않았다. 내 정직성은 평생 이 수준이었다. 나름대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마음을 썼지만 솔직한 정직성은 지니지 못했고 무슨 일이든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민주운동 과정에서도 이런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이화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