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이정희 기자 bbool@hani.co.kr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열쇳말은 진심의 소통·관계 그리고 적당한 분위기 파악
열쇳말은 진심의 소통·관계 그리고 적당한 분위기 파악
처세 하면 ‘손바닥 부비부비’가 떠오른다. 그러나 국어사전은 달리 설명한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어, 건전하네? 본래 뜻을 따르자면 동서고금 인간이 살아가는 곳곳에 자리잡은 조직에 처세는 필수다. 2000만 직장인 가운데 ‘독야청청, 나는 처세와는 상관없는 사람일세’라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바야흐로 11월이 가고 있다. 겨울과 함께 그 중요하다는 송년회의 제철이 온다. 연말연시 인사평가도 닥쳐온다. 처세가 안타깝고 아쉽고 그립고 억울할 때다. ‘아 그동안 잘 살아온 거 맞나?’ 만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고수와 꼼수가 두루두루 뒤섞여 헷갈리는 이때, 처세에도 고수와 꼼수가 있다! 고수,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꼼수는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란다. 한국 사회 각계에서 처세의 고수와 꼼수들이 두각을 뽐내고 있다. 직장 처세술을 연마하겠다며 삼국지, 손자병법 같은 고전만 찾을 필요 없겠다.
철학 vs 임기응변 →
직장생활에서 정치력을 무시할 수 없다. 정치 무림에서도 강호의 고수와 꼼수가 있으니, 일상생활에 큰 도움 주지 않으나 ‘타산지석’의 지혜를 선사한다. ‘뜨겁게 달아오른 감자’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이끌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의 처세지계. ‘기부행위’만 놓고 보자. 얼마나 훌륭한 행위인가. 가진 자가 그것을 끌어안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해 더욱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들 애쓰셨다. 그런데 거 이상하네. 안 교수의 기부는 환대받았고,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은 기부를 하고도 홀대받았다. 도대체 왜? 다들 안다고? 그래도 새겨들어 보시라.
“고수는 나름의 철학이 있고, 꼼수는 그때그때 위기만 피하는 임기응변에 통달한 거죠.” 한 대기업 과장의 이야기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수는 말로 치장하지 않는다. 조용히 평소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길 뿐이다. 꼼수는 갖은 꾀를 부리고 여기에 자신이 바라는 바 ‘아름다운 의미’를 보탠다. 과연 어떤 행위에 환호할 것인가. 답은, 요즘 시민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르시스 안’으로 불리는 한 대기업 부장. 윤리경영 담당자이지만, 이리저리 뒷거래가 많은 사람이다. 그는 인사평가 시즌만 오면 갑자기 회식을 잡아 팀원들에게 요란하게 쏜다. 팀원들은 겉으로 고마운 척하지만, 아랫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다면평가 때문이란 걸 안다. 그.러.나 평소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직원만 볶아대면, 나중에 비싼 고기 한 번 사줘봤자 울화만 돋운다. 한 중견기업 임원인 조 전무는 평소 아랫사람을 더 소중히 챙긴다. 교육이나 외국여행 기회는 성실하거나 고생한 직원들에게 양보한다. 가끔 본인 지갑을 열어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 ‘조 전무의 아이들’을 키운 그는 사내 평판만 좋은 게 아니다. 회사를 떠난 직원들까지도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무리를 하면서 아랫사람을 챙기는 이유? 별거 없지만 일상생활에 옮기는 게 미덕이었다. “그냥 좋은 거 나누는 게 좋아서 그렇지 뭐. 직원들 여행 다녀와서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다녀온 것처럼 즐거워.” 역시, 요즘 부하 직원들 호락호락하지 않다.
 위로부터의 권력 vs 아래로부터의 권력 →
공직 사회. 처세술이 무척 중요한 조직 중 한 곳이다. 매출 등으로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니 처세가 어쩔 수 없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정말정말 중요하죠.” 수십년 공직 사회에 몸담아온 정부 부처 한 국장급의 푸념이다. 그럼에도, 윗사람에게만 잘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또 그의 처세지계 중 하나이다. 힘있는 윗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법. 갑자기 비빌 언덕이 사라지면, 모진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그럴 때를 대비하려면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저 손바닥 잘 비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랫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힘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소 부하 직원들과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 평판 때문에라도 쉽게 손대기가 어려워지죠.” 잘 키운 열 부하, 연줄 상사 안 부러운 법.
지난 1년간 2명의 부장을 모신 지 대리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한 명의 부장은 이직하면서 영전했지만, 지금 모시는 부장은 곧 추풍낙엽이 될 신세임을 알아채서다. “먼저 모시던 부장은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평소에는 자상한 ‘멘토’의 몫을 해주시던 분이었죠. 이직을 하면 평판 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나봐요.” 추풍낙엽 부장은 정반대의 케이스이다. 손금이 닳을세라 바로 윗선 상무에게 아부를 해대던 그. 상무가 이직을 해버렸단다. 꼼수는 빨리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른 상무에게 줄을 대야 했지만, 평소 직속 상무에게 지나치게 ‘티’나게 아부를 하는 그를 윗선에서는 곱지 않게 봤다. 결국 갑자기 바뀐 상사에게 좋은 인사 고과를 받기는 글러버린 신세가 돼버렸다.
자기 개발 vs 자기 계발 →
“신입사원 가운데, 자기 개발하는 사람과 자기 계발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대뜸 한 대기업 임원이 묻는다. 개발과 계발. 멍멍이와 닭? “아침에 외국어 학원 다닌다고 5분씩 늦는 사원들은 자기 ‘개발’하는 직원, 언제든 출근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오는 사원들은 자기 ‘계발’하는 직원이랍니다.”
개발과 계발의 차이란다. 개발은 구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계발은 정신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외국어 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 그 개인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가 늦어서 5분 지체되면, 조직 전체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요즘 사원’들이 잘 모른다는 게 기업 임원의 평가다. 이와 반대로, 30분 일찍 출근하는 사원은 특별히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원’들에 견줘보니 고마운 마음마저 든단다. 부지불식간에 평판은 이렇게 엇갈린다. 한달 내내 30분 일찍 출근하다가, 그가 지각을 하면 “그 사원 요즘 왜 그래?”라며 신경질 부리기보다는 “무슨 일 있나?”라며 마음 쓰게 된다는 게 상사들 ‘마음의 소리’다. 신입사원 고수는 출근시간 앞당기기라는 작은 투자에도 금세 효과를 낸다. 꼼수 사원은 5분 늦다가, 5분 더 늦기만 해도 “쯧쯧쯧”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단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구 과장은 개인으로서의 자기 개발을 할 것이냐,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 계발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 “부장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같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 자격증 따려고 학원을 등록해 둔 게 있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할 직장인, 많지 않을 것이다. “바다낚시 좋아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해요.” 구 과장의 사연을 들은 김 대리는 쓴웃음 지었다. ‘직장생활은 주5일! 주말은 내 거야’가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의 소리’다.
위로부터의 권력 vs 아래로부터의 권력 →
공직 사회. 처세술이 무척 중요한 조직 중 한 곳이다. 매출 등으로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니 처세가 어쩔 수 없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정말정말 중요하죠.” 수십년 공직 사회에 몸담아온 정부 부처 한 국장급의 푸념이다. 그럼에도, 윗사람에게만 잘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또 그의 처세지계 중 하나이다. 힘있는 윗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법. 갑자기 비빌 언덕이 사라지면, 모진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그럴 때를 대비하려면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저 손바닥 잘 비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랫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힘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소 부하 직원들과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 평판 때문에라도 쉽게 손대기가 어려워지죠.” 잘 키운 열 부하, 연줄 상사 안 부러운 법.
지난 1년간 2명의 부장을 모신 지 대리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한 명의 부장은 이직하면서 영전했지만, 지금 모시는 부장은 곧 추풍낙엽이 될 신세임을 알아채서다. “먼저 모시던 부장은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평소에는 자상한 ‘멘토’의 몫을 해주시던 분이었죠. 이직을 하면 평판 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나봐요.” 추풍낙엽 부장은 정반대의 케이스이다. 손금이 닳을세라 바로 윗선 상무에게 아부를 해대던 그. 상무가 이직을 해버렸단다. 꼼수는 빨리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른 상무에게 줄을 대야 했지만, 평소 직속 상무에게 지나치게 ‘티’나게 아부를 하는 그를 윗선에서는 곱지 않게 봤다. 결국 갑자기 바뀐 상사에게 좋은 인사 고과를 받기는 글러버린 신세가 돼버렸다.
자기 개발 vs 자기 계발 →
“신입사원 가운데, 자기 개발하는 사람과 자기 계발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대뜸 한 대기업 임원이 묻는다. 개발과 계발. 멍멍이와 닭? “아침에 외국어 학원 다닌다고 5분씩 늦는 사원들은 자기 ‘개발’하는 직원, 언제든 출근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오는 사원들은 자기 ‘계발’하는 직원이랍니다.”
개발과 계발의 차이란다. 개발은 구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계발은 정신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외국어 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 그 개인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가 늦어서 5분 지체되면, 조직 전체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요즘 사원’들이 잘 모른다는 게 기업 임원의 평가다. 이와 반대로, 30분 일찍 출근하는 사원은 특별히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원’들에 견줘보니 고마운 마음마저 든단다. 부지불식간에 평판은 이렇게 엇갈린다. 한달 내내 30분 일찍 출근하다가, 그가 지각을 하면 “그 사원 요즘 왜 그래?”라며 신경질 부리기보다는 “무슨 일 있나?”라며 마음 쓰게 된다는 게 상사들 ‘마음의 소리’다. 신입사원 고수는 출근시간 앞당기기라는 작은 투자에도 금세 효과를 낸다. 꼼수 사원은 5분 늦다가, 5분 더 늦기만 해도 “쯧쯧쯧”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단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구 과장은 개인으로서의 자기 개발을 할 것이냐,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 계발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 “부장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같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 자격증 따려고 학원을 등록해 둔 게 있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할 직장인, 많지 않을 것이다. “바다낚시 좋아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해요.” 구 과장의 사연을 들은 김 대리는 쓴웃음 지었다. ‘직장생활은 주5일! 주말은 내 거야’가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의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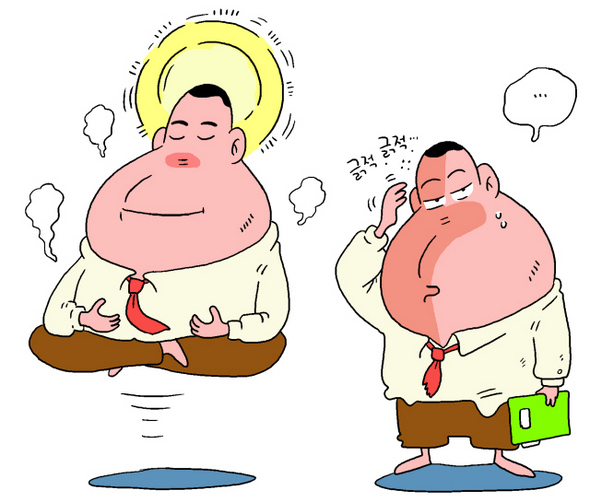 “네?” vs “네!” →
중견기업의 김 과장. “나도 사원, 대리 직급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의 말 한마디에 평판이 좌우되더라고요.” 상사도 부하 직원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는단다. “일을 지시할 때, ‘네?’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원이 있고, ‘네!’ 하고 수긍해주는 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더 일을 같이 하고 싶겠어요?” 소심한 김 과장은 ‘네?’ 하는 시큰둥 사원에게는 말을 더 꺼내지 못했다. “시원스레 대답해주는 사원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저, 그런데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죠.” ‘회사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 역시 처세 고수와 꼼수의 차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예스맨’이 되지 말지어다?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데서나 가능할 일이죠. 일반 직장에서라면, 아직 먼나라 딴나라 이야기예요.” 민주적 조직에서라고 과연 딴나라 이야기일까, 글쎄다. 그는 아픈 기억이 있다. “도저히 안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 소신 발언을 했죠.” 그가 대리일 적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직속 과장에게 끌려나가 “니가 뭔데?”라는 적의 섞인 말을 한 시간이나 들어야 했다. 정 대리의 동료는 맥없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넌지시, 과장에게 “이건 어떨까요?”라며 다른 의견을 냈고, 그 제안이 채택됐다. 회의는 회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고, 정 대리는 그 뒤 회의실 밖 회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과는? 올해 초 그는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리지는 않게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네?” vs “네!” →
중견기업의 김 과장. “나도 사원, 대리 직급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의 말 한마디에 평판이 좌우되더라고요.” 상사도 부하 직원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는단다. “일을 지시할 때, ‘네?’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원이 있고, ‘네!’ 하고 수긍해주는 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더 일을 같이 하고 싶겠어요?” 소심한 김 과장은 ‘네?’ 하는 시큰둥 사원에게는 말을 더 꺼내지 못했다. “시원스레 대답해주는 사원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저, 그런데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죠.” ‘회사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 역시 처세 고수와 꼼수의 차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예스맨’이 되지 말지어다?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데서나 가능할 일이죠. 일반 직장에서라면, 아직 먼나라 딴나라 이야기예요.” 민주적 조직에서라고 과연 딴나라 이야기일까, 글쎄다. 그는 아픈 기억이 있다. “도저히 안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 소신 발언을 했죠.” 그가 대리일 적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직속 과장에게 끌려나가 “니가 뭔데?”라는 적의 섞인 말을 한 시간이나 들어야 했다. 정 대리의 동료는 맥없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넌지시, 과장에게 “이건 어떨까요?”라며 다른 의견을 냈고, 그 제안이 채택됐다. 회의는 회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고, 정 대리는 그 뒤 회의실 밖 회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과는? 올해 초 그는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리지는 않게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만화 정훈이
만화 정훈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