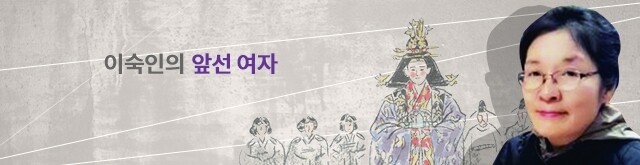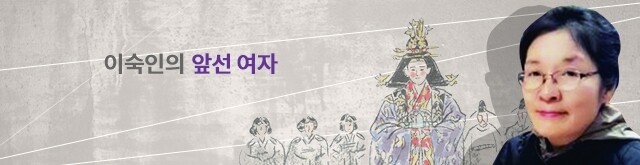돈은 힘과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분쟁과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 돈의 글자 전(錢)이 금을 놓고 두 개의 창이 겨루고 있는 형상에서 보이듯 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없던 돈을 만드는 것만큼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재산 형성과 관리의 시스템이 사회마다 있게 마련인데 산업의 특성상 조선시대는 대부분 상속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딸도 아들과 균등하게 상속되었는데, 부계 가족이 강화되는 후기로 가면 아들만 대상이 되어 여자들은 사실상 빈털터리가 된다. 대략 16세기까지는 딸로서 받은 상속분으로 여자들은 혈손들에게 자기 존재를 확인시킬 수 있었고, 자기 몫의 재산을 통해 혈연 외의 능동적인 관계 맺기가 가능했다. 여자들도 재산의 증식과 운영을 통해 자기 세계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순 최씨(1478~1545)는 김산(지금의 김천)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춘 재지사족(在地士族) 최한남의 딸로 태어났다. 25살에 당시의 양산군수 손중돈(1463~1529)과 혼인을 하는데, 2년 전 사별한 재취 자리였다. 손중돈은 24살에 대과에 급제한 뒤, 덕과 실력을 두루 갖춘 경세가로 조야의 주목을 받았고, 높은 벼슬을 지낸 아버지 손소(1433~1484)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는다. 최씨는 혼인 다음 해에 중앙 부서로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27년의 혼인 생활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낸다. 그사이에 서울 저전동에 가옥을 장만하고, 경주와 김산의 토지를 사들인다. 친정 쪽 노비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최씨 주도로 이루어진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손중돈이 정2품 우참찬으로 세상을 떠나자 최씨는 경주 양동의 본집으로 내려와 가산을 돌보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게 된다. 자신이 낳은 2남 1녀는 잃었지만 남편의 전처에서 난 1남 3녀가 있었다. 남편 사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전답을 거래하여 자산을 불리면서 한편으론 손씨 가의 대를 이을 장손 손광서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한다. 친정 조카 최득충도 “월성군 숙(叔)은 벼슬은 비록 높았지만 본래 청백하여 가계가 실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은 우리 고모가 과부로 사시며 스스로 이룬 재산”이라고 한다. 최씨가 조성한 재산은 남편과 자신이 각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3배에 달했다.
최씨는 취득한 재산의 유지에 나름의 철학을 담았다. 즉 ‘조상의 행적을 이어갈 자손에게 상속하여 대대로 간직하게 하자’는 남편의 유지를 구현하되 스스로 일군 재산에서 자기 존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혈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손외여타(孫外與他) 금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즉 자식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종래(從來)를 따져 복귀시키는 현행법으로 두 집안이 분쟁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혈족인 친정 질녀를 수양녀로 삼고,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을 물려주었다. 질녀 최씨의 입장에서 볼 때, 할머니의 재산이 고모에게 갔다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나아가 최씨는 이 질녀를 부계 장손 손광서와 혼인시켜 확고부동한 후계자로 삼는다. 남편의 뜻과 자신의 욕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씨의 구상은 상속 문서에 그대로 표현되었다. “내가 자녀가 없어 네 처인 나의 3촌 질녀를 세 살 전에 수양하여 정리와 애정이 중대할 뿐 아니라 너 또한 나를 봉양함이 친자식과 다름이 없으므로 내 쪽 노비와 전답을 너에게 전급한다.” 경주 손가 고문서집은 정부인(貞夫人) 최씨가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활약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양측적(bilateral)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 정서와 종법적(宗法的) 계승 관념이 길항하던 16세기에 가산 경영에 역량을 발휘한 최씨, 소유와 재산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조선 여성의 이미지를 전복시키기에 충분하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